소금빵은 2003년 일본 시코쿠의 작은 어촌인 야와타하마의 한 빵집에서 출발했다. 이 지역은 유독 여름이 무더워 빵이 잘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짭짤하고 고소한 소금빵을 고안했다. 출시 뒤 3년 동안은 고전했다. 그러다 어시장 인부들이 짭짤한 소금빵을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났다. 하루에 소금빵이 6000개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였다. 결국 도쿄에만 2개의 지점을 낼 만큼 성공했다.
일본 소금빵의 성공 비결은 뭘까? 나는 ‘비움’을 꼽는다. 소금빵은 모양이나 맛이 유럽의 크루아상과 닮았다. 그러나 소금빵은 래미네이션 과정이 없다. 래미네이션은 얇은 조각들을 정교하게 붙이는 공정을 뜻한다.
크루아상은 재단한 버터를 반죽으로 감싸고 이 반죽을 접고 회전시키는 것을 반복해 여러 겹의 층을 만든다. 이 반죽으로 빵을 성형해 구우면 50~80겹의 종이보다 얇은 층이 생긴다. 그만큼 바삭하지만 품이 많이 든다. 반면 소금빵은 래미네이션 대신 개별 빵 반죽에 하나씩 작은 버터 막대를 충전한다. 공정을 단순화한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현재 소금빵 가격은 본점이 95엔(약 900원), 도쿄 긴자점이 120엔(약 1120원)이다.
일본 소금빵은 비워진 형식만큼 새로운 맛을 채웠다. 일반 버터 대신 생크림을 발효시켜 만든 버터를 썼다. 발효 버터는 일반 버터보다 풍미가 진하고 발연점이 높다. 빵 맛의 핵심인 소금은 커다란 암염을 망치로 일일이 깨서 사용한다. 어떤 암염을 쓰는지는 지금도 영업 비밀이다. 서양 고급 빵을 현지화하기 위한 작은 어촌 빵 장인의 치열한 고민이 느껴진다.
한국 소금빵은 일본 소금빵과 사뭇 다르다. 2021년 유행할 때부터 앙버터나 명란마요 같은 약간의 변형은 물론이고 각종 초콜릿, 크림을 올리거나 채워 넣은 소금빵이 인기였다. ‘비움’으로 태어난 일본 소금빵과 정반대인 ‘중첩’이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 중첩에 열광 중이다.
한국식 소금빵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단짠’의 맛을 강조할 수 있다. 또 화려해진 만큼 SNS에 올리기에도 적합했다. 코로나19 이후 유행하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트렌드에도 맞았다. 게다가 소금빵은 크루아상과 달리 중첩에 최적화된 빵이다. 안은 비어 있고 외피는 쫄깃하다. 귀족적이고 섬세한 유럽 빵과 달리 튼튼한 소금빵은 다소 과한 토핑이나 충전(필링)도 소화한다. 소금빵의 숨겨진 장점을 한국 파티시에들이 발견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외국 빵을 비빔밥처럼 화려하게 만들어 세계에 수출한 경험이 있다. 크로플이다. 한국 파티시에는 2017년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이 빵을 재탄생시켰다. 접시를 닮은 크로플의 장점을 활용해 아이스크림, 과일 같은 토핑을 풍성히 올려 ‘인스타그래머블’하게 만들었다.
물론, 각종 토핑이 중첩된 우리 소금빵은 일본에 견줘 비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소금빵은 일본의 1000원짜리 소금빵이 아니라 한국 음식문화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K푸드다.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소금빵의 가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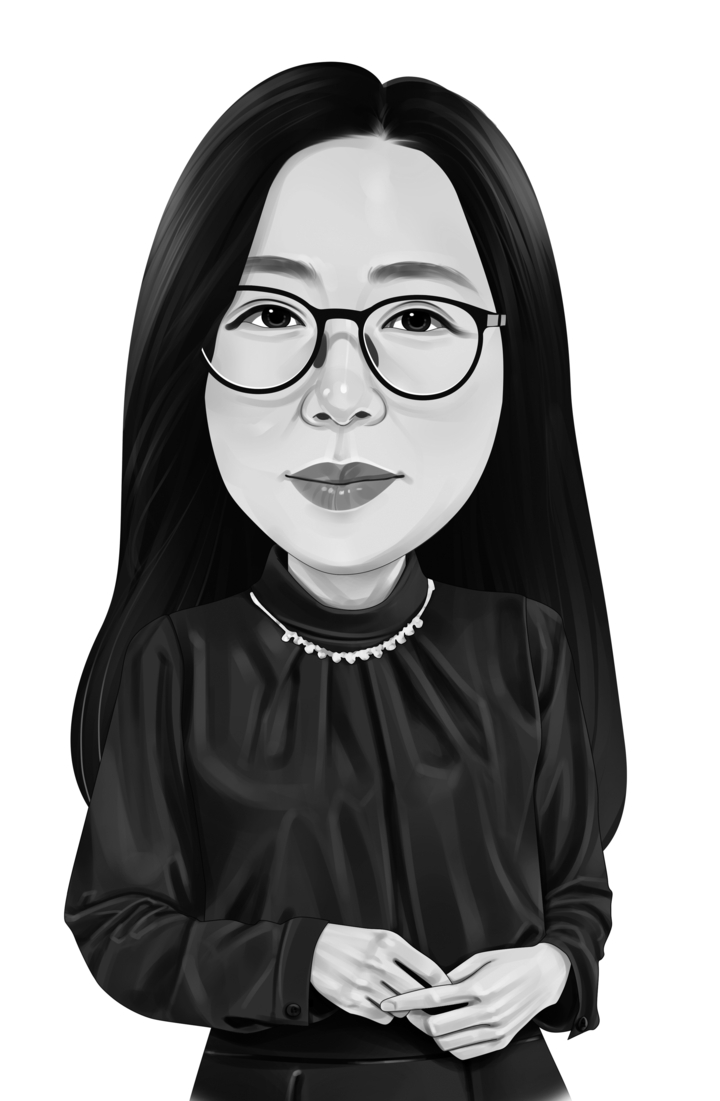

![[오늘의 언박싱] 롯데마트 ‘제주산 찰광어회’·맥도날드 ‘타이니탄’ 外](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2241_1757574222_m.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