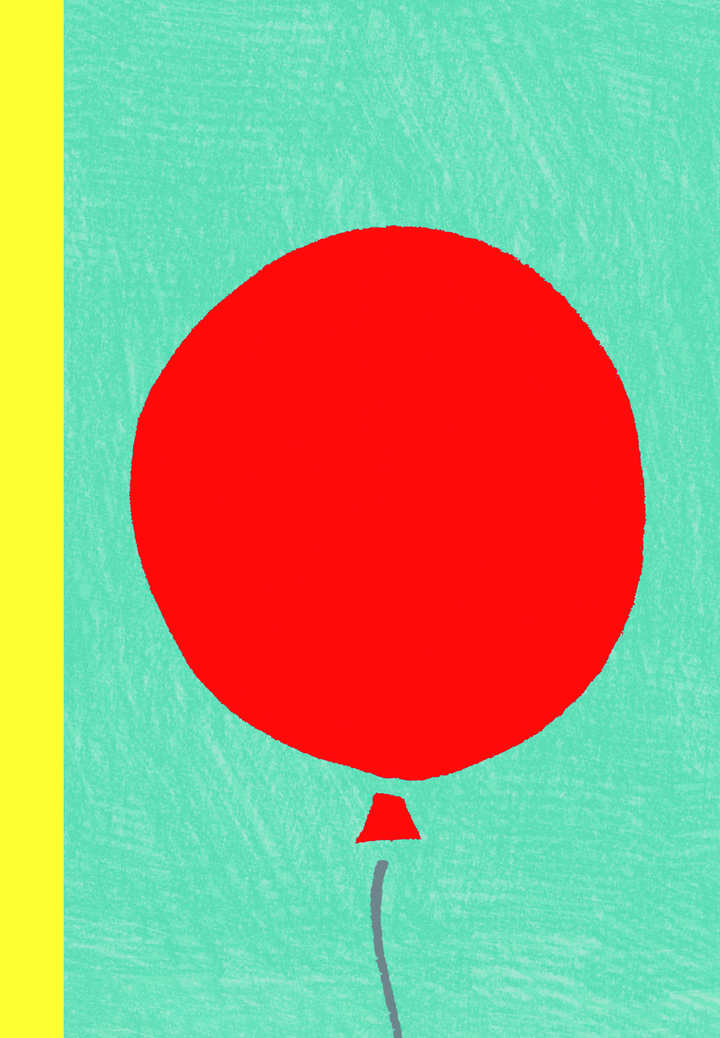누군가를 잃는 경험은 그와 더 이상 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시간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관념적인 의미만도 아니다. 그것은 나와 그를 둘러싼 구체적인 감각의 세계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뜻이다.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웃는 표정을 볼 수 없고, 겁먹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오랜 시간 배어든 특유의 살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기억은 무엇보다 촉각으로 남는다. 부드럽고 말랑한 살갗이나 촘촘하고 가느다란 털, 곁에서 잠드는 동안 전해지는 뒤척임, 포옹하면 느껴지는 신체의 굴곡 같은 것들. 촉각은 단지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의 가장 깊은 바닥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최근 무척 좋아하게 된 시인의 시를 읽고 그런 생각을 했다. 언어는 추상화된 기호 체계인데도 시는 어떻게 이렇게 촉각이라는 감각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걸까? 구윤재의 시 ‘흔들려 움직이는’(문장웹진, 2024년 12월호)의 일부를 옮겨본다. “나의 고양이를 닮았군 나의 고양이를 닮았다 나의 고양이는 길에서 1년 정도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름다운 고양이로 자외선 차단 능력이 없어 삼색으로 곱게 타 버린 그러나 살성이 말랑하여 만지면 주르륵 흘러내리던 그 고양이는 해를 너무도 좋아하여 커튼을 쳐도 커튼 속에 들어가 햇볕을 쬐던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는 그렇게 되었다 어느 날 녹아 버려 창틀이 되어 버린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열 수 있는 창문을 앗아가 버린 못된 삼색 고양이를 닮았다 … // (…) // 조심스레 문을 열고 미지근한 물로 표면에 묻은 흙을 닦아 내자 투정을 부리는 돌 나는 안절부절 돌을 마저 씻기고 찬 바람 밑에 놓는다 돌은 또 돌대로 기분이 좋아져 다시 긴 잠을 자기 시작한다 나는 커튼이 빈틈없이 쳐져 있는지 확인한 후 돌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석 위에 돌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돌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방석에서 미끄러져 바닥에서 완전히 뻗는다 나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런 돌을 바라보고 // 에어컨 바람이 이토록 상쾌한 한여름의 오후 // 나는 잠든 돌을 보다가 그 옆에서 스르르 잠이 드는데… // (…) // 나는 예외적으로 질 좋은 잠을 잔다//돌이 자신의 방식으로 노화하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는 채로”
시의 화자는 이제는 곁을 떠난 아름다운 고양이를 촉각으로 기억한다. “살성이 말랑하여 만지면 주르륵 흘러내리던”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 햇볕의 따뜻한 온기를 즐겨 창가에 자주 가던 습관. 화자는 사랑하는 고양이가 떠난 후 창문을 열지 못했다는 것은 한동안 바깥에 나가지 못했다는 뜻일 테다. 이 상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예상치 못하게도 돌이다. 돌을 만지며 화자는 사랑했던 고양이를 다시 느낀다. 마치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돌보듯,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는 돌을 살살 쓰다듬고 미지근한 물로 씻긴 다음 찬 바람 아래에서 천천히 재운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면에 시달렸던 화자도 그제서야 깊고 평온한 잠에 든다.
사랑하는 존재의 몸은 사라져도 그 몸을 기억하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양이의 따뜻한 체온, 말랑한 살결, 햇볕 아래의 나른한 움직임은 돌을 껴안고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되살아난다. 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감각이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몸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다른 몸으로 이어지는 일이라고. 신체 기억은 다른 몸을 빌려 사라진 존재를 계속 사랑하게 만든다. 그렇게 세계는 계속 흔들리며 움직인다.

![[김상미의감성엽서] 사랑의 밥](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520253.jpg)
![[우리말 바루기] ‘콧망울’을 누를 수 없는 이유](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초대시] 신영규 시인의 ‘철학이 말을 걸어오다’](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4/1508643_694253_2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