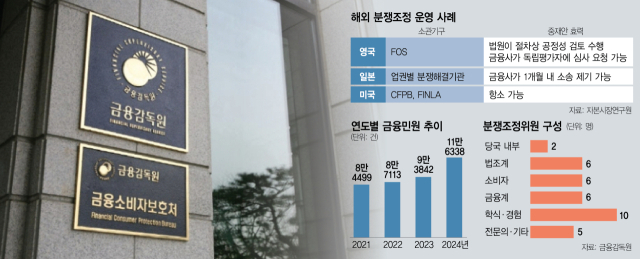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Claude) 개발사인 앤스로픽(Anthropic)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5억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2조원이 넘는 돈이다. AI 사업자에게 저작권은 존립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데이터 활용의 선결 과제로 저작권이 제시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공데이터법의 효시가 된 2010년 '공공정보 제공 지침'에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 제공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AI 골든타임을 논하는 시점에, 저작권은 일견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 있다. 심지어 창작자의 재산권을 마치 '규제'처럼 오해하는 주장도 보인다. 하지만 '저작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는 입법이 '규제'이고,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돼야 한다. '실증특례' '안심구역' 모두 같은 맥락이다. 국제협약·FTA 등의 국제법적 한계도 있어, 신중하고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문 한두 개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곳에서 제기하는 소위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우려스럽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나 EU DSM 지침 제3조·제4조를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모범 정답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일본에서는 퍼플렉시티가 신문사들로부터 40억엔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불려 갔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EU사법재판소에 DSM 지침 제4조에 대해 선결적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게다가 해외 사례로 언급되는 TDM 조항들은 모두 2022년 챗GPT 등장 이전에 마련된 것이다. 생성형 AI에 유효한 조문인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고 폄하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오히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AI 골든타임, 저작권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이 데이터 활용의 장애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데이터는 비경합성·비배제성이라는 경제학적 특성을 가진다. 많이 이용될수록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 저작물 역시 동일한 특징을 가진 무형자산이다. 저작권법 제1조에는 아예 '원활한 이용의 도모'라는 문구가 명문화돼 있다. 데이터법제와 방향성을 같이 한다.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실제로 AI 사업자들이 저작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창작물이 AI 학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창작'이 있어야 '이용'도 있다. 데이터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에도 데이터자산·산업데이터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
결국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정공법이 가장 빠르다. 일방의 희생이 강요되는 무리한 법과 정책은 비극적 결말이 예정돼 있다. 손놓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권리정보시스템 등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진행을 독려해야 한다. 당장 마중물로 언급되는 공공저작물 역시 구호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받아 이용한 국민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 AI 학습 가능한 저작물을 선별하고 제공하는 것, 모두 비용이 소요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문화침략이라며 걱정하던 우리는 지금 문화수출국이 돼 있다. 콘텐츠 경쟁력이 AI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더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AI 사업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AI 3강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최진원 대구대 교수 studylaw@studylaw.biz


![[사설] AI창작물 권리 정립, 한발 앞서가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2/news-a.v1.20250912.48d9893169514decb3675c6c7039d2cf_T1.jpg)
![[로터리] 창작 활성화와 기술혁신의 조화](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W4T793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