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 기업금융이나 부동산금융 구조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는 특정 자산이 채무자의 도산 또는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 구조를 설계하는 기법을 말한다. 흔히 부동산담보신탁, 자산유동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서 활용된다.
최근 필자가 검토한 사안은 이 ‘도산절연’ 구조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A사는 채무자의 점포 중 하나를 임차해 오랜 기간 영업해 왔다. 해당 부동산은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담보신탁이 되어 있었고, A사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그 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A사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A사의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채권자로서 집합적으로 변제를 받아야 할 위치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안의 핵심은, A사가 담보권을 설정한 대상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신탁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산절연의 법리가 작동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이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한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거나 실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해당 판례는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실권되더라도, 제3취득자에 대한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곧, 회생절차라는 강력한 집단적 채무조정 장치조차도 제3자 소유의 신탁자산에 설정된 담보권까지는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A사의 경우, 신탁된 부동산의 공매처분 등 사후 절차를 통해 담보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에서 감액된 채권액과 무관하게, 신탁부동산의 환가금액 범위 내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사안을 처음 접하는 채권자들이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등재되었다’는 점만 보고 불안해하거나, 이의신청 등의 절차적 대응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도산절연 구조와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회생채권 분류 자체는 임차인의 실질적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 성격을 다툴 실익도 거의 없다.
회생절차는 집단적인 구조조정 수단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담보권의 벽은 쉽게 넘지 못한다. 도산절연 구조는 단순한 금융기법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권리를 방어하는 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담보권의 설정과 구조에 조금 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고] 펀드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및 설명의무에 관한 단상](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8000993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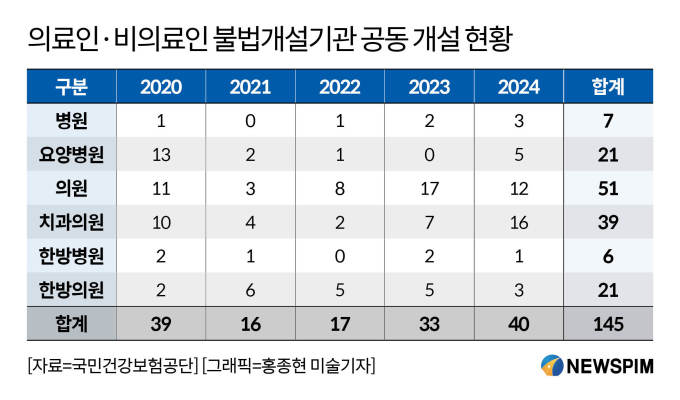


![회삿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더니…'하한가' 직행한 이 종목[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4/25/2GRNOVIZDB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