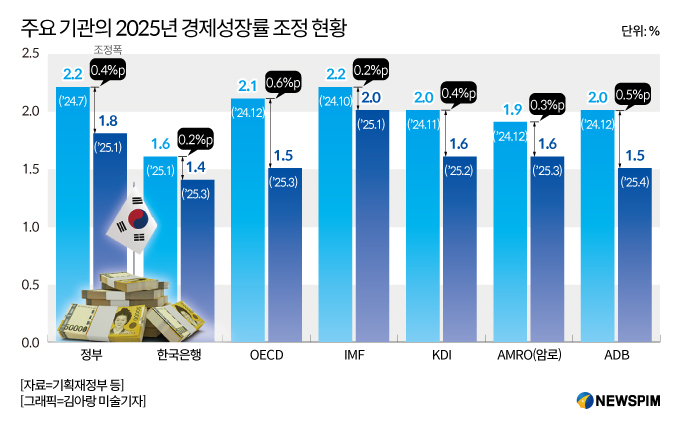일본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성취업제도’를 2027년 도입한다. 단순 인력 유입을 넘어 외국인력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다. 고령화로 후생노동성은 외국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농림수산성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경험한 농업계가 기계화 중심의 대응을 병행하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한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올 3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대체할 육성취업제도 기본 방침을 각의(閣議·국무회의 격)에서 결정했다. 기능실습제도는 외국인이 5년간 기술을 연수하고 귀국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다.
하지만 육성취업제도는 외국인을 고숙련 인력으로 육성한 뒤 일본에 정착시키는 데 방점을 둔다. 저숙련 외국인을 3년 내 특정기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 뒤 평가시험을 통과하면 ‘특정기능 1호’, 이후 ‘2호’ 자격을 얻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다른 분야로 전직도 가능해 기존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
일본 농업계도 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농업신문’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벼농사, 육용우 사육 등 기존에는 외국인 고용이 어려웠던 분야에도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업계 외국인 수용 상한은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이끌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로 유입되고 있다. 최대 체류기간은 각각 8개월, 4년10개월(재입국 시 9년8개월)로 제한됐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전용 비자 신설 등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등이 제안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선 외국인 유입에 적극적인 후생노동성과 달리 농림수산성은 육성취업제도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소연 NH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농림수산성은 농업분야의 외국인력 의존 가능성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화 추진에 집중하려는 기조가 강하다”면서 “현재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의 30%는 귀국을, 15%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이 농업인력으로 정착할지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농업계에서는 전직을 허용한 육성취업제도를 두고 “지방에서 임금이 높은 도시로 인재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유입과 스마트화 병행 전략을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농업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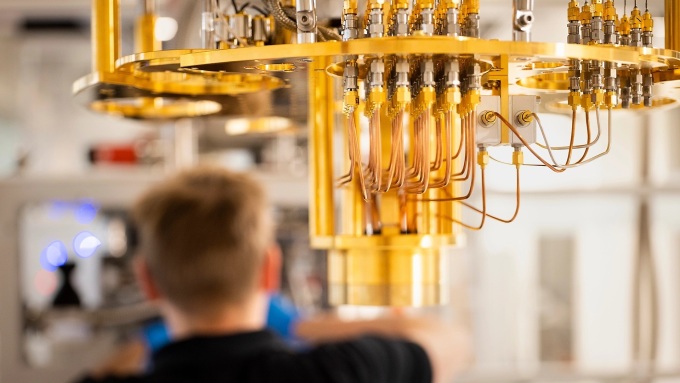
![조단위 무기획득 사업 좌우하는 KIDA…박사급 연구인력 ‘절반’ 그쳐[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4/16/2GRJL2CAU7_4.jpg)

![[남재작 칼럼] ‘디지털 혁명’ 파도 앞에 선 한국 농기계산업](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14/.cache/512/202504145007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