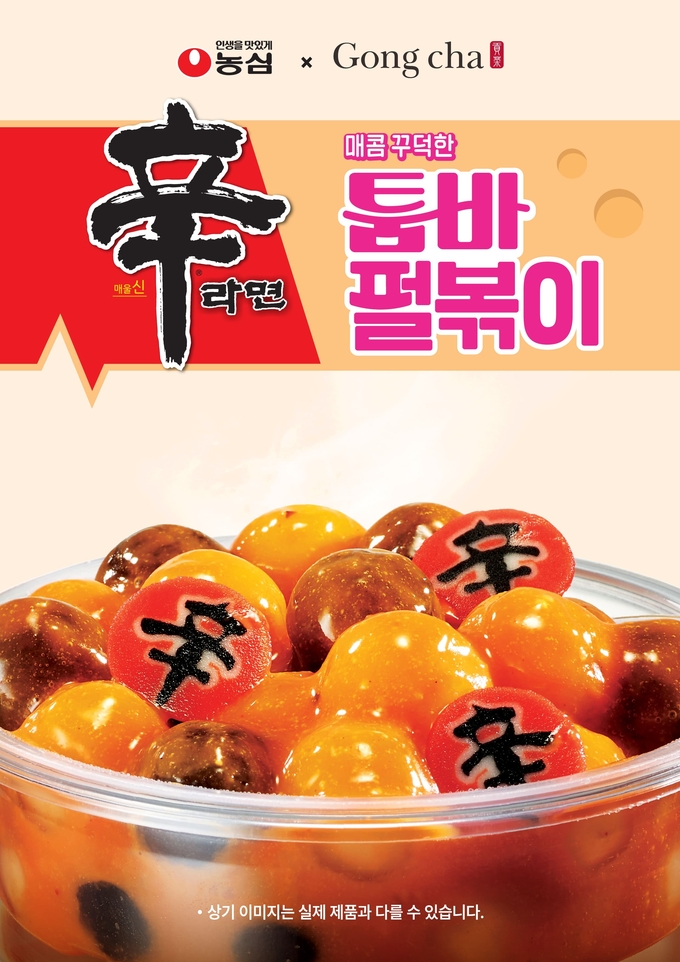예전에 한 섬유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합성섬유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었죠.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으로 대표되는 합성섬유의 원리는 천연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분자들이 결합되어 커다란 고분자를 형성하고, 이 고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하며 섬유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만 합성섬유는 이를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공정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연섬유로 실크라고도 불리는 견섬유가 있습니다. 나방의 일종인 누에가 입을 통해 기다랗게 배출한 물질인데요, 누에는 이 물질로 자신을 둘러싸 누에고치가 됩니다. 누에가 배출하는 이 물질의 정체는 기다란 단백질 고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분자들이 좁은 틈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서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밀착되면 섬유의 형태가 됩니다.
합성섬유는 이러한 자연의 방식을 모방해 만들어집니다. 액상으로 만든 합성 고분자 물질을 노즐이라 불리는 아주 좁은 틈을 통해 강하게 밀어내고 응고시켜 섬유를 생산하죠. 그런데 누에를 모방한 것은 비단 합성섬유만은 아닙니다. 제면 공정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면 글루텐 단백질이 형성되면서 탄력성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칼로 썰어 그대로 면의 형태로 만들기도 하는데, 절면이라 부르는 방식이죠. 칼국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죽을 계속 치대고 늘이면서 면을 뽑을 수도 있는데, 흔히 납면 또는 수타면이라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력성은 더 강해집니다.
만약 더 쫄깃함을 원한다면 작은 구멍들이 뚫린 틀에 반죽을 넣고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면서 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압면이라 부릅니다. 메밀 등 찰기가 부족한 재료로 면을 만들 때, 또는 쫄면처럼 극강의 쫄깃함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견섬유의 뛰어난 물성은 단백질 고분자들의 특이한 배열 때문입니다. 누에가 고분자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길이 방향의 밀고 당기는 힘 그리고 횡 방향의 압력이 작용하면 고분자들이 일렬로 배열하면서 밀착되는데, 그러면 고분자들 사이의 결합이 활성화되며 강도가 높아집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계속 늘리거나, 때로는 마치 누에가 그러하듯 좁은 틈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도 단백질 고분자들은 일렬로 배열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결합도 활성화되면서 탄력성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흔히 기다란 면은 무병장수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본다면 쫄깃한 식감을 위해 면이 이처럼 기다랗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은 현미경을 통해 세포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현미경 관찰을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수많은 대상을 관찰했는데, 그중에 누에고치도 있었습니다. 그는 누에고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살핀 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용하면 인간이 직접 섬유를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과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섬유가 아니라 면을 생산하고 있었죠.


![[박태선 교수의 뷰티 컬럼] 장내 미생물, 혈압과 피부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1146/art_17629252735663_2cdf51.png)
![[단독] (주)바이오뷰텍, 바쿠치올보다 우수한 항노화 효과의 키올오일 개발](https://www.cosinkorea.com/data/photos/20251146/art_17630033219161_954733.bmp)
![[이영미의 식물식평화세상] 익은 호박 알뜰살뜰](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13/p1065611503833624_259_thum.jpg)

![[생활 속의 자연과학] 독감 이후 왜 비린내만 남았을까?](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13/p1065611665387843_539_thu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