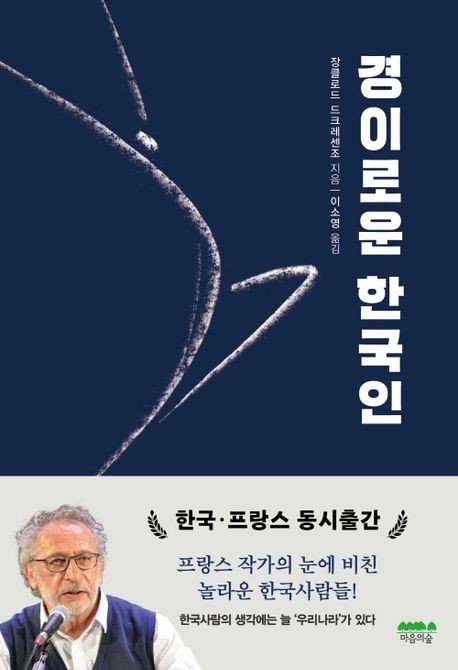호떡과 초콜릿, 경성에 오다
박현수 지음
한겨레출판사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가게”
요즘 얘기가 아니다. 1938년 소설가 유진오가 잡지에 쓴 글 ‘현대적 다방이란?’이다. 검은 커피에 흰 설탕 넣고 살살 저어 녹일 줄 알아야 경성 멋쟁이. 식민지 젊은이들은 커피 맛 좋다는 명치제과를 '명과'로 줄여 부르기도 했다. 가족의 기대와 달리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은 다방에서 10전짜리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를 보냈다. 시인 이상은 “꿈조차 고독하면 그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라며 “다방은 고독한 꿈이 다른 고독한 꿈에게 악수를 청하는 공간”이라고 썼다.
커피만이 아니다. “만주노 호야호야(만주가 뜨끈뜨끈)” 추운 겨울 밤거리에서 외치던 고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 준 만주, 시인 이상이 스물일곱 나이로 죽기 직전 먹고 싶다고 했던 도쿄의 가게 ‘센비키야'의 멜론, 노동자와 학생의 허기진 배를 채워 준 호떡, 레모네이드에서 유래한 조선 첫 탄산음료 ‘라무네’, 그 시절에도 ‘연애사탕’이라 불린 초콜릿부터 군고구마ㆍ빙수까지. 끼니를 해결하기조차 힘겨웠을 식민지에서도 배부른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성균관대 박현수 교수는 빛바랜 갱지 속 박제가 된 근대 문학의 주인공들을 8가지 디저트의 세계에서 살아 숨 쉬게 만들었다.

제국의 식량 기지가 된 조선에서 멜론은 비싼 몸값을 자랑하며 과일마저 서열화했다. 만주ㆍ군고구마와 똑같은 5전짜리지만 호떡집이 유난히 불결하고 불온하게 묘사된 것에는 중국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올라서려던 일본의 의도가 녹아 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이효석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눈망울을 “라무네 병 속의 구슬 같다”고 묘사했다. 문명의 세례를 거친 모더니스트의 눈에 비로소 ‘순수하고 깨끗한’ 근대 자연의 아름다움이 들어왔다.

달고 차가운 디저트의 부상은 이전까지 즐기던 간식이 밀려나는 과정이었음을 저자는 눈여겨 봤다. 한과ㆍ약과ㆍ식혜ㆍ엿 같은 주전부리는 새로운 디저트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 디저트는 문명이라는 가면까지 쓰고 조선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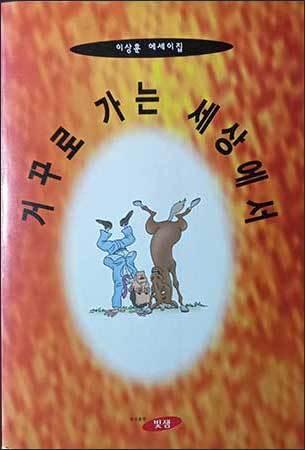
![[시인의 詩 읽기] 다 다른 봄](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29/.cache/512/202503295000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