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먼저 말하진 않는다. 하지만 다들 짐작은 한다.
“진짜 국산 맞아?”
요즘 철강 유통시장 곳곳 암암리에 돌고 있는 이야기다. 특히 무계목강관과 이를 통해 제작하는 열교환기 튜브 등 유통 구조가 복잡한 품목일수록 그 수위는 더 높아진다. 공식 문서엔 아무 문제가 없다. 히트넘버와 시험 성적서도 모두 갖췄다. 그러나 ‘진짜’인지 묻는 질문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육안으로는 구별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면 상태는 정품과 다를 바 없고, 단기간 사용에선 품질 이슈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사실상 서류뿐이다. 그런데 그 서류들이 조작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장 이름이 버젓이 적힌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누군가는 '진짜 같은 가짜'를 판다. 누군가는 그걸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쓴다.
이런 위장 유통은 더 이상 일탈적 예외가 아니다. 일부 유통업체는 수입재에 국산 인증서를 붙여 출하하고, 특정 제조사의 명의를 빌려 ‘국산인 척’ 포장한다. 특히 공급이 급할 때는 가격과 납기만 보고 거래가 이뤄지기 일쑤다.
문제는 거래가 끝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난다. 품질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는 모호하고, 수요업체는 납득할 해명을 듣기 어렵다. 애초에 출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더 깊은 문제는 시장 전체가 이 구조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인데, 모두가 조용하다. 제조사는 언급을 꺼리고, 유통업체는 "우린 전달자일 뿐"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수요처는 “우리도 속았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책임을 지는 주체는 없고, 신뢰의 공백만 커진다. 그사이 정직하게 생산한 국산 자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당하고, ‘정품’이라는 타이틀조차 제대로 된 프리미엄을 인정받지 못한다.
산업은 신뢰 위에서 굴러간다. 한 번 틀어진 신뢰는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신의 구조는 국내 철강 산업의 정통성과 경쟁력까지 갉아먹는다.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때, "그때는 왜 다들 침묵했을까"라는 자문이 돌아올지 모른다. 산업의 바닥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 지금, 가짜는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파식적] 티후아나 투스텝](https://newsimg.sedaily.com/2025/04/27/2GROO3U7W5_1.jpg)

![[이내찬교수의 광고로보는 통신역사]〈32〉트럼프 관세가 소환한 데자뷔 '국제전화정산'](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5/news-p.v1.20250425.760eaedc51b44572974f1b85f8328426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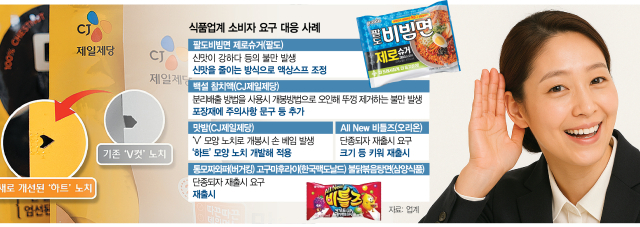

![[단독] 김 가격 비싼 이유 있었네...러시아·일본 싹쓸이에 해수부 '속수무책'](https://img.newspim.com/news/2025/04/26/2504261528453450.jpg)
![SKT 해킹 틈탄 '유심 교체' 피싱·스미싱 기승 [디지털포스트 모닝픽]](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4/54153_147549_5652.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