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석유화학 업계가 받아든 첫 성적표는 마이너스였다. 2022년부터 이어진 장기 침체 속에 석화산업은 마땅한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G화학(051910)은 올해 1분기(연결 기준) 447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동기 대비 68.9% 증가한 호실적이다. 매출도 12조 1710억 원으로 4.8% 증가했다. 특히 전 분기 2520억 원 적자에서 1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LG화학의 흑자는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미국 세액공제 확대 효과가 큰 역할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6조 2650억원에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로 돌려받은 금액이 4577억 원에 달한다. AMPC를 제외하면 830억 원 적자인 셈이다.
LG화학은 본업인 석유화학부문에서 매출 4조 7815억 원에 5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산공장 정전에 따른 가동 중지와 국내 전력 단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생명과학부문도 매출 2856억 원, 영업손실 134억 원을 봤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백신 등 주요 제품의 수출 선적 시점 차이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며 수익성도 하락했다.
한화솔루션(009830)은 1분기 매출 3조945억 원, 영업이익 303억 원을 기록했다. 케미칼과 첨단소재 부문에선 912억 원, 1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주요 제품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판매가격이 하락했고 대규모 정기보수가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둔화됐다. 태양광 셀과 모듈을 주로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영업이익 1362억 원을 내며 적자를 상쇄했다. 하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 부문도 AMPC로 얻은 흑자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익을 냈다고 보긴 어렵다.
LG화학, 한화솔루션과 함께 3대 석화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케미칼(011170)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자가 유력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롯데케미칼의 1분기 영업손실은 1341억 원이다. 효성화학(298000)도 5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14분기 연속 적자다. 이밖에 SK이노베이션(096770)은 매출액 21조1466억 원, 영업손실 446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화학사업은 영업손실이 1143억 원에 달했다. 에쓰오일도 매출 8조 9905억 원, 영업이익은 215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화학 부문 적자가 745억 원이었다.

석화 업체들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LG화학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처리 필터 사업을 하는 멤브레인 사업부에 대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매각가는 1조 3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석유화학 산업 실적 부진으로 재무 부담이 커지자 알짜사업이라도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다. 멤브레인 사업은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약 642억 원에 달한다. LG화학은 5000억 원 몸값의 에스테틱 사업부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배터리 소재와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등 주력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던 롯데케미칼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일본 소재기업 레조낙 지분 4.9%를 2750억 원에 매각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부터 비효율 사업 및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지분 49% 중 25%에 대해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맺어 6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미국 법인 지분 40%를 활용해 6600억 원의 유동성을 마련했다. 파키스탄 법인을 979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SKIET)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고, 효성(004800)화학은 특수가스 사업을 계열사인 효성티앤씨(298020)에 넘겨 9200억 원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본 사업이 살아나지 않은 화학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과잉 공급, 글로벌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똑부러진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좀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줄 것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구체적인 산업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로 인한 조기 대선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를 만드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하거나 매각하는 '빅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업 간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고 정부도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 재편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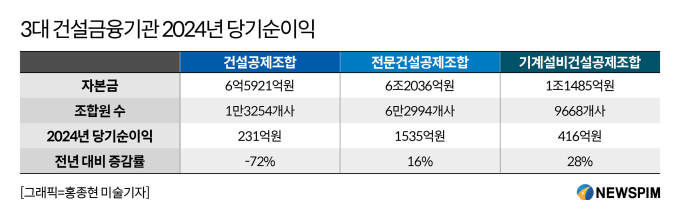

![[GAM]인컴 투자 1순위 EPD ① 'S 경고' 두렵지 않은 6.8% 분배율](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0251467530.jpg)
![[특징주] 두산, 올해 실적 개선 전망 '상승'](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4131_850555_4327.jpg)

![[GAM]인컴 투자 1순위 EPD ② 78억달러 성장 동력, 34% 상승 예고](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02515914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