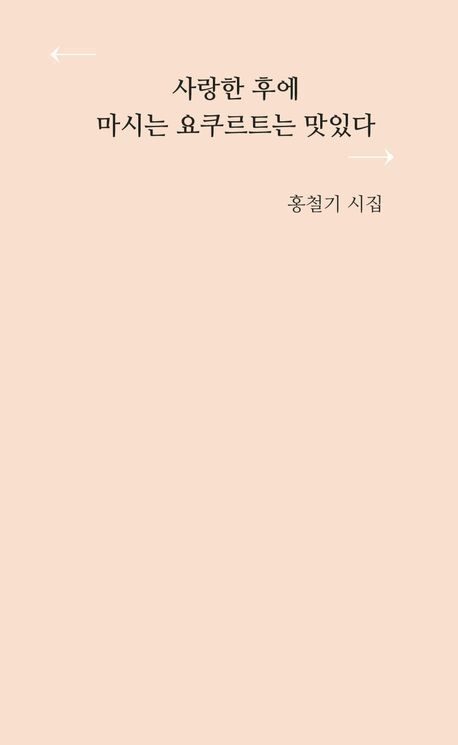올해도 어김없이 아파트 주차장 초입에 배롱나무 꽃이 활짝 피었다. 무더운 여름내내 피어서 출퇴근 시에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처럼 열흘 넘게 피는 꽃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배롱나무는 백일 넘게 붉은 꽃을 피운다. 그래서 ‘백일홍 나무’라고 불렀다. 소리가 바뀌어서 배롱나무라는 예쁜 이름으로 굳어졌다. 자미화(紫微花)라고도 한다.
백일홍이라면 멕시코 원산 백일홍을 먼저 떠 올리게 된다. 그러나 식물학적으로 전혀 무관하다. 배롱나무는 나무이고 백일홍은 풀이다. 배롱나무는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낙엽까지 다 마친 뒤에도 살아서 이듬 해 봄에 다시 새 가지 새 잎을 내는 나무이고, 백일홍은 꽃이 핀 뒤에 시들어서 지면 땅위에 올라 왔던 부분은 가을 지나 사라지는 꽃이다.
자연스레 이름만으로도 이제는 백일홍과 배롱나무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백일동안 꽃을 피운다고 했지만 하나의 꽃이 백일 동안 피어 있은 것은 아니다. 수많은 꽃들이 차례대로 피어나는데 그 기간이 백 일이나 계속된다.
배롱나무의 꽃은 한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가지 끝에서 고깔 모양의 꽃차례를 이루며 한 뼘이 넘는 크기로 뭉쳐서 피어나는데 꽃송이 하나하나는 그리 크지 않다. 주름투성이인 여섯 장의 꽃잎은 꽃받침에서 길쭉하게 뻗어 나와서 따로따로 나뉘어 피어난다. 꽃 한 송이에 암술은 하나이고 수술은 마흔 개까지 달리는데 마흔 개의 수술 가운데 가장자리의 여섯 개는 유난히 길게 뻗어 나온다. 이 같은 꽃송이들이 가지 끝에 한데 모여서 이루는 꽃차례 하나의 크기는 대략 20센티미터쯤 된다.
배롱나무 꽃은 진한 분홍색으로 피어나는데 요즈음은 흰색, 보라색, 자주색, 연한 분홍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을 볼 수 있다.

배롱나무는 대략 3미터정도 크기로 자라며 잘 자라야 7미터정도 밖에 안되는 작은 키의 나무이다. 줄기 껍질은 벗어놓은 듯 매끄럽고 반들거린다. 손가락을 살살 만져주면 간지럼을 탈 것만 같은 여린 피부의 느낌을 가졌다. 늦가을 배롱나무의 줄기 껍질은 연한 붉은 색이 도는 갈색인데, 그 위에 흰 얼룩무늬가 곱게 번졌다. 꽃이 없어도 배롱나무를 보는 즐거움이다.
사철내내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정원을 꾸밀 때 배롱나무가 환영받는 이유이다. 남도에서는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졌다.
간질나무, 간지럼나무라고도 하는 것이 수피의 느낌에서 온 것이다.
중국이 원산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이남 지역에서 주로 심어 키운다. 기후 온난화로 중부지방까지 올라갔으나 겨울에는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해마다 뜨거운 여름에 붉은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었으면 한다.
百 日 紅
봄과 헤어진 후 갑절이나 실망스럽더니
여름 신령 교묘하여 붉고 고움 만들었다.
향기와 혼은 훈풍으로 돌아들어 깨어나고
고운 골격은 옥 이슬 머금어 어여쁘다.
푸른 풀 서원에서 밝은 해에 우쭐거리고
푸른 술잔 북해 집에서 차린 술자리 빛낸다.
가장 슬픈 건 해마다 꽃은 같은데
삶이 들쑥날쑥하여 지난해와 다른 것이라.
註 서원; 한나라 때 장안 서쪽에 있던 상림원의 별명이다
북해; 북해 태수 공융(孔融)을 말한다.
눌재(訥齋) 박상(朴祥1474-1530)
배롱나무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시이다.
광주시 남구 방하동 (사동길. 절골)에 봉산재와 충주 박씨 재실과 행장비와 뒷메에 눌재의 묘소가 있다.
명옥헌(鳴玉軒)은 사미시에 급제한 명곡(明谷) 오희도(1583-1623)가 살던 집의 원림이다.
아들 오이정(1619-1655)이 명옥헌을 짓고 건물 앞뒤에 상하 방형의 연못을 파고 계곡 물을 당겼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옥구슬이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고 하여 鳴玉軒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연못 주변에 심어진 배롱나무로 유명하며 여름철이 되면 석 달 열흘 동안 늘 붉은 꽃나무로 연못이 둘러싸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롱나무의 군락이다.
인조가 왕에 오르기 전에 오희도를 방문한 흔적도 있다. 많은 시문객이 제영(題詠)남겼다.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후산길103에 있다. 대한민국 명승 58호. 명옥헌 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