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의 중심축으로 성장했지만, 경영성과는 정체 상태다. 매출과 순이익이 장기간 답보하면서 질적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인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농업법인 운영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법인은 2만6104개로 2000년(5208개)의 4배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했다.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3%에서 2022년 20%로 껑충 뛰었다.
농업법인이 급증한 배경에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있다. 농지 소유와 출자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농업법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9∼2022년 13.7%로 2000∼2009년 평균(4.3%)을 크게 웃돌았다.
법인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는 해외에서도 주요한 정책 기조다.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체는 소득세 면제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에 한계가 있어 자본 조달과 경영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프랑스 등은 농업법인을 기반으로 자본을 원활히 조달하며, 규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내 농업법인을 들여다보면 질적 성장 측면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2년 농업법인당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0.2%에 그쳤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연평균 2.3% 감소했다.
연광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2009∼2022년에는 질적 성장을 동반하지 못한 채 양적 성장만 이뤄졌다”며 “다수의 농업법인이 경영 역량 미흡, 농업경영 이외의 설립 목적, 지속적 투자 부족, 형식적 출자자 구성, 개별 농가 경영과 농업법인 경영의 미분리 등으로 경영 효율성과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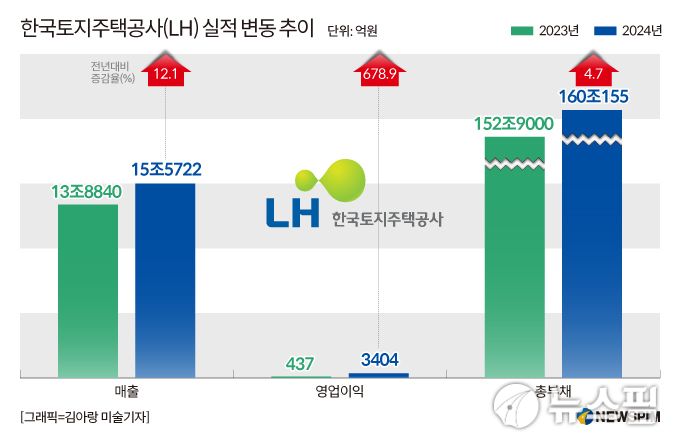



![[헬로즈업] ‘수출 길잡이 드림팀’ 결성...KICEF 2025, 산단 글로벌 판로 개척 ‘서막’](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418/art_17459820790955_d064e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