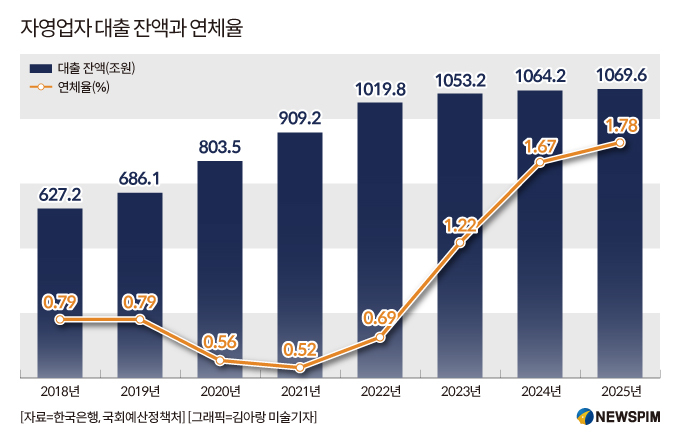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전세 진입 장벽과 높은 보증금 부담을 피해 ‘보증금 없는 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담보 장치가 사라진 구조 속에서 집주인의 리스크는 커지고, 극단적 훼손 방치 사례까지 등장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단기거주 확산…하지만 분쟁 리스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없는 월세는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단기 체류자에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다. 전세 진입 장벽이 높고, 월세 보증금까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한층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월세는 2024년 기준 3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만원(18.8%)정도 오른 수치다. 특히 20대(25~29세)는 평균 50만원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은 평균 45만원, 서울은 63만원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휴학자가 평균 34만원을 내고 있었고, 대학 졸업 이상은 평균 4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증금이라는 담보 장치가 없다보니 집주인의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진다. 실제 한국부동산원·법원행정처 집계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민사 소송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 늘수록 임대인의 미납·훼손·퇴거 분쟁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즉, “보증금 없는 월세”는 세입자에게는 당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지만, 집주인은 사후 구제가 어려워지는 위험을 떠안고 있는 구조다.
한국부동산원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건수는 2021년 353건에서 2023년 665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탈세와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의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접수된 건 중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간 약 68%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증금이 없는 형태일수록 임대인의 손해를 즉시 회수하거나 예방할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에서 위험도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이미 ‘집주인의 선의’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증금 없이 방 내줬다”…쓰레기장 수준으로 훼손 후 잠적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던 세입자가 원룸을 쓰레기장 수준으로 만든 채 도주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세입자는 청소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은 채 잠적했으며, 원룸 주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버지가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을 만들어 놓고 도주한 세입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글과 함께 방 내부 사진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세입자를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았고 월세가 밀려도 기다려줬다”며 “쓰레기가 조금 있다며 퇴거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 방을 직접 확인해보니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 속 방 내부는 각종 생활쓰레기, 박스, 비닐이 바닥 전체를 메우고 있었고, 화장실은 곰팡이와 오염 찌든 때로 뒤덮여 사람이 사용하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A씨는 해당 세입자에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청소업체를 알아봐 줄 테니 비용을 직접 입금해 달라"며 50만원 가량의 청소비 부담을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돈도 많은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고 거절한 뒤 잠적했다. 결국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쓰레기 처리비로만 105만 원이 나갔고, 변기·싱크대·샷시까지 사용불가 상태라 방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려면 얼마나 더 비용이 들지 감도 오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안 받았던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공간 방치는 단순 생활 태만이 아닌 정신 건강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강박장애 진료 환자는 약 3만 명이며, 이 중 20~30대가 거의 절반(48.9%)을 차지한다. 과도한 물건 축적·방치·정리 불가 같은 문제는 강박 증상 및 기타 정신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그래서 보증금 제도 있는 거다”, “집주인만 일방적으로 위험 떠안는 구조 개선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설]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인식 탓에 실업급여 줄줄 새는 것](https://newsimg.sedaily.com/2025/11/07/2H0CZ5H0CI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