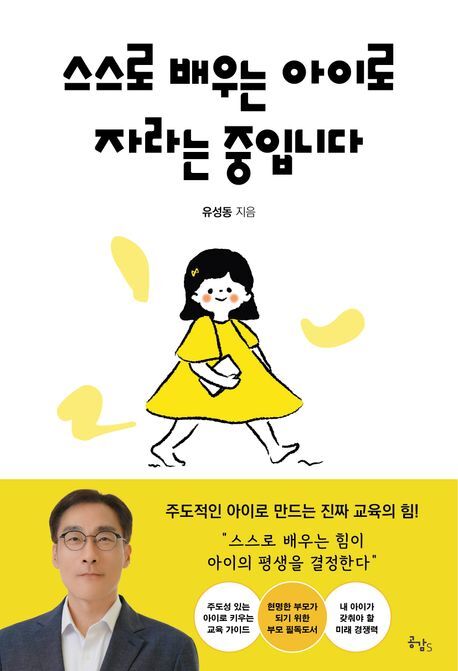우리에게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산다고 생각한다. 내 신체는 사회라는 공간에 머물고, 역사라는 시간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공간은 실재하지만,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시간이 있느냐고 물으면 어디에도 없다. 공간은 신체와 함께 사회 속에 있으나 시간은 공간과 ‘더불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 공간에 있으나 자연에는 시간이 없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신체 속에 시간이 있을 리 없다. 시간은 생각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있다. 어디 있는가. 우리의 의식, 생각과 함께 작용한다. 철없는 어린애는 시간을 모른다. 시간 의식이 발달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인간 의식 기능의 산물
동양에서는 흐름으로 봤지만
서양에서는 역사의식을 투영
미래지향 시각으로 근대 창조

시간의 공동체 의식이 역사의식
시간은 우리의 삶, 그것도 건전한 의식, 생각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 기능은 한 자리에 머물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 지속해 흘러가는 물줄기와 비슷하다. 그 흘러간다고 의식된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현재라고 생각한다. 현존(現存)하지 않는 ‘현재의 순간’이 의식이 머무는 공간이다. 그 현재의 공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나간 기억과 앞으로 있을 기대와 소원이다. 그 기억을 과거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소원의 공간을 미래라고 느낀다. 그런 현상을 시간화시켜서 기억은 과거에 속하고 바람과 기대를 미래 또는 장래라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산다. 의식 기능의 산물이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면서 미래도 의식의 결과로 느낀다. 그 내용을 시간관념으로 재해석해 시간개념으로 창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시간관념이 인간 사회의 역사의식을 만들고 우리는 그 속에 산다는 점이다. 시간의 공동체 의식이 역사의식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동시에 역사적 현실을 살게 된다. 공간을 초월한 관념적 존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관념적 존재는 수없이 많다. 자유·정의·평화, 심지어는 인간애도 그렇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알기 위해 시계를 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 위해 달력을 본다. 그것은 시간 속에 살면서 객관적 시간의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수학이나 기하학은 실재하지 않으면서도 그 규범을 가정해 놓으면 그 원칙을 찾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계와 년, 월, 일, 아침과 저녁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운동순서이다. 그곳에는 자연법칙과 더불어 운동의 법칙과 규범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정된 자연법칙을 인간 생활에 시간으로 전용시킨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주는 대답보다는 자연 불변의 법칙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과거, 미래는 앞으로 주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서는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동양 사람의 절대다수는 그것을 상식화시켰다.
그런데 우리와 시간개념을 반대로 본 사회도 있다. 구약을 믿는 유대교, 신약을 따르는 기독교, 코란경을 믿는 이슬람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시간은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사라진다고 믿었다. 자연 질서를 믿지 않고 신이 주관하는 역사를 믿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역사와 시간의 시발이 되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역사적 시간이 채워진다. 메시아가 온 후에는 메시아의 뜻과 미래가 완성되는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믿는다. 그리고 메시아의 내림(來臨)은 역사의 중심이 되고, 시간과 역사를 충족 완성하는 영원한 신의 시간이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것이 메시아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장래를 위한 시간과 역사를 동일시한다.
이것이 기독교 사회의 잠재적 시간과 역사의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은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이 되고 사회는 역사의식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한다. 서구인들은 그런 세계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유신·무신을 가리면서도 역사와 시간은 같다는 동질성을 인간의 실존적 가치로 여긴다.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이다.
역사의식은 인간 삶의 기본 조건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인류는 3가지 역사를 이어왔다. 인도는 현실을 초월하는 철학과 종교를 현재까지 계승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회를 살아왔다. 영국의 학자들이 인도에는 이상할 정도로 역사가 없다고 평한 그대로다. 중국을 위시한 동양은 윤리와 도덕 사회는 계승해 왔으나 역사의식이 빈약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다시 태어난 기독교 서구 사회만이 과학 정신과 역사의식을 갖추면서 근대사회를 창건 발전시켜 왔다고 인정받는다. 인도의 후진성과 서구의 근대화는 역사의식의 결과라고 정신사가(精神史家)들은 공감한다.
그러면 시간을 포함한 역사의식은 어떤 것인가. 인간적 삶의 기본조건이다. 일제강점기 때였다. 시골 아낙네들이, 일본 순사가 긴 칼을 차고 조용한 시골 마을까지 순찰하는 것을 보며, 나누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물레바퀴도 돌아가는 법인데 항상 이렇게만 살 수야 없지…”라는 말이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역사의식이다. 국내의 애국자들, 해외의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생각이다. 그런 역사의식 속에는 두 가지 엄연한 사상이 들어 있다.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야 한다는 윤리관과 미래를 위한 희망과 창조 정신이다. 사회 공간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역사 창조의 희망과 삶의 가치는 공존하면서도, 역사의식은 더 능동적이고 창조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생존의 질서와 희망이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