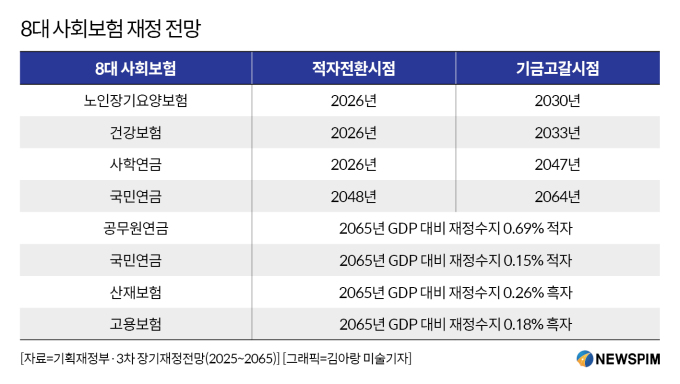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전국적으로 27조원 공적자금 투입
공적 자금 절반 가량 미회수, 최근 예금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전문가 "한도 상향 긍정적 효과 기대", "부실자산 모니터링 강화" 제언

전주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가 14년이 지났지만, 수십조에 달하는 불량채권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 예금보호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저축은행 등 파산한 전국 30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 27조291억원 중 미회수된 자금은 약 13조원으로 전체의 약 48%에 달했다.
당시 계열사였던 전주저축은행도 투입됐던 2173억원의 공적자금 중 회수액은 약 940억원으로 약 57%를 회수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전국 저축은행 파산 사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제2금융권 구조조정 사태로 꼽힌다. 당시 30개의 저축은행이 부실대출과 PF 대출로 인한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영업정지 및 파산에 이르렀고, 해당 은행에 예금을 했던 피해자들에게 당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위해 수십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회수하지 못한 불량채권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예금보호공사는 지난 7월 ‘대출금 상각 및 포기 승인 검토’라는 문서를 정보공개포털에 올리고 회수하지 못한 불량채권들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들의 담보가치가 부풀려져 있어 회수를 해도 손해액을 메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금보호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음 가지고 있던 채권들을 매각해 손해를 메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저축은행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잔존 담보가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호공사의 공적자금은 은행 금융기관들의 보험료 등으로 마련된다. 공적자금의 투입이 잦아진다면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예금보호액의 상향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불량채권 발생에 대한 감시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예금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금융기관이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날 것이다”며 “PF 대출 등 리스크가 있는 사업일수록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부진 및 부실 자산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금이 늘어나고 이는 금융권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부실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은행들에게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