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닌 밤중에 퍼즐 맞추기
2025년 7월 30일, 국립한국문학관 자료실에서 난데없는 퍼즐 맞추기가 벌어졌다. 근대문학 대표작가인 염상섭의 기증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봉투 안에 담긴 종잇조각은 언뜻 보기에도 수십 장이 넘었다. 수북이 쌓인 종잇조각만으로는 그 정체를 알기가 어려웠다. 책상 2개를 붙여 놓고 종잇조각들을 펼쳐 놓기 시작했다. 작가가 별세 직전 ‘사상계’에 연재했던 ‘문단회상기’라는 제목이 곳곳에서 보였다. 펼쳐 놓은 조각들을 맞춰 보았다. 찢어진 조각, 이어진 글자들이 단서가 돼주었다. ‘문단회상기’ 첫 페이지가 여러 장이었고, 그 내용은 저마다 달랐다. 몇 시간에 걸친 퍼즐 맞추기 끝에 그 종잇조각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문단회상기’ 초고의 파지(破紙)를 모아 놓은 것이었다.
지금 세대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겠지만, 작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고전적인 이미지가 있다. 좁고 어두컴컴한 방, 앉은뱅이책상 위에 봉두난발의 작가가 앉아 있다. 재떨이에는 꽁초가 가득하고, 작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 원고지에 무언가를 고심하며 쓰는 작가, 갑자기 원고지를 뜯어 구기거나 쭉쭉 찢어서 던지고 담배를 피워 물며 텅 빈 원고지에 다시 무언가를 쓴다. 글의 신이 오셨는지, 갑자기 일필휘지로 갈겨쓰며 원고지를 넘기기도 한다. 그리고 담배 연기 뭉게뭉게.
검색어를 촘촘하게 넣으면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인공지능(AI)이 그럴듯한 소설을 써준다는 시대다. 사진을 넣으면 순식간에 나를 지브리풍의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런 시대에 원고지에 한 땀 한 땀 글자를 써넣으며 고심하고, 지우고, 고쳐 쓰고, 또 지우고, 찢는 그 행위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글쓰기에 깃든 영혼, 작가정신을 말하기도 조심스럽다. 궁색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그 가치를 전달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서다. 이번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된 염상섭의 자료를 통해 막혔던 말문을 틔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글쓰기’는 위대하다.

염상섭은 누구인가
염상섭은 이광수, 김동인과 함께 한국 근대소설을 완성한 3대가로 불린다. 이광수나 김동인의 친일 논란과는 달리 친일 경력 없이 일생 쉬지 않고 소설을 썼다. 1921년 ‘개벽’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한 이래 1963년 별세할 때까지 그가 남긴 작품은 장편 17편, 중단편 160여편, 산문은 300여편에 이른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태어난 염상섭은 스스로를 ‘경종(京種)’-서울내기라고 칭했다. 근대 도시의 생활 감각과 언어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민감한 작가였고, 시대의 변화와 세태의 저류를 파악하는 사실주의의 대가였다. 염상섭 연구자 이종호의 말을 빌자면 그는 “20세기 한반도와 그 주변에 구축되었던 거의 모든 통치형태를 경험했다.”(염상섭 문학과 대안근대성·2025) 3·1운동의 <만세전>, 일제강점기의 조선 현실을 그린 <삼대>, 해방공간의 <효풍>, 한국전쟁의 <취우>까지, 그가 겪은 시대는 어김없이 소설에 담겼다. 문학평론가 염무웅은 “그의 작품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 시대의 민족현실에 밀착된 불멸의 문학적 초상”이라고 평한 바 있다.

작가의 가난과 품위
유족이 기증한 이번 자료는 육필원고, 발표지면 스크랩, 원고청탁서, 이력서 등 주로 작가의 글쓰기와 생활 주변에 관련된 자료들이다. 발표지면 스크랩은 잡지나 신문에 인쇄된 원고를 잘라서 이면지에 붙이고, 작가가 손수 발표연월일과 지면을 써넣은 것이다. 스크랩 위에 오탈자를 고치고, 때로 가필과 교정을 하기도 했다. 원고지 시대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e메일 전송이 아니라 출판사나 신문사로 직접 육필원고를 보내던 시대에, 원고를 베껴 놓지 않는 한 작가의 수중에 원고는 없다. 인쇄된 지면을 모아서 스크랩하고 후에 단행본을 묶을 생각에 가필도 하고 교정도 한다. 장편 <난류>(1950) 연재본의 스크랩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400자 원고지를 접어서 겹장의 책을 만들고 거기에 회별로 연재소설을 일일이 오려 붙였다. 원고청탁서나 통지문 등의 봉투에서 염상섭이 옮겨 다닌 집의 이력을 읽을 수도 있다. 성북구 돈암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성북구 성북동, 성북구 삼양동… 작가는 쉬지 않고 썼지만, 평생 자기 명의의 집 한 채 없이 가난했다.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받은 이면지를 활용하며, 손수 지끈을 꼬아 원고를 묶으며 살아온 그의 생애가 그가 남긴 유품에 담겼다.

그가 남긴 ‘문단회상기’ 파지 조각은 그의 엄격한 글쓰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 종류의 첫 페이지 파지가 두 동강 난 채로 남아 있다. “보잘것없는 과거를 들춰내서 낯 붉힐 만한 일이라곤 없지만, 그래도 여생이 얼마 안 남았거니 하는 생각에”라고 시작했던 원고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어 대수로운 위인이라고 그럴까마는 숨이 지기 전에 들어 두자는 것은 아닐지라도 문단회상기를 쓰라기에”로 고쳐졌다가, 최종적으로는 “한두 가지가 아닌 연래의 고질이 엎친 데 덮쳐서 붓을 던진 지 기구한 터에 문단회상기를 써 보라 하니”로 바뀌었다. 염상섭 특유의 만연체는 한결같다. 그의 별호처럼 횡보(橫步)의 문체다. 원고청탁서, 파지 원고, 잡지사 편집부의 최종 교정본, 그리고 출판된 잡지를 한 자리에 펼쳐 놓으면 작가의 집필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상계’ 1962년 12월호의 ‘횡보문단회상기’ 2회는 ‘계속’으로 끝맺는다. 그러나 원고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 1963년 염상섭의 별세로 연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사상계사에서 보낸 3회차의 원고청탁서만 유품으로 남았다. 마감되지 못한 그의 회상기를 읽는다. 문학 이전(以前)이면서 이상(以上)인 한 작가의 생애가 거기에 있다.
<서영인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축부장·문학평론가>

![한땀한땀 깨알같이 찾았다, 100년 전 경성의 낮과 밤 [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3056345e-8422-48db-9620-21df26577f8b.jpg)

![[북스&] 뉴욕 미술계의 민낯을 파헤치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AMDZ69_1.jpg)
!["보이는 디테일에 집중" 뉴욕 현대미술계 뛰어든 국외자의 깨달음[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3ff99654-e18c-4a05-8658-0e983b8fabe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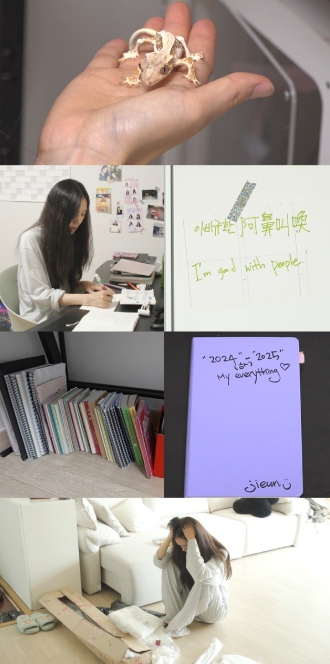
![[아빠 일기] 사라짐](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904/p1065623565050166_424_thum.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