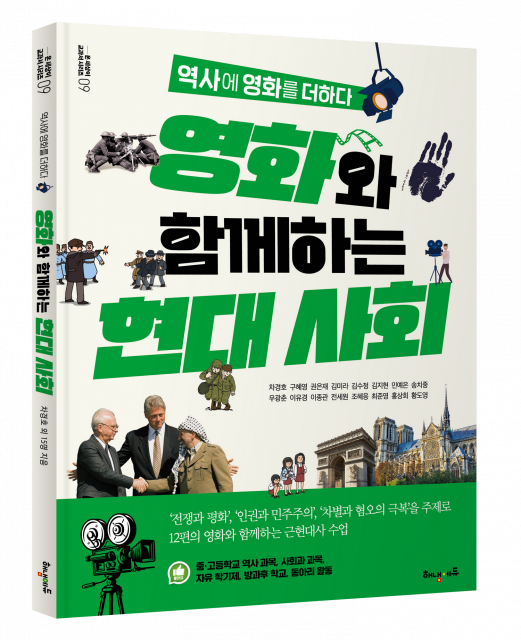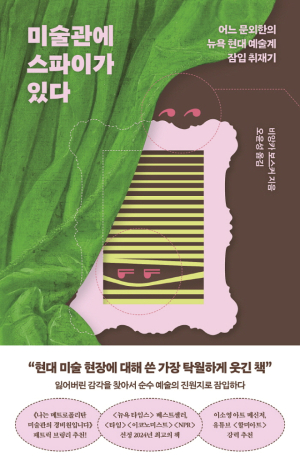
‘미술관이나 전시장 한구석에 서서 ‘대체 이건 뭘 그린 거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이들에게 건네는, 한 이방인의 뉴욕 현대미술 생태계 취재기’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물론 그 이방인은 미국인이고 뉴욕타임스 등에 기고하던 언론인이니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술계 밖 인사가 미술계 자체는 물론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뉴욕 미술계의 민낯을 파헤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환하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책은 특별한 호기심을 끈다.
책 제목 ‘미술관에 스파이가 있다’에서부터 글의 성격은 드러난다. 번역 제목은 원제(Get The Picture)와는 다소 다르다. 설명을 위해 ‘어느 문외한의 뉴욕 현대 미술계 잠입 취재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예술은 오로지 당신이 ‘보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자신만의 시선을 찾아낸다면, 삶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이는 예술이 소수의 전문가나 선택 받은 천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각의 주체로서 예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저자의 신념에서 비롯된 메시지다.
책에서 저자가 ‘스파이짓’을 하는 방법은 몸으로 부딛치기다. 저자는 브루클린의 작은 갤러리 말단 직원 일을 간신히 얻어내면서 작업을 시작한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캔버스를 펼치고 갤러리의 온갖 벽을 몇 번이고 페인트칠하고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아트페어 기간 동안 그림을 팔아보려고 고군분투한다.
이어 억만장자 컬렉터들로 가득한 A급 사교 파티에 끼어들고 추상주의를 이해해 보려고 거의 벌거벗은 공연 예술가의 엉덩이에 자신의 얼굴을 마주 대는 경험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드디어 예술의 성지로 불리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비원이 돼 고요한 진공 속에서 줄곧 하나의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
‘스파이 활동’ 과정에서 소위 업계 관계자들의 미미한 경멸과 차디찬 선 긋기는 이어지지만 저자는 씩씩하게 자신의 질문들의 해답을 찾으러 나아간다. 이런 흥미진진한 탐험기는 어느덧 ‘예술을 본다는 행위란 무엇인가’ ‘좋은 예술이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나아간다.
출판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 예술을 어렵게 느껴왔던 이들에게는 유쾌한 입문서가, 이미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각의 렌즈를 선물해 주는 책이 될 듯하다.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진정한 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색채를, 사물을, 작품을, 예술을, 그리고 삶을 ‘보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할 때다.”
저자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프린스턴대를 졸업했다.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논픽션 ‘코르크 도크(Cork Dork)’의 저자이자 ‘애틀랜틱’의 기고 작가로 활동 중이다. 뉴요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도 글을 기고했다. 2만 3000원.
!["보이는 디테일에 집중" 뉴욕 현대미술계 뛰어든 국외자의 깨달음[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3ff99654-e18c-4a05-8658-0e983b8fabe7.jpg)
![[신간] 유명인들의 실패 이야기, '좌절을 딛고 일어선 거장들의 실패학 수업'](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2221543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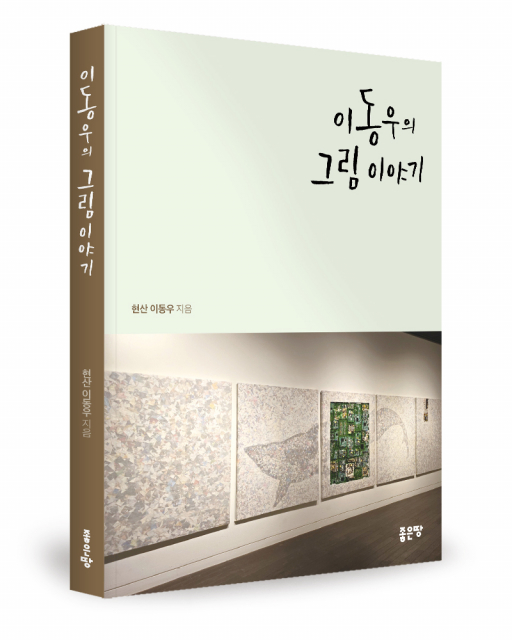
![“글쓰기는 호기심을 되살리고 영감을 주는 여정” 웨스 앤더슨 감독과 다시 만난 몽블랑 [더 하이엔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406a8b60-4d95-4250-9f0a-ffb153b542a1.jpg)
![한땀한땀 깨알같이 찾았다, 100년 전 경성의 낮과 밤 [BOOK]](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3056345e-8422-48db-9620-21df26577f8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