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등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기술 유출 분야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전담 수사 조직은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존 검사·수사관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할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기술 유출에 한해 수사·기소 분리 예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73명에 달한다. 단 10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57명)을 넘어섰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피의자들은 2020년만 해도 1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39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 들어 단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 기술 부문 변호사는 “최근에는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핵심 기술을 원본 그대로 외부에 넘기기 보다 새롭게 가공해 꾸미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된 대상이 됐던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가 다소 줄자,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빼돌릴 만큼 빼돌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기술 유출 행위가 해마다 지능·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형사·사법 체제의 대대적 변화로 자칫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검은 산업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22년 9월 기술 유출 범죄 수사 지원 센터를 반부패·강력부에서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관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자격자나 이공계 출신 검사 등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하지만 검찰청이 내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라 현재는 말 그대로 ‘시한부’ 운영 중이다.
향후 수사 전담 조직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에 우수 인력을 그대로 이식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법무부 산하에 설립되는 공소청과 달리 기존 검사·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찰청을 그만둬야 한다. 지금껏 근무했던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중수청으로 전직을 선택해야 하는데, 뚜렷한 유인 요소는 없고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한 수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은 이미 로펌이나 기업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술 유출 부문 변호사는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이와 역행할 수 있다”며 “공판 단계에서 쟁점이 많아 수사와 공소 유지가 따로 이뤄질 경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한정해 수사·기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와 별도로 기술 유출 수사에서 만큼은 검찰 전문성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T시론]N²SF 정책 가시화를 위한 가치 기반의 정보 등급화 방법](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1/news-p.v1.20251121.c0467054e34b487896e01f0cced282f7_P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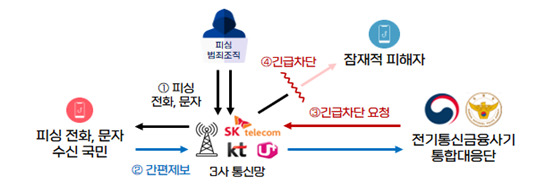




![[법정 선 보이스피싱] ④노동편 '마동석팀' 그녀는 왜 '초선'이 됐나...일자리 잃은 청년들의 선택](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82513136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