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당진·영광·고리·월성… 서해와 동해안에 줄지어 있던 화력발전소 굴뚝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돔들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1~3GW급 핵융합발전소들이 들어섰다. 핵폐기물 유출, 원자로 폭발 같은 ‘판도라’식 공포는 더이상 없다. 핵융합발전소의 콘크리트 외벽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르다. 핵연료봉이 들어가는 원자로 대신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가두는 진공 용기와 블랭킷·초전도자석 등이 들어있다. 전국 해안가 20여 개 핵융합발전소는 국내 전력의 40%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대한민국은 무한·청정에너지인 핵융합 단지와 연계된 초대형 설비 덕분에 연간 수백만 t의 그린 수소 생산·수출국으로 올라섰다. 국가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입은 이제 옛 얘기다. 잉여 전력과 수소는 해저케이블과 암모니아 선박을 통해 일본·동남아 등지로 수출된다. ‘자원 빈국’이던 한국이 전기와 수소를 동시에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핵융합 발전은 미래 새 에너지
미·중, 2030년대 핵융합 상용화
한국은 혁신 핵융합로에 도전
R&D 투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허황된 꿈같은 얘기로 들리지만, 현재 국내외 핵융합 R&D의 발전 속도와 에너지 수요 등을 바탕으로 그려본 30~40년 뒤 대한민국의 장밋빛 모습이다.
늦지만, 한 걸음씩 진보하는 핵융합
‘핵융합은 사기(Fusion is a scam)’ ‘핵융합은 늘 30년 뒤(Fusion is always 30 years away)’. 세계 에너지 학계와 산업계에 오랫동안 떠돈 표현이다. 세계 주요 7개국이 참여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는 애초 2025년, 올해 말 첫 플라스마 발생을 목표로 했지만, 여러 차례 건설이 지연됐다. 현재 재설정된 목표는 2034년. 앞으로 9년 뒤다. 하지만 이런 비난 속에서도 세계 주요국의 핵융합 개발은 한 발씩 진전해오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체 핵융합발전 실증로 설계를 마치고, 건설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출력은 상업발전에 가까운 1~2GW로, 2030년대 초중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는 스타트업 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CFS)가 2030년대 중반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운영을 공언한 바 있다. 현재로선 미국·중국 모두 ITER의 계획보다 10년이 앞서 있는 셈이다.

KSTAR(한국형핵융합연구로)의 ‘1억도 플라스마 300초’를 목표로 해온 한국의 핵융합 연구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대전 유성 가정동 한국연구재단 본부. 오전 9시에 시작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부지 공모 심사’ 선정평가가 오후 7시가 지나서야 끝이 났다. 이날 경주와 군산·나주가 경합한 부지 선정 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내년부터 2036년까지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한다. 총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초전도자석·노심플라스마·증식블랑켓 등 7개 핵심기술과 가상핵융합 기반 첨단 IT 인프라, 초전도 자석 시험·평가 시설, 핵융합 중성자 조사 및 안전성 시험시설 등 5개 인프라 구축이 포함된다. 사업에는 그간 KSTAR를 실험해온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뿐 아니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핵심부품을 공급해온 기업들도 참여하게 된다.
김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 연구실 실험을 넘어 핵융합발전이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단계로 이동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핵융합 상용화로 가는 기술-경제의 분기점이 될 수 있고, 지자체와 산업, 학계가 모두 연계해 입지·산업 클러스터화를 견인할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KSTAR와 ITER 운용을 참고한 뒤 ‘핵융합실증로’(K-DEMO)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증로는 주반경이 약 7m로, ITER(6.2m)보다 약간 큰 수준. 열출력은 1000㎿급으로 ITER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ITER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다, K-DEMO 건설 기간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2050년이 되어도 핵융합로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등이 2030년대 첫 핵융합 발전을 선언한 것을 고려하면 10~20년 늦는 셈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핵융합발전 건설을 당기는 로드맵을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도 2030년대 상용화 노려
정부의 방침과 별도로 KSTAR를 이끌어온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내부 사업 형태로 소형 핵융합로인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기획하고 있다. 이 핵융합로의 주반경은 K-DEMO보다 작은 4m, 열출력은 300㎿, 전기출력 100㎿로, K-DEMO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CFS처럼 첨단 고온 초전도자석을 이용해 성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념설계에 착수했고, 가속화 전략이 낳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운영을 시작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윤시우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원장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는 일종의 작은 규모의 실증로인 셈”이라며 “전략에 따라 R&D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204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핵융합로가 국내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융합발전의 상용화는 인류가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구촌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핵융합발전에 기술력은 물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핵융합발전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 에너지 빈부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 세대가 주축이 돼 살아가야 할 30~40년 뒤 대한민국은 에너지 종속국이 될 것인가, 수출국이 될 것인가. 그 답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1909~2005)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핵융합 발전=태양이 타오르는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발전 방식이다. 수소의 원자핵이 충돌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가량이지만,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도가 돼야 한다.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0313275520_w.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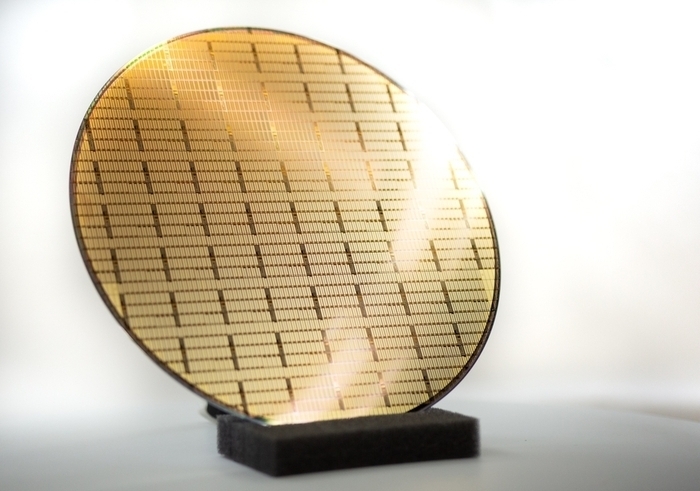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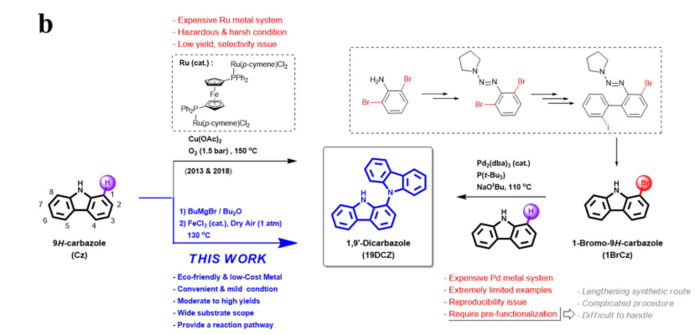


![27조 쏟아붓는 일본…라피더스로 ‘반도체 재건’ 승부수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TTPWEZ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