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탄핵 정국으로 정부 공백으로 통신비 인하 사라지니 웃는 업계?
단통법 폐지도 경쟁 촉발 효과는 글쎄...통신사, 제조사 우월한 시장 지위

최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함께 계엄·탄핵 정국 사태로 인한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통신비 인하 정부 압박이 사라지자 오히려 국내 통신업계가 덕을 본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정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달성을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지속해서 SKT·KT·LGU+ 국내 이동통신3사를 압박해왔다.
제4통신사 설립과 같은 경쟁 활성화 방안은 물론(제 4통신사 방안의 경우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해 2월에는 정부는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통신3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그 당시 최신 스마트폰이었던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 지원금 상향을 요구했다.
그 결과 출시 1주일만에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2배 가까이 상향됐다. 그 당시 이를 두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직접 개입해 시장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 연이었다.
하지만 12월부터 시작된 계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권이 혼란스러워지는 이른바 정치 공백 상태에서 이같은 정치권의 압박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온다.
당장에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3사 대표를 불러 간담회를 가지고 가계통신비 인하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통합요금제다.
통신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통신 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계엄사태로 정계 안팎이 혼란스워지면서 이같은 압박이 사라졌다”면서 “이로 인해 이통사들이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표정관리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단통법 폐지가 실질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덜기보다 오히려 통신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통법의 실질적 폐지는 오는 6월이지만 시장에서는 단통법은 이미 무의미한 규제가 됐다.
단통법 폐지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은 단통법 제정 당시와는 많이 달라진 시장상황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현재 통신3사의 시장 지위가 독보적이며 스마트폰 제조 시장 역시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독과점한 상태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금 상향을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경쟁 촉진이라는 시장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통사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023년 대비 1%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0.6% 감소했다. 2021년부터 통신3사 합산 연간 영업익 4조원대를 유지해온던 것이 깨졌지만 지난해 영업익 감소의 경우 일회성 요인 영향이 컸다.
SKT와 KT의 퇴직 프로그램 가동 및 LG유플러스의 신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과 통상임금 확대 판결을 반영해 영업익이 감소했다. 통신3사는 올해부터 AI 관련 사업 수익화 모델에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미 출시한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 ‘익시오’의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하거나 기존 통신 요금제와 결합해 번들링 형태로 선보이는 방안을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는 합리적으로 통신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뿐만 아니라 최소 1년에 한 번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정도" 外](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075220069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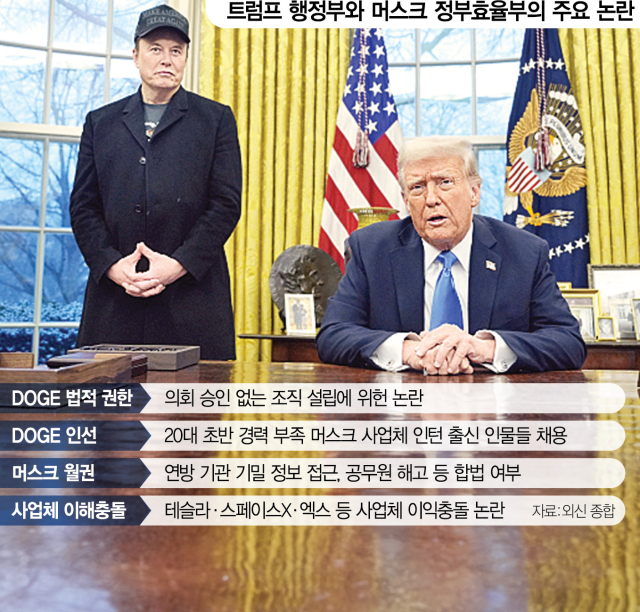


![트럼프 중국 발언에 '또'…"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과정" [김혜란의 FX]](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LK4PNK_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