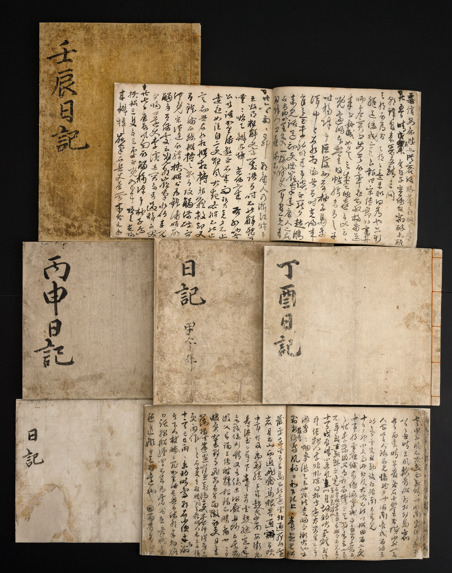엊그제인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울산 롯데호텔에서 ‘2025년 반구천의 암각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필자는 ICOMOS(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회원자격으로 초청받아 참관하고, 19일 오후에는 반구천 암각화 현장을 일행들과 답사하였다.
울산 울주군 대곡천 절벽에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미술의 정수라 불린다. 너비 약 8m, 높이 4.5m 중심 바위 면과 주변의 바위 면에 고래·사슴·호랑이·거북·사냥 장면·멧돼지·사슴 등 312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또 사람이 배를 타고 고래를 잡거나, 활과 화살로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도 보인다. 어미 멧돼지와 새끼 멧돼지도 보이는데, 새끼 멧돼지 특유의 줄무늬까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특히 고래 사냥 장면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어, 한민족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해양생활을 영위했음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7,000년 전 한반도 선사(先史)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반구천을 따라 쭉 내려가면 동해 장생포를 만난다. 30km 거리이다. 한때 고래잡이와 고래고기로 유명했던 곳이다. 땅의 성격은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2025년, 반구대 암각화는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유산 가운데 17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등재 사유에서 “선사 해양활동을 기록한 세계적 걸작이며, 인류가 자연과 맺어 온 관계를 예술로 압축해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틀간의 국제회의는 이를 기념하고 앞으로 보존관리와 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 사실을 전북의 독자들께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 계기이다. 이러한 위대한 유적이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굴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동국대학교 미술사·불교미술 전공 교수인 문명대(1940~) 박사는 1970년 겨울, 울주 대곡리 현지답사 중이었다. 신라 시대 원효대사 머물렀다는 반고사 흔적을 찾기 위해였다. 우연히 마을 주민에게서 “천변 바위에 이상한 무늬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당시 주민들은 이 무늬를 오래된 ‘벼루[硯] 자국’ 혹은 ‘물흐름 무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이곳은 한때 벼루의 특산지였다). 그림이 깊게 새겨진 것이 아니라 겨우 1~2mm 깊이여서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다. 문명대 교수는 주민 안내를 따라 대곡천 절벽 아래로 들어가 바위를 살펴보고, 그곳에 새겨진 수십 종의 동물상과 사냥 장면을 확인하였다. 바로 학계에 보고되었고, 3년 후인 1973년 국보 147호로 지정된다. 평범한 마을 주민의 기억과 학자의 직관이 맞닿는 인연 속에 반구대 암각화는 55년 후인 202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다.
울산은 그동안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공업 도시로 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울산시청 공무원들은 “울산도 이제 세계적 문화·역사 도시가 되었다”는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시는 앞으로 일정 규모의 국제·국내회의를 개최할 경우 3천만~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하며, 공업 도시를 넘어 역사 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주 칼럼에서 지자체 문화원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역의 향토사·구전·민속·유·무형 자원 등을 조사·수집·보관하고 지역 정체성을 유지·전승”임을 언급하였다. 세계 문화유산이 된 반구대 암각화도 마을 주민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이날 국제회의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보존관리와 홍보에 ‘지역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기억의 전승자로 이야기 수집가 발굴”과 “지역 주민과 함께함”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농촌 소멸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와중에도 다행인 것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 8, 90세 노인들이 아직도 생존한다는 점이다. 이들을 “기억의 전승자”로 마을의 민속과 유무형 문화를 채굴함이 시급하다. 지자체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많으나, ‘마을 해설사’가 없다. 지자체와 문화원이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마을 주민을 ‘마을 해설사’로 양성하는 일이다. 마을에서만 통용되는 사투리와 터부·민속·성혈(性穴)·고인돌·당산나무·서낭당·오래된 민가·명당 무덤과 집터·혼맥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은 마을 주민 아니고는 불가하다. 자료가 있어야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가을 추수도 끝나고 날이 추워지면, 난방비 아끼려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상주’하다시피 한다. 이때가 자료 채굴의 적기이다. 울산 암각화와 같은 세계적 문화유산이 전북 어느 산하에 없지 말란 법 없다.
글 = 김두규(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ICOMOS 정회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