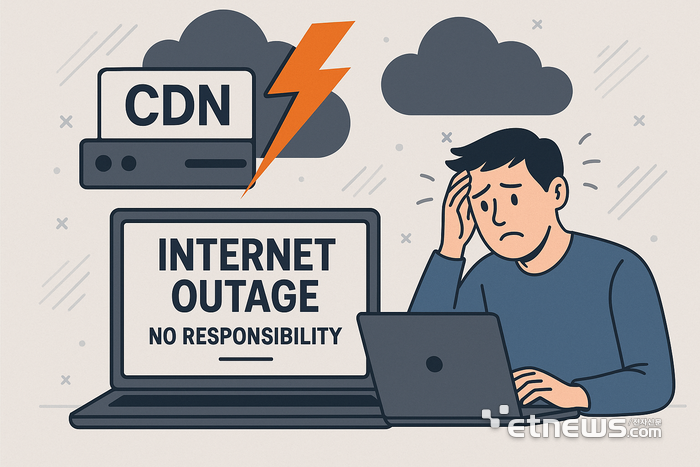
클라우드플레어·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클라우드 사업자의 반복적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을 겪으면서 이들 기업에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통신망 유지·보수 등 서비스 연속성 의무를 짊어진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와 달리 해외 CDN 사업자는 법적 책임 없이 국내 트래픽을 좌우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CDN 사업자인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국내에서도 챗GPT, 엑스(X),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AWS 서버 장애로 수천개 기업·공공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문제는 대형 CDN·클라우드가 사실상 인터넷의 단일 장애 지점으로 기능하는데도 통신사와 달리 서비스 복원력, 공공 책임, 인프라 비용 분담 등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CDN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 요건으로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CDN은 기업간거래(B2B)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수 100만명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 결과 트래픽을 대량으로 유발해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CDN은 고용량 데이터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세계에 분산된 임시 서버를 통해 사용자와 가까운 지점에서 콘텐츠를 전송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ISP에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해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 장애로 국내 서비스가 마비되는데 정작 법적으로는 조치 요구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원인에는 손을 못대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국내 통신사가 떠안는 비정상 구조”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CDN·클라우드에 대한 안정성 의무를 제도화해야 인터넷 전체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이용자수 100만명 요건을 제외하고 트래픽 점유율 기준만 적용할 경우, B2B 사업자지만 국내 트래픽을 대량 유발하는 해외 CDN·클라우드도 자동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여된다.
트래픽 기준 중심으로 대형 CDN을 안정성 관리 체계에 편입할 경우 국내 인터넷 서비스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클라우드·CDN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내 ISP가 장애의 책임자 역할만 계속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단독]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한시 허용 "문제없다" 판결](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761-74892-sampleM.jpg)




![HBM 공급 확대하는 삼성전자, 특허괴물이 또 뒷다리 잡았다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ISARB3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