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결국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1년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대 증원을 기다렸던 환자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은 여전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 부족은 더욱 심하다. 의료소멸이 지역소멸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실제 지난해 개원을 앞둔 단양군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을 4억2000만원까지 제시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사례는 지방 의료소멸 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과 의사들의 지역 유입, 지역 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결국 반쪽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사이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지방의료 공백은 더 커졌다.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고, 전공의까지 떠난 지역·필수 의료가 가야할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면 해답은 간단하다. 바로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한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다.
결국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전공의가 빠지고, 새로 유입될 인력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전환'이야 말로 의료 정상화를 넘어 의료 고도화를 위한 해답이다.
헬스케어 시장에선 인공지능(AI) 접목이 본격화되며 다양한 의료AI 솔루션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심뇌혈관, 폐, 위·대장 등 다양한 의료영상정보를 분석해 질병 진단을 돕는 솔루션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영상 판독을 넘어 생성형AI를 접목해 판독문 초안 작성과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법까지 제시하는 의료기기도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 디지털전환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부족한 의료인력 충원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에 AI 솔루션을 도입해 환자의 빠른 진단을 돕고, 위급시 거점병원으로 전원하는 '커넥티브 헬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내 보건소부터 1~3차 의료기관 데이터 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커뮤니티 헬스'까지 진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엔 IT를 활용한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 정책은 찾을 수 없다. 의료AI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해소할 방안으로 떠오르지만 추진하긴 부담스럽다. 자칫 AI가 의사를 대체한다는 메시지를 줄 경우 의정갈등 골이 깊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역시 AI가 자신들을 대체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업무 효율을 높일 도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디지털전환까지 주저한다면 결국 환자들은 또 다시 의료공백 속에서 골든타임마저 위협받게 된다. 의사를 양성해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되 현재의 의료 소멸 상황을 지역의료, 필수의료 대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 디지털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동십자각] 과학 인재가 줄줄 새고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732A4_1.jpg)
![[청년발언대] 환자 중심 의료, 협업이 완성](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9572212219_3f0c0e.jpg)
![[청년발언대] 정신건강 위기 속 청년들…정부의 정책 변화로 치료의 기회 확대될까?](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9422737736_5990a9.jpg)
![“5분도 안 걸린다” 망막사진 한 장으로 ADHD 선별[헬시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W5DKOY_1.jpg)
![[Health&] MRI, 보는 장비서 치료 결정 지원까지…개인 맞춤형 의료시대 연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15cf6f9b-e1de-427d-ba74-35da78373b3f.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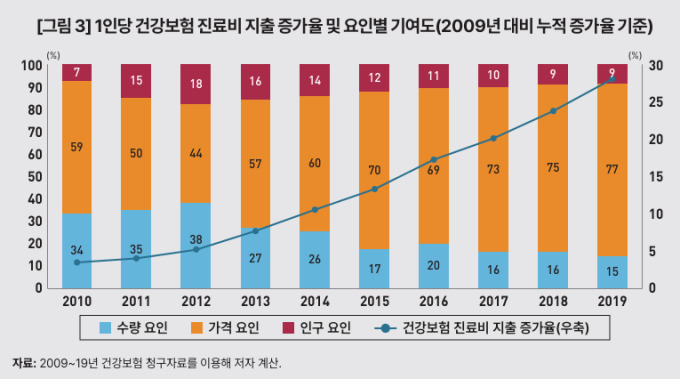
![[기고] 지속가능 경영 위한 산업용 AI](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5TTHL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