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는 늘 소용돌이치지만, 지금의 삶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국가의 명운이 달라질 만큼 시대가 격변할 때면 무인의 고민이 깊어진다. 이념이 바뀐 정부가 들어서면 20개의 별이 떨어지고 20명 정도의 사회지도급 인사가 자살하거나 의문사를 겪고 100명 정도가 형무소를 가는 데 형기의 합계는 200년 정도가 된다. 이런 격동의 세월에 누구인들 마음이 편할까만 국민은 장군들의 판단과 처신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군인은 드물게 제복 공무원이어서 남달리 계급장이 선명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에 관한 자부심이 강렬하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도 없는 문민우위의 원칙 아래 군인들이 응분의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오랜 지인인 황인수(黃仁秀) 장군(전 육사 교장)이 평소에 “나의 제복에는 선혈이 낭자하다우”라던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지금 그 무인들이 흔들리고 있다.
12·3 계엄사태로 온나라가 어수선
연일 추락하는 군 장성들의 위상
내 기억 속의 장군의 모습은 없어
등돌림을 초래한 주군의 책임도 커

맑은 날에 벼락이 치듯, 뜬금없는 계엄선포에 온 나라가 어수선한데 추락하는 군부의 모습을 보노라니 걱정이 앞선다. 이미 별 20개가 형사피의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낙성(落星)도 안타깝지만 그들의 사라지는 모습이 더 안쓰럽다. 어떻게 딴 별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그 황당한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묻지도 않는 군사기밀까지 손짓발짓 해가면서 술술 자백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내가 신병교육대에서 바라보던 저 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입대하고 보니 부사단장이 대학원 동기생이었다. 그는 공부가 늦고 나는 입대가 늦어 그런 만남이 이뤄졌다. 그러나 나는 언감생심 그를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제대했다. 그를 찾아갔더라면 길 위의 자갈이 건빵으로 착시를 일으킬 정도로 배고프고 천식 환자에게는 죽을 것만 같은 영하의 팬티 구보를 좀 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부사단장의 배경이 내무반장의 그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를 찾아가는 것을 단념했다.
나의 기억 속에 장군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들은 늠름했고, 조국의 간성이 될 것 같았다. 나는 1992년 2월에 학회원들과 함께 백령도 최전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북한 땅이 지호지간(指呼之間)이었다. 나는 참호에 서서, 지금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해병여단장에게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가 골란고원이 되겠군요” 했더니 그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그래서 이곳에 배속된 뒤 저의 무덤 자리로 땅 여섯 평을 마련해 두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남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은 모두 그러려니 알고 고맙게 생각했다.
그런데 내 기억 속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괴롭다. 장군은 장군처럼 사라져야지, 필부처럼 사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죽음이 두렵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와 나를 믿고 묵묵히 일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내가 먼저 살길을 찾아 도망칠 수는 없다. 그러려면 사관학교를 가지 말고 대우 좋은 대기업을 찾아 일찌거니 마음을 결정했어야 한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절에 초(楚)나라에 장왕(莊王)이라는 군주가 살았다. 그는 어느 날 전쟁에 이기고 전사들을 위로하고자 밤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잔치의 흥이 높아질 무렵에 갑자기 큰바람이 불어 방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술도 거나하게 취하고 마침 불도 꺼진 참이라 초대된 손님 중에 장웅(蔣雄)이란 장수는 어둠 속에서 한 궁녀를 희롱했다. 화가 치민 그 궁녀는 그 무뢰한을 잡으려고 그의 투구에 달린 금술(纓·영)을 떼어 왕에게 바치고 이 금술의 주인이 감히 전하의 궁녀를 희롱했으니 엄히 치죄해 달라고 고해 바쳤다.
여염집의 아녀자를 희롱한 것도 아니고 왕의 궁녀를 희롱했으니 절대 군주 치하에서 그 장수가 저지른 죄는 엄청난 것이었고 또 왕의 입장에서도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금술을 받아 든 장왕은 역시 제왕다운 금도(襟度)를 잃지 않았다. 왕은 시종들에게 불을 켜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초대된 장수들은 모두 투구에 달린 금술을 떼어 왕에게 바치도록 했다. 영문을 모르는 장수들은 왕명대로 금술을 떼어 왕에게 바쳤고 불이 켜진 후에는 모든 장수들의 금술이 없어졌기 때문에 궁녀를 희롱한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 장왕이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 사지에 빠졌을 때 왕과 옷을 바꿔 입고 죽음으로써 그를 구출해 준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지난날 궁녀를 희롱했던 장웅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난날 왕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이 고사를 가리켜 수술을 잘랐다 하여 ‘절영의 잔치(絶纓之宴, 『說苑』)’라 한다.
베풀지 않는 주군에게 충성하던 전근대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등돌림을 초래한 주군에게도 책임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그래서 지금도 눈 더미와 언 바다에 뛰어들어 특수훈련을 받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주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며 당부하건대, 조국의 운명이 그대들의 어깨 위에 걸려 있다.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칠숙과 석품의 난 - “여왕은 싫어요”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역사①]](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772825_1462820_m_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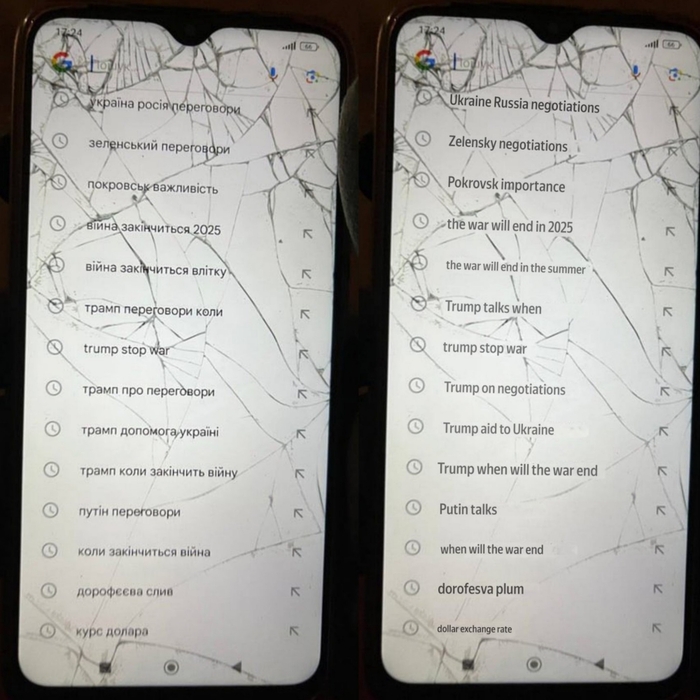
![전쟁기념관, 58년 전 ‘짜빈동 전투’를 소환하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5111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