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省)에 ‘짜빈동’이란 마을이 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 2월 북베트남(월맹) 군대와 한국 해병대 간에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남베트남(월남)이 패망하고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한 뒤 1년이 지난 1976년 5월 과거 짜빈동 전투에 참전했던 어느 장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피 흘려 싸운 보람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글 속에서 격전을 치르던 일이 어제 일인 듯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며 “망국(亡國) 월남을 생각하면 우리는 월남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장병·국민 모두가 다시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번 천 번 옳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짜빈동 전투는 얼마나 치열했던가. 당시 현장을 지킨 조선일보 종군기자는 훗날 기사에서 “사투(死鬪) 4시간은 피의 기록이었다”며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전장 영웅들의 무운을 빈다”고 밝혔다. 직접 총을 들고 싸우지도 않은 기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실제 전투는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당시 월맹군은 거의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우리 해병대를 공격했다. 이에 맞선 국군은 300명도 채 안 되는 장병들이 목숨 걸고 싸운 끝에 적을 격퇴했다. 기록에 의하면 월맹군은 240명 이상이 비참하게 죽은 반면 국군 전사자는 10여명에 그쳤다. 기사는 “(국군) 용사들이 밟고 달린 적 시체만도 부지기수”였다고 전하니 그야말로 박수를 보낼 일 아닌가.
짜빈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은 청룡부대(당시 해병대 제2여단)였다. 적군이 패주한 뒤 “참으로 훌륭히 싸웠다”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여단장을 향해 중대장은 “부하들이 전사해 칭찬을 받을 면목이 없다”며 흐느꼈다. 당시 장렬하게 산화한 병사들 가운데 이학현(1945∼1967) 상병이 있었다. 그는 적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상태에서도 후임병들에게 ‘지금 네가 지키는 전선이 곧 너의 무덤’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항전을 독려했다. 백병전이 벌어지자 적과의 몸싸움 도중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는 길을 택했다. 적군 병사 5명이 함께 폭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뒤 병장으로의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 수훈이 추서된 고인은 지금도 청룡부대의 ‘군신’(軍神)으로 통한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지난 14일 오후 기념관에서 이학현 병장을 기리기 위한 호국인물 현양 행사를 개최했다. 정종범 해병대 소장은 “이학현 병장과 같이 과거의 영웅을 발굴하는 것은 현 세대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현 해병대원들이 이 병장의 희생과 헌신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학현 병장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던져 상사와 동료 그리고 부하 등 전우들의 목숨을 구한 이 병장의 살신성인 정신은 우리 군의 귀감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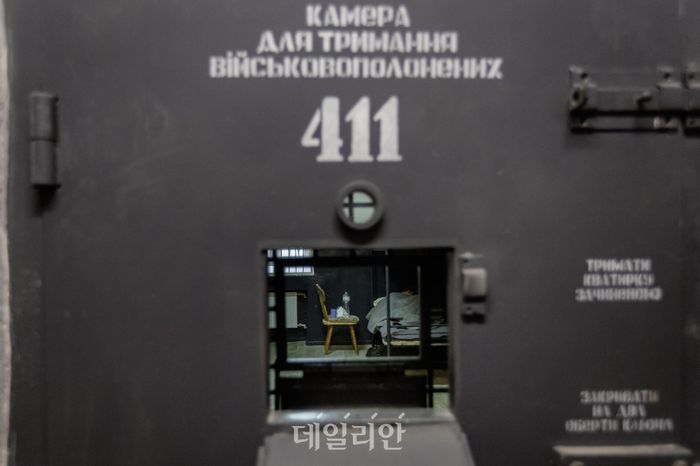
![샌드허스트 경연대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513945.jpg)
![日 총리, 종전 80주년 담화 내놓을까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2025022051196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