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드리운 그늘이 깊다. 스테이블코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받는 순간, 어느 누구의 감시나 방해도 받지 않고 전세계 어디든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어떻게 피해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까. 장외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P2P)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이같은 장외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 정지와 채권소멸절차 제도를 두고 있다.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금융기관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상대계좌와 해당 금액을 다시 빼는 데 이용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가 된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 2개월이 지나면 계좌에 묶인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된다. 돈에 대한 계좌주의 권리는 소멸한다.
계좌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코인을 판매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받았다. 받은 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계좌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부여된 이의제기권을 활용하면 된다. 이 경우 입금된 돈은 정당한 거래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피해금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 정지를 풀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금융기관은 이의제기만으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는다. 대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라고 한다. 피해자와 소송 중이라는 증빙을 내면, 피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풀어 주겠다고 한다. 결국 지급정지로 묶여 있는 피해금을 두고 계좌주와 피해자 간의 소송만이 남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시대에는 이러한 소송이 폭증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당사자끼리 소송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이 이의제기를 원칙적으로 판단해 결론 짓는 게 무용한 소송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피해자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소송을 당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는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사람과 돈과 시간을 더 들여야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금융기관이 독점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운영해 이익을 누리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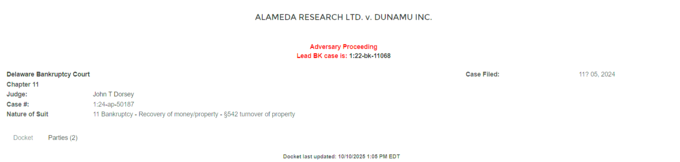
![[기고]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이행여부와 투자경험 및 이해능력](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7354857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