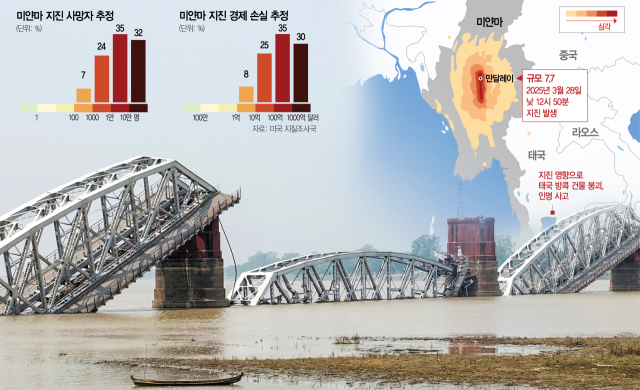대부분의 전쟁은 인접한 세력 사이에서 벌어진다. 몽골의 유럽 원정,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 침탈, 9·11 테러 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처럼 대륙을 넘나들며 싸우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사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쟁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사실 싸워야 할 정도의 미운 감정도 접촉이나 교류가 있어야 생긴다. 다시 말해 친할 수도, 반대로 갈등을 벌일 가능성도 가장 많은 상대가 바로 이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서 오랜 세월 동안 주변국과 꾸준히 교류를 해왔음에도 침탈도 많이 받았기에 항상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이웃을 대할 수밖에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강제징용 소송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과 이로 인한 한·일 분쟁에서 보듯이 충돌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다. 지미 카터 정부 당시의 한·미 관계에서 보듯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항상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제 주권의 상징인 통화까지 단일화하고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교류하는 유럽연합(EU)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러운 반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브렉시트(BREXIT)처럼 내부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어도 EU의 주축이자 합동군까지 운용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공고한 동맹 관계는 과연 이들이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수차례 전쟁을 벌인 원수지간이었었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만들 정도다.

사실 ‘국제 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처럼 EU 회원국들의 관계가 원래부터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인류사에 기록된 최대의 참화가 툭하면 유럽에서 일어났고, 지난 세기에만도 수천만 명의 생명이 전쟁의 폭풍에 휘말려 죽어갔다. 특히 대립의 중핵이었던 강대국들은 유럽 본토에서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국주의 충돌도 마다치 않았다.
이처럼 유럽사를 관조하면 새로운 전쟁의 파괴와 희생 정도는 운동 경기 기록을 경신하는 것처럼 항상 이전 전쟁을 능가해 왔다. 그러한 충돌의 정점이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유럽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초유의 대가를 치렀고, 오랫동안 변방으로 여기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이끄는 엄청난 변화를 지켜만 봐야만 했다. 결국, 그런 참화를 겪고 난 뒤에야 협력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지름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시 말해 현재 EU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사이가 너무 나빴던 결과의 산물이다. EU 체제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부터 따진다면, 오늘날의 평화는 불과 70년이 갓 넘었을 뿐이다. 사실 이 정도의 시간은 30년 평화가 없다는 유럽의 역사를 상기하면 일반 시민 간의 적대적 감정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 그런데도 오늘날 단일 국가처럼 지내는 것은 그만큼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컸다는 의미다.
EU와 더불어 지구상에서 이웃과 가장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이라면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라고 할 수 있다. 1812년 미·영 전쟁 당시에 서로 상대의 수도를 점령한 적도 있었지만, 꾸준히 좋은 관계를 이어 왔고, 20세기 들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에서는 같은 편으로 함께 싸우면서 공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충돌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서류상이라도 계획은 마련해 두고 있었다.

2005년 12월 30일, 여러 매체에서 1930년대 미국과 캐나다 모두 침공 계획을 세웠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미국의 계획은 양국 간에 전쟁, 혹은 이에 준하는 분쟁이 발발할 경우 상정해 작성됐는데, 캐나다의 전쟁 수행 능력을 초전에 격멸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때 핵심은 미·영 전쟁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영 연방의 맹주인 영국으로부터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캐나다군을 분쇄하는 것이었다.
캐나다 또한 동 시기에 미국과 분쟁이 발발하면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선제 침공을 포함한 모든 군사 행동을 구체적으로 입안해 놓고 있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내부적으로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양국 모두 이렇듯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놨던 것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과 평화와 달리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도 나름대로 대립하던 부분이 있었는지 모른다.

다만 부대를 동원한 훈련조차 실시되지 않았던, 말 그대로 만에 하나를 대비한 서류상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1930년대는 전체주의 세력의 득세로 새로운 전쟁 위기가 높아지던 시기였지만, 양국은 국방 전략상 상대를 주적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2005년 이런 보도가 나왔을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은 물론 이를 접한 제3국인도 흥미로운 가십 거리 정도로 여겼다. 당연히 커다란 반응도 없었다.
그런데 그토록 공고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악화했다. 공개 석상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처음 칭했을 때만 해도 친한 사이 짓궂은 농담 정도로 생각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보복 관세 부과를 넘어 정상 간 욕설이 오가고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격화된 양국의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혹시 예상 밖 상황에 당황한 양국의 국방 담당자들이 서고에서 1930년대 작계를 꺼내서 살펴보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고 90여 년 전 작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으나 적어도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두 달 전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양국의 대립을 보면 위험 또한 역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만큼 평화는 이루기 어려운 것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