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령자 계속고용 기업 인식 설문조사
기업 60% 이상 “정년 연장보단 재고용 선호”
재고용 시 업무성과로 선별, 임금 삭감 주장도
“고령자 활용엔 인사·임금제도 개편 선행돼야”
이재명 정부가 법정정년의 단계적 연장(60→65세) 추진을 공식화하자 경영계에선 “일률적·강제적 방식은 기업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조기퇴직 확산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령자 고용방식을 선호하고, 업무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을 평가해 재고용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현재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61.0%가 ‘재고용’이라고 응답했다. 정년연장(32.7%)의 두 배 수준이다.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등 기업 규모별로 살펴봐도 재고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60%를 넘어섰다.
실제 현장에선 재고용 형태의 고령자 계속고용이 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 중인 기업의 80.9%가 재고용 방식을 택했다고 답했다. 재고용 계약 기간은 1년(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았다.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조사에선 고령자 재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퇴직 전보다 임금을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해서다.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50.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90% 수준이 16.4%, 50∼60% 수준은 13.1%였다. 경총은 “고령 인력의 지속가능한 계속고용을 위해선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수적 요소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고용되는 고령자를 기업이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도 84.9%로,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15.1%)는 응답과 큰 차이를 보였다. 회사가 고령자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평가해 선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49.3%, 결격사유 해당 여부로 적격자를 가려야 한다는 응답은 35.6%에 달했다.
기업들이 고령인력 활용을 주저하는 요인으론 임금 연공성으로 인한 고령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와 한번 채용하면 내보내기 어려운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자리했다. 기업들에게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묻자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 이하 복수응답),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서다.

경총은 기업 일선에서 고령인력 활용이 활성화하려면 인사·임금제도부터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에도 기업 과반(61.4%)이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았고, 고령자 임금 연공성 완화 조치의 일환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금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10여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와 동시에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같은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의 일본처럼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재고용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최소한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이 지난해 12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는 만큼 소득공백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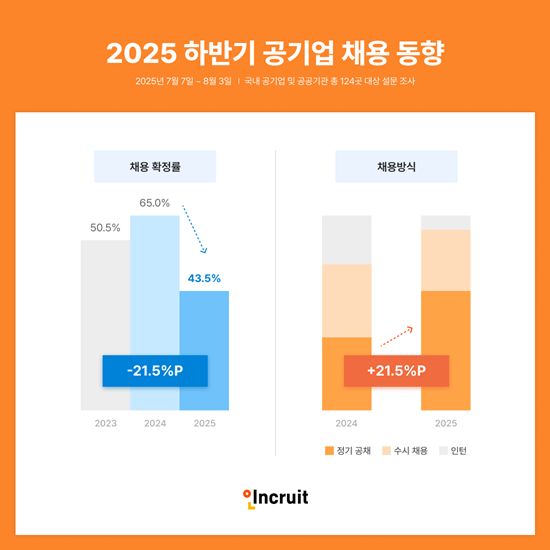

![퇴직연금 가입 안해도 불이익 없어, ‘더 강력한’ 의무화 추진을…李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된 만큼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하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30/2GWTSMGQRY_5.jpg)



![[비즈 칼럼] 하루 24시간, 일상을 되돌아보는 ‘통계의 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65e921ff-2340-468d-acf2-925a3b0fa454.jpg)
![[헬로BOT] ‘기술·미각 융합’ 에니아이, 조리 로봇 혁명으로 '맛의 균일화' 시대 연다](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835/art_17565310619116_fd72a8.jpg?iqs=0.2278802088459213)
![노란봉투법·주4.5일제…'최저임금 1700원' AI·로봇 직원 시대 빨라진다[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30/2GWTSYK0BX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