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금융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 출발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혁신'이다. 과거에도 결제혁신은 많았지만, 모두 은행시스템에서였다. 하지만, 이번엔 판이 다르다. 은행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블록체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혁신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미국이다.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합법인 'GENIUS Act'를 발효시켜, 발행자 인가, 준비금 구성, 공시 등 모든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사각지대로부터 합법적 금융 수단으로 편입했단 얘기다. 이어 유럽연합도 MiCA 규제를 통해 유로화 결제 토큰의 기준을 마련했고, 일본·싱가포르·홍콩도 관련 법을 발표했다.
그럼 이런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기존 규제 틀의 강화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탄생을 뜻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가격이나 시장 안정뿐 아니라, '누가 발행·유통하고, 무엇으로 담보하며, 어떤 새로운 규제 틀로 관리하느냐'하는 종합적 금융생태계 구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화폐와 경쟁하는 사적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일종의 '공공적 화폐'로 제도화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선 Circle, Stripe, PayPal과 같은 민간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민간이 은행과 유사한 공공적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금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선 결제 구조의 대전환이다. 지금까지 금융결제는 은행-카드사-결제망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였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하나로 끝나는 단층 구조다. 서로 다른 국가와 통화를 연결하여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은행 개입 없이 정산된다. 따라서 송금 수수료는 사실상 사라지고, 거래 시간은 초 단위로 단축된다. 이미 Circle은 독자 블록체인 'Arc'을 통해 USDC란 스테이블코인을 네트워크 수수료로 사용하는 구조를 갖췄고, Stripe는 암호자산 전문업체인 파라다임과 'Tempo'라는 결제 블록체인을 개발 중이다. 시장에선 결제 인프라의 주도권이 금융기관에서 기술(Tech)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둘째, 금융자산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상품 거래가 하나둘씩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채, 주식, 머니마켓펀드 등 기존의 금융자산이 토큰화(Real World Asset Tokenization)되고, 결제 수단으론 스테이블코인이 쓰이고 있다. 블록체인상의 안정적 결제 수단이 확립됐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모든 상품을 블록체인 환경에서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뜻이다. 점차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사용자들은 블록체인 환경이란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결제하고 투자하게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셋째, 인공지능(AI) 융합에 따른 '결제혁신의 업그레이드'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구글은 AI가 직접 송금·결제할 수 있는 오픈 프로토콜을 공개했고, Stripe는 OpenAI와 협력해서 에이전트 결제(Agent Payment) 실험을 시작했는데, 그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쓰이게 될 거라고 한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코딩, 즉 프로그램이 가능해서 AI 거래에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에 가장 적합한 화폐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023년 1,230억 달러에서 2025년 2,970억 달러로 단기간에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암호자산시장의 확장이 아니라, 결제 시장의 구조 개편이다.
아무튼 스테이블코인 혁명의 본질은 결제혁신을 가능케 하는 '배후의 블록체인'이다. 마치 은행의 전산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듯, 블록체인도 금융의 새로운 인프라 기술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머지않아 앱 하나로 송금·결제·투자하는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신속한 법·제도화를 위한 민관정(民官政)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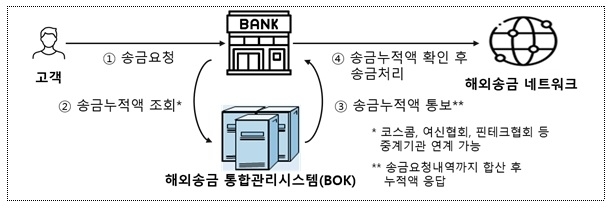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69〉 [AC협회장 주간록79] 액셀러레이터 목적 투자 5년 조정, 4~5년차 스타트업 살리는 해법](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29/news-p.v1.20250929.70cbf12d79cb4f32b1e80ac3acd3d7a5_P3.jpg)



!["믿을건 실물자산" 연기금·공제회, 조직 신설하고 확대 개편…대체투자 힘준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LVJWNW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