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투자나 대출 심사·실행에 활용하는 표준산업분류에 AI 등 신산업 기업을 구분할 기준이 없는 게 대표적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 은행들은 AI를 비롯한 신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정책 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신성장 산업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담보인정비율, 시설자금 한도, 금리 인하 등에서 혜택을 준다.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의 ‘신성장·일자리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정책에 맞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신한은행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에 금리 우대 등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현장에선 어떤 기업이 신성장 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정책 대출과 달리 표준산업분류코드만으론 업종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사할 때 외부 기관의 기술신용평가(TCB)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은행 등이 직접 기업에 실사를 나가 주요 매출 항목 등을 살피기도 한다. 한 시중은행 기업영업 담당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AI 등 신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며 “다른 여신을 취급할 때처럼 산업분류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차 개정된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총 21개 대분류로 구성된다. 이중 AI 산업은 정보통신(IT)업에 해당해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우편 및 통신업 등과 같이 묶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세계적인 산업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제산업분류코드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개정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개발·신설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장·융복합 산업을 위한 별도 산업분류코드를 신설·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통계청은 ‘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계법에 따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표준분류 항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한 것이다. 현재 특수분류코드는 22개로, 블록체인기술산업(올해 신설), 로봇산업(2019년), 지식재산서비스산업(2014년), 에너지 산업(2018년) 등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타당성 및 분류 특성 등을 검토한 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설·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관련 부처가 산업 특수분류 신설·개정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피지컬 AI 선도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AI·반도체·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기업 등에 투자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하던 자기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정책에 발맞춰 AI·첨단 모빌리티·바이오 업종을 독립된 대분류로 분리하면 투자나 고용, 매출 구조들을 계량화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핵심 산업군이라는 인식을 줘 투자 유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우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특정 경우에만 되고 나머지는 제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기준 신설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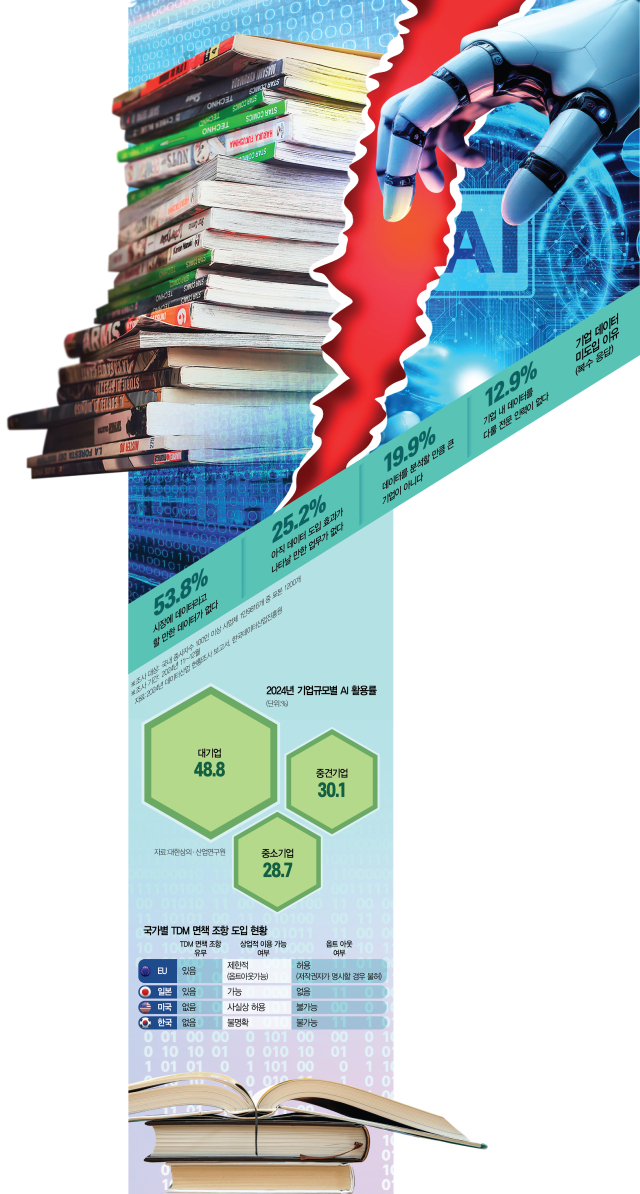



!["커지는 노란봉투법 후폭풍" 시중銀, 콜센터 해외이전 '고민'…"산재 처리기간 2027년까지 228→120일로 줄인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ZFX2U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