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월드가 올해 상반기 패션 부문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핵심 성장축인 패션 부문 매출이 뉴발란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굳어지며 향후 본사의 한국 지사 설립 계획과 맞물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원가 상승과 판매관리비 증가도 수익성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랜드월드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74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560억원으로 8.9% 늘었지만 개선 폭은 제한적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패션 부문이었다. 상반기 패션 매출은 1조734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1.2%를 차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268억원으로 전년 동기(1284억원)보다 소폭 감소하며 수익성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비 상승과 환율 부담으로 매출원가율이 높아졌고 인건비와 물류비 등 고정비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아우르는 판촉비 역시 확대되면서 판관비 비중이 증가해 '규모의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이랜드 패션 부문의 매출은 사실상 뉴발란스가 견인하고 있다. 뉴발란스는 국내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핵심 브랜드로 자리잡았지만 지나친 의존도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랜드는 2008년부터 뉴발란스 국내 독점 유통권을 보유해왔으며 올해 2월 이를 2030년까지 연장했지만 뉴발란스 본사가 2027년 한국 지사 설립을 예고하면서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뉴발란스가 지사를 설립해 직접 유통에 나설 경우, 이랜드 패션 사업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복 브랜드 로엠과 캐주얼 브랜드 후아유의 부진도 리스크 요인이다. 로엠은 과거 '살안타 블라우스' 등 히트 상품으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브랜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후아유는 연 매출 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전체 패션 매출 내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두 브랜드 모두 안정적인 소비층 확보에 실패하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랜드 패션 포트폴리오는 뉴발란스와 SPA 브랜드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경쟁사들은 프리미엄·럭셔리 라인 강화로 고부가가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대 중이다. 한섬은 '더캐시미어', '시스템' 등의 고급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LF와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해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고가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속도 역시 더딘 편이다. 이랜드월드는 자사몰 확대 및 외부 플랫폼 입점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유통업계 전반이 온라인 중심 전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랜드의 느린 전환 속도는 중장기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는 뉴발란스 라이선스 연장과 SPA 브랜드 성장 등으로 단기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도 ▲뉴발란스 지사 설립 ▲여성복 경쟁력 약화 ▲디지털 전환 지연 등을 중장기 리스크로 꼽고 있다. 브랜드 다각화와 체질 개선 없이는 외형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스파오, 미쏘 등 주력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별 성장 전략을 정교하게 추진해 패션 부문의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확대, 브랜드별 D2C 공식몰 강화,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사로부터 온라인 사업을 이관받아 차세대 플랫폼을 출범시키는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 거점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패션 No.1 달성을 목표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 글로벌 빅테크 협력 확대·실적 성장세…목표주가 12.5% 상향”[줍줍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Z3RUBH_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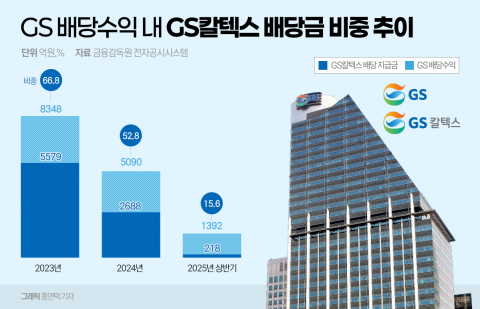



![오라클 AI 폭발에 창업자 '세계 최고 부자' 등극… 지수는 혼조 마감 [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ZNTZAG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