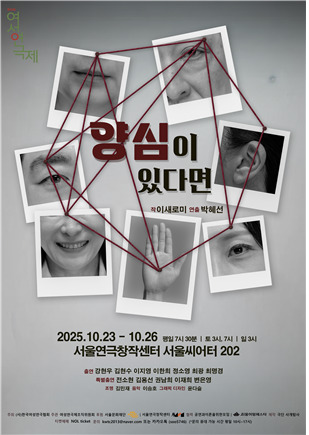흰 상여. 꽃도 꼭두 장식도 없는 쓸쓸한 상여를 붙든 채 흰 상복을 입은 아내는 서럽다. 상여 뒤 두 노인의 표정은 무심한 듯 익숙한 듯 슬픈 듯도 하다. 아무리 외딴곳이라 해도 1990년대 초에 이런 장례식 풍경은 흔치 않다. 그들의 신산한 삶이 그러했듯이.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로 평생 소록도에 갇혀 살다 생을 마친 남편을 위해 아내는 꼬깃꼬깃 모은 돈을 털었다. 사람이 살면서 결혼할 때와 이승을 떠날 때 두 번 꽃가마를 타는데, 처음은 못 탔으니 마지막에라도 태워주고 싶은 바람으로. 병원에서 준비한 운구 차량도 마다한 채 마련한 상여는 남편의 저승길을 배웅할 가장 화려한 가마. 어쩌면 꽃가마는 엄두도 내지 못한 신부 때의 자신을 위한 위로였을지도 모른다.
섬의 윤곽이 어린 사슴을 닮은 섬, 소록도. 1910년대부터 70년 가까이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와 강제 수용이 이뤄진 슬픔의 장소. 성남훈이 이 섬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는 이제 막 파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혈기왕성한 사진가였다. 직전 해에 파리에서 사진학교를 졸업한 터였다. 이 작업 후 그는 사진에이전시 라포에 합류했다. 당시 유럽의 막강한 사진가들이 거쳐 간 라포는 1933년 설립된 거의 최초의 사진가 집단이다. 라포의 성남훈 영입은 소록도와 그가 대학 시절 찍은 집시 작업을 통해 독특한 감수성을 인정받은 덕분이었다. 특히 요세프 쿠델카 같은 거장들이 이미 작업한 바 있는 집시는 자칫하면 젊은 사진가의 소재주의적 선택에 그치기 십상이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가 파리의 젊은 이방인으로서 유랑의 삶을 사는 집시들과 어울림으로써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동화된 장면들을 포착해냈다.
집시와 소록도는 전혀 다른 장소를 배경으로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부유하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이라는 점에서 성남훈의 연작처럼 보이기도 한다. 유럽의 집시는 정박하고 싶었으나 돌아갈 곳이 없었고, 한센인들은 떠나고 싶었으나 정박을 강요받았을 뿐이다.
송수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안성덕 시인의 '풍경'] 뒤](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7/.cache/512/20251017580069.jpg)

![고향이 일본에 넘어갔다…부모가 권한 충격 영화 '팔백장사' [왕겅우 회고록 (11)]](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