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김대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천주교가 모진 박해를 받던 시기, 목숨을 걸고 청나라로 건너가 끝내 신부가 되는 꿈을 이뤘으나 너무 일찍 순교하여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인물이다.
이 책,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은 이런 그의 생애를 간결하지만 친절하게 일러주는 책이다. 어린이책이지만 김대건이라는 한 신부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하다.

김대건 신부는 1821년 충청도 솔뫼에서 태어나 어릴 때 첩첩산중으로 이사했다. 마을 이름이 ‘골짜기에 있는 뱀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의 골배마실이었다. 골배마실에 사는 사람들은 땅이 척박한 가운데 농사도 잘 안되어 늘 가난했지만, 천주교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신부님이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에서 모방 신부가 마을에 오자 온 마을은 잔칫집 분위기로 바뀌었다. 김대건도 이때 세례를 받고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을 가졌다.
모방 신부를 따르는 이들은 늘어갔지만, 조선말을 잘 모르는 신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교우들은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는 조선인 신부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며 조선인 신부가 마을에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답답하기는 모방 신부도 마찬가지여서, 조선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신부로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김대건의 가족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천주교를 믿었고, 증조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독실한 집안이었다. 모방 신부는 유난히 신앙이 깊었던 김대건을 눈여겨보았다.
(p.14)
그러던 어느 날 모방 신부님이 대건이와 부모님을 불렀어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되어 천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신부님의 말에 대건이와 부모님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족 중에 신부가 나온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목숨이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대건이의 부모님은 대건이마저 잃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대건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들 조선인 신부를 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꼭 신부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천주님이 저를 지켜 주실 테니 걱정마세요.”
모방 신부와 한성으로 간 김대건은 최양업 토마스와 최방제 프란치스코를 만났다. 모방 신부가 신부로 양성하기 위해 발탁한 아이들이었다. 셋은 신학과 중국어, 라틴어, 프랑스를 익히며 치열한 배움의 세월을 보냈다.
모방 신부는 천주교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자, 세 아이의 안위를 염려해 마카오로 보냈다. 조선 국경에서 마카오까지는 오천 킬로미터가 넘었다. 눈보라가 치는 벌판을 걷고 또 걸은 끝에 7달 만에 마카오에 도착했다.
그들은 아시아에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 프랑스 신부들이 세운 파리 외방 전교회의 조선 신학교로 갔다. 그렇게 세 사람은 조선인 최초의 신학생이 되었고, 밤낮없이 신학 공부, 언어 공부, 새로운 문물 공부를 해나갔다. 그 가운데 몸이 약했던 최방제는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김대건이 한성을 떠난 지 어언 6년이 지났고, 그 사이 20대 청년이 되었다. 그 무렵 프랑스 군함 한 척이 마카오에 정박했다. 군함의 함장이었던 세실은 김대건이 공부하는 신학교로 찾아와 조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며, 프랑스 말을 할 수 있는 조선인 신학생이 있다고 해서 함께 가려고 왔다고 했다.
김대건은 꿈꾸던 조국에 돌아가 포교를 할 꿈에 부풀었다. 함선에 탄 그는 조선에 가기 전 함대가 난징에 들러 난징조약을 맺을 때 통역을 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뜻밖에 세실 함장이 조선으로 가지 않고 마닐라로 가겠다고 하자 결국 함선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걸어서라도 조선으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여의찮아 청나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2년여 뒤, 김대건은 오랜 시간 함께 공부했던 최양업과 함께 신부 아래 직위인 부제가 되었고, 다시 한번 조선으로 향했다. 한성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몇 번의 고비 끝에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0년 만에 한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김대건은 그 뒤 새로 조선 교구를 이끌게 된 페레올 주교가 조선에 무사히 들어오기 위해 상하이로 향했다. 그해 여름, 상하이의 김가항 성당에서 김대건의 사제 서품식이 열렸다. 교우들과 신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페레올 주교가 물었다.
(p.44)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되어 주님의 사람들을 쉬지 않고 돌보겠느냐?”
김대건의 머릿속에 조선을 떠나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떠올랐어요. 김대건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예, 천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김대건은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페레올 주교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 김대건을 축복했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성당 안을 환하게 밝혔어요. 그 순간 김대건은 알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천주님 제가 상처받은 조선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산골 소년 김대건 안드레아는 조선인 최초의 신부가 되었어요.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는 ‘라파엘호’를 타고 조선으로 향했다. 라파엘호는 난파 위기를 여러 번 겪고 제주까지 갔다가 몇 달 만에 가까스로 한성에 도착했다. 천주교 박해로 신부들을 모두 잃고 슬퍼하던 교우들은 조선인 신부가 왔다는 소식에 감격했다.
김대건 신부는 모방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던 은이 마을로 가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다. 지난 세월동안 어머니를 보살피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지만, 어머니는 신부가 된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김대건은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이끌었다. 조선인 신부를 맞이한 교우들은 ‘우리말로 듣는 천주님 말씀’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점차 늘어나는 교우를 다 돌볼 수 없었던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은 청나라에서 더 신부를 모셔오기로 했다.
그러나 심해지는 감시 속에서 일이 그만 잘못되어 김대건 신부는 체포되고 말았다. 관리들은 모진 고문을 하며 교우들의 이름을 말하게 했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김대건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산 관리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며 회유했지만, ‘천주님은 임금보다 높이 계시는 분’이라며 흔들리지 않았다.
그 무렵, 세실 함장이 이끄는 프랑스 군함이 조선 바다에 나타나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신부 세 명을 처형한 것에 항의하는 편지를 전달하고 가버렸다. 그 바람에 김대건 신부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말았다. 천주교는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고, 결국 조선 조정은 김대건을 처형하기로 했다.
(p.58)
김대건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강에 있는 모래사장인 새남터로 끌려 나왔어요.
‘이제 천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김대건 신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1846년 9월 16일, 조선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은 스물여섯 살의 나이로 천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렇게 김대건 신부는 순교하고 말았다. 한편, 김대건과 함께 사제 교육을 받았던 최양업은 김대건이 순교한 지 3년 뒤인 1849년 두 번째 조선인 신부가 되었다. 그해 13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와 김대건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교우들을 돌보며 10여 년 동안 포교에 전념한 그는 너무 많은 일을 떠안은 탓인지 1861년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김대건의 삶은 이렇듯 역경으로 가득했고, ‘최초의 조선인 신부’라는 빛나는 이름을 얻기까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조선의 수많은 교우에게 희망이 되었지만 동시에 너무 이른 나이에 처형되어 꿈을 다 펼치지 못한,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다.
이 책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잘 몰랐을, 김대건이라는 신부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동시에 김대건과 함께 사제 교육을 받았던 최양업과 최방제, 한국 초기 천주교 포교에 귀한 역할을 한 페레올 주교와 모방 신부 등도 접할 수 있어 뜻깊다. 한국 천주교의 초기 역사가 궁금했던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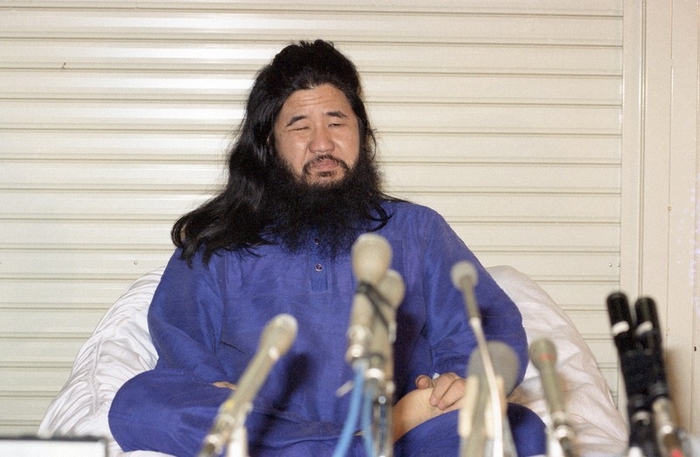

![[기억과 기록] 강릉 여행에서 만난 시인, 허난설헌](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220/p1065623449721757_622_thum.jpg)

![[더버터] 현지화·전문화·운동화…글로벌 NGO의 세 가지 지향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97452aee-b514-4d78-b041-9a86022c28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