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은 중국 고대의 시가 총집인 『시경』의 첫 부분 편명(篇名)이다. 시를 교육의 주요 교재로 삼았던 공자는 이 부분을 특별히 중시했다. 어느 날, 공자는 아들 백어에게 “사람이면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담장을 정면으로 맞바라보며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주남과 소남을 읽지 않으면 그만큼 시야가 좁고 막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참 적실한 비유이다.

중국 청나라 때의 학자 원매(袁枚)는 “시시심성(詩是心聲)” 즉 “시는 마음의 소리”라고 했다. 시는 많이 배운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못 배운 촌부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를 쓰면 그게 바로 시라는 것이다. 마음의 소리인 시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인정이 넘친다.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정비된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보다 훨씬 낫다. 그게 바로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다. 시심을 잃어버린 채, ‘법대로 하자’며 삿대질을 해대면 서로가 서로에게 담장이다. 지하철 안전문에 쓰인 시 한 수에도 담장을 허무는 힘이 담겨 있을 것이다. 시를 읽어야 한다! 마주 보는 서로가 서로에게 담장이 되지 않도록.
김병기 서예가·전북대 명예교수
![[전문가 칼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099031849_c68029.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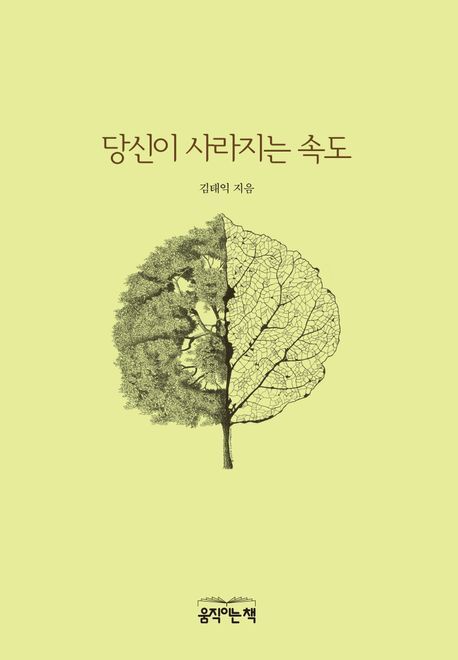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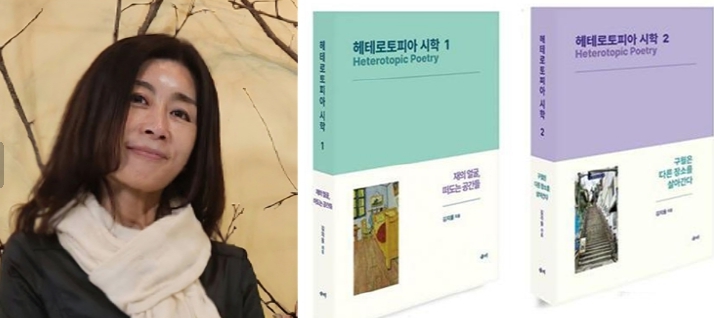
![[신간] 찰나의 기억, 냄새 등 5권](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0/1532869_730057_42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