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콩(대두)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두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두부의 80%가량이 수입 콩을 원료로 쓰는데, 재고가 적은 영세업체들은 생산을 줄이면서 버텼는데도 다음달 초엔 소진될 것이라며 아우성이다. 수입관리 품목인 콩은 정부에서 공급을 통제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급률(2027년 43.5%)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저율할당관세(TRQ) 기본 물량 25만t 외 더는 들여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업계 반발에 밀려 2만7000t을 추가했다. 그래도 작년보다 5.6% 적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수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적시에 공급될지 업계는 노심초사다.
국산 콩은 남아돌아 걱정이다. 2021년 11만1000t에서 지난해 15만5000t으로 3년 만에 40% 가까이 생산량이 늘었다. 올해는 20만t이 예상된다. 국민 1인당 콩 소비량이 2010년 8.3㎏에서 2022년 7.3㎏으로 급격히 줄었는데도 생산량은 껑충 뛰다 보니 정부 비축량만 늘리고 있다.
논에 벼 대신 심는 논콩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폭증했다. 정부는 잉여 쌀을 막으려고 2023년부터 논콩을 전략작물로 지정해 쌀 대신 심으면 1㏊당 2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해왔다. 농가에서 원하면 전량 수매해줘 가격까지 떠받쳐줬으니 과잉 생산을 자초한 셈이다. 국산 콩 재배 면적이 2021년 5만4000㏊에서 작년 7만4000㏊로 넓어졌는데 논콩은 같은 기간 1만1000㏊에서 2만2000㏊로 두 배 수준이 됐다. 쌀 과잉 생산을 피하려다 풍선효과로 잉여 콩 문제까지 떠안은 정부로선 국산콩 소비를 늘리려면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두부업계 원성이 이처럼 크니 진퇴양난이다.
국산 콩 가격은 수입산의 3배 이상이라 두부 원료 전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정부가 국산 콩 원료 전환을 통한 고급 두부를 유도하기 위해 비축 콩을 수매가 대비 33% 할인해 공급하고 있으나 언감생심이다. 생산 라인을 바꿔 다시 당국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포장재도 산지에 맞게 바꿔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다. 아무쪼록 공장 셧다운으로 두부값이 다락같이 올라 식탁에 올리기 겁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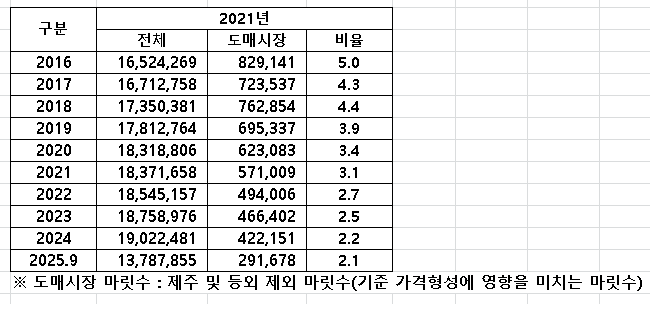

![[단독] 2030년 새차 절반 전기·수소차로… "中에 안방 내줄 수도"](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0PSL1T_1.jpg)

![[ET시론]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국민의 식탁을 더 든든히](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4cfaf3b7e3b3414f89536eb314c5e631_P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