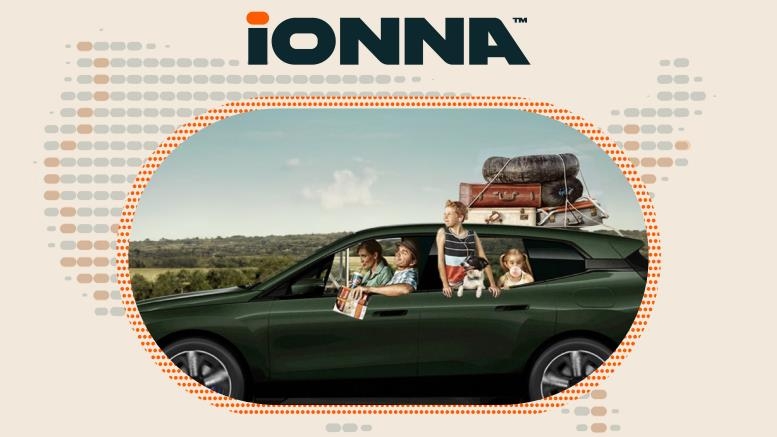#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 매장. 준중형 전기차 ‘아토3’가 3대 전시돼 있었다. 기자가 머무른 10분 동안 젊은 부부 4쌍과 50대 남성 등 10명이 매장에 들어와 차를 천천히 살펴봤다. 노원구에서 왔다는 김창현(34) 씨는 “실제로 보니 차가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출·퇴근용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서부권에 있는 한 BYD 매장에서 만난 박모(58)씨는 “중국산이어서 아직 모르겠다. 과연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의구심을 가진 얼굴을 한 채 매장을 곧 떠났다. 실제로 호기심에 매장 안으로 들어온 뒤 5분 만에 나가는 방문객이 대부분이었다. 딜러는 “말없이 차만 보고 가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메기’가 될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까. 한국 시장 진출의 첫발을 뗀 BYD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출시된 BYD의 아토3는 일주일 만에 사전계약 1000건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실제 판매로 이어질 확률을 50% 정도로 본다. 2월까지 500대 전후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 차종인 기아의 준중형 전기차 EV3의 지난 1월 판매량이 429대인 점을 감안하면 초기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①EV3보다 1000만원 싸게…‘초반 저가 러시’
업계에서는 아토3의 가격 경쟁력에 주목한다. 아토3의 국내 판매가는 기본모델 3150만원, 플러스모델 3330만원으로 경쟁차종인 EV3(기본형 3995만원), 현대 코나 일렉트릭(4142만원)에 비해 800만~100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됐다. 정부·지자체 보조금(200만원 전망)을 받으면 아토3의 실구매가는 2900만원대로 떨어진다. 국산 전기차의 경우 각종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달리, 아토3는 플러스모델에 모든 옵션이 장착돼 추가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

BYD는 한국 시장을 위한 겨냥한 공격적인 가격정책을 폈다. 아토3의 유럽 판매가는 4000만~5000만원, 일본에서는 450만엔(4200만원)에 판매된다. 한국 시장에서 마진을 최소화 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내세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초기에는 이익이 적더라도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라며 “하반기 한국에 진출할 다른 중국 전기차 브랜드도 비슷한 가격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②택시·렌터카·공유차를 한국시장 진출 ‘첨병’으로
BYD가 택시·렌터카· 공유차 업계에 B2B(기업간거래)를 통해 차량을 대량 공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BYD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은 있지만, 판매까지 이어지기엔 ‘중국산’에 대한 신뢰와 선호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베이징자동차, 2019년 둥펑자동차 등 중국차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했다가 안전성·상품성 문제로 외면을 받은 전례도 있다. 익명을 원한 차량공유업체 관계자는 “BYD가 몇달 간 소매 현황을 분석한 뒤 판매량이 적다고 판단하면, 저가 B2B 계약을 맺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BYD는 해외 진출 시 택시·렌터카·공유차 업계와 장기계약을 맺는 전략을 택해왔다. 2022년 독일 렌터카 업체 SIXT와 2028년까지 6년간 아토3 등 전기차 10만대 공급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에는 모빌리티기업 우버에 전기차 10만대를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맺었고, 지난달에는 동남아 택시업체 그랩(Grap)과 전기차 5만대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③안전성 내세우고 프로모션도 늘리는 현대차·기아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BYD뿐 아니라 하반기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ER)나 샤오펑·샤오미 등이 한국 시장에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차가 국산 전기차 시장을 일부 잠식할 우려가 있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무상점검 기간 확대 ▶전기차 일부 차종 계약금 지원 등 프로모션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원가절감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재화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도 나온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국산 브랜드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 인하와 서비스 향상, 안전성 향상 등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는다면 중국 전기차는 돌풍이 아닌 미풍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