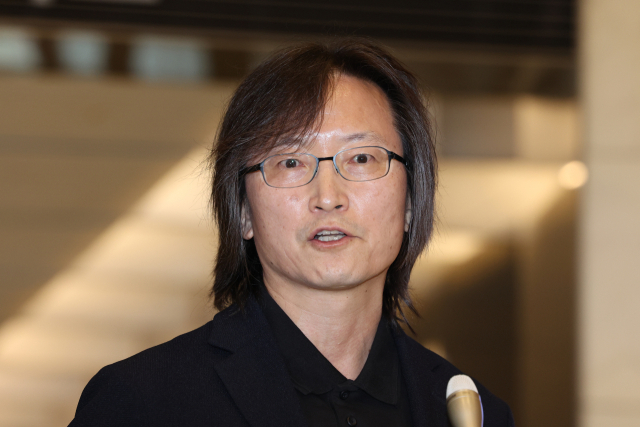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까지로 확장한 새 상법이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규정이 공포 즉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회사의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고(제1항),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제2항).
이번 개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서 이사는 오직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할 뿐 주주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헐값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벌였던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 같은 주주 농단 행위는 이사가 ‘독한 마음’을 먹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워졌다. 잘된 일이다.
개정 상법, 이사 의무에 대한 ‘반쪽짜리 해답’
그런데도 개정 상법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이번 개혁이 대법원의 ‘판례 변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입법적 해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 이사의 충실의무의 본질을 아직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면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서 충실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대리인’이다. 따라서 충실의무는 대리인으로서 응당 부담해야 할 의무라는 뜻이다. 이사의 의무는 상법이 입법적으로 그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또는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그 존재론적 속성 때문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를 대리인으로 거느리는 ‘주인’은 누구일까? 기본적으로는 ‘주주’지만 정확하게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보는 법리의 가장 밑바닥에는 주식회사를 영미식의 신탁으로 보는 견해가 자리하고 있다. 주주는 신탁에 돈을 제공한 위탁자이자 신탁 운용의 과실을 누리는 수익자이고, 이사는 이 신탁을 잘 관리할 책임을 지는 수탁자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의무는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해 부담하는 수탁자 의무와 본질에서 같다. 바로 여기서 현대적인 이사의 충실의무가 발원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이사의 충실의무는 훨씬 더 복잡하다. 그 경계선을 설정하는 임무는 법원에 맡겨졌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사가 사실상 누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고 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사안에서 이사가 대리인의 임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이사의 의무의 대상은 때로는 단순하게 ‘회사’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차이를 보일 때에는 ‘총주주’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제3의 이해관계자가 충실의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도산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사는 무담보 채권자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도산 상태에서는 무담보 채권자가 ‘주주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산이 임박하게 되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장차 주주와 같은 속성을 지니게 될) 무담보 채권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산이 임박한 무담보 채권자는 왜 주주와 유사한 속성을 보유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도산 상태에서 회사가 잘되고 못되는지에 따라 그 재무적 이익이 가장 밀접하게 변동하는 주체가 무담보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도산 상태의 무담보 채권자는 마치 정상 상태에서의 회사 주주와 유사한 재무적 특성을 보유하게 된다. 도산 절차가 무담보 채권자를 마치 주주처럼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사가 도산이 임박해서 무담보 채권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도 물론 이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왜 이번 개정 상법이 이사의 의무에 대한 ‘반쪽짜리 해답’에 불과한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개정 상법은 이사 의무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을 생략한 채 그 의무 범위에 ‘주주’를 외삽적으로 끼워 넣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번 개정 이전에는 이사는 주주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한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나 주주 외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개정 상법은 일부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면죄부와 사각지대도 만들어낸 것이다.
최우선 해소해야 할 사각지대는 노동자 권익
상황이 이처럼 초라해진 이면에는 물론 우리나라 법원의 편협한 판결 성향도 큰 역할을 했다. 법원은 법조문의 문언적 의미에만 집착했을 뿐, 이사의 의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응당 보여주었어야 할 ‘판결의 현실 적합성’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법원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미 입법적 해결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이상, 그에 따른 사각지대의 해결도 일단 입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사각지대는 어디일까? 도산이 임박해서 ‘회사와 운명공동체’가 되는 대표적인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무담보 채권자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회사의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때 되면 따박따박 월급을 타가는 존재가 아니다. 노동자는 회사가 도산에 이를 경우 임금 삭감이나 반납 등으로 회사의 경영 개선에 힘을 보탠다. 회사가 회생하면 그 보상을 받고,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도 실직한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의 주주’적 속성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는 (최소한 도산이 임박한 시점부터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 상법은 이런 사정을 통째로 외면하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법원은 이사가 도산 상태하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해했다고 하더라도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은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노동자가 직접 이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라면 노동자가 추천한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다. 노동자 추천 방식이 눈에 걸린다면 우리사주 조합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우리사주라는 주주’의 추천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율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그 어려운 첫발을 뗀 만큼 다음 걸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 제도가 회사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을 때까지.
<전성인(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비즈 칼럼] 인천공항면세점과 솔로몬의 지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eda6f2a4-6a42-41ce-bf6c-742dcb503e00.jpg)

![‘200만원→3300만원’ 대부업체 15배 추심에…법원 판결은? [별별화제]](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50426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