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잉 진료가 보험사를 멍들게 하는 것을 넘어 의료계 질서까지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1분기 기준 126.1%에 달해 지난해 1분기의 119.4%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 1분기 기준 156.3%로 가장 심각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때문이다. 과잉진료 의심 사례가 빈번한 도수치료와 값비싼 주사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금 14조 813억 원 중 비급여 보험금이 8조 126억 원이었고 급여 항목은 6조 687억 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다보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안 받아도 될 치료를 받게 되고 병·의원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값비싼 치료를 권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며 “심지어 아이들 키를 크게 하는 도수치료 광고까지 은밀히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손보험이 의료계의 질서까지 흔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아과·산부인과 등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는 필수 진료과는 전문의들이 점점 부족해졌고,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안과 등 비급여 치료가 많은 분야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증가시키면서 의사들도 비급여가 있는 분야로 몰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손 보험료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 등 정부 차원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건보 보장 강화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으면서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유효성이 낮은 비급여 진료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 치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치료라도 비용이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고 환자는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실손보험만 믿고 가격에 대한 정보없이 치료를 받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이같은 비급여 관리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 규제를 받아들일 지 의문인 사오항이다. 서울 사립대 한 교수는 “의료계가 불같이 반대할 것이 뻔한데다 의료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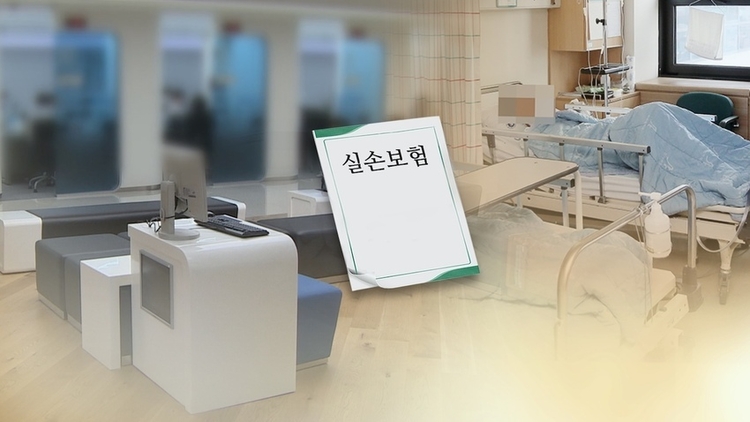


![[비즈 칼럼]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식약처의 수사권한 확대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31/586889b0-6151-42c6-a25b-d32aeb682b50.jpg)


![[단독]연금 보험료 안 올리려면 연 7.74%가 마지노선[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0/29/2DFRAWRQ4I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