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5명 중 1명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상사로 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288명(28.8%)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성별과 연령별 교차 분석 결과 남녀 모두 30대에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30대 남성의 16.9%, 30대 여성의 24.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직위별로는 대리급이 21.1%로 가장 많았고, 사원급(17.6%), 과장·차장급(17.4%), 부장급 이상(9.7%)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상사(임원 제외)’가 54.5%로 절반을 넘었으며 동료가 38.2%로 뒤를 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복수 응답으로 집계한 결과, 폭언(150명), 따돌림·험담(130명), 부당한 강요(91명), 차별(76명)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들은 ‘동료와의 상담’(131명·45.5%)을 가장 흔한 대처 방법으로 꼽았지만, ‘무대응’(90명·31.3%) 비율도 상당했다.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사건이 알려져 불이익이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괴롭힘을 겪고 결국 회사를 떠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중 17.0%는 사직을 선택해 문제 해결 대신 퇴사를 택했다.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업무상 적정 범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제도 인지도 역시 낮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지방노동관서 신고 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 등 정부 지원책 모두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회사 내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 걱정 없이 노동위원회 등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해야 한다”며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마약퇴치운동본부 신규직원 30% 1년 못 버텨…인력 체계 '비상'](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4405650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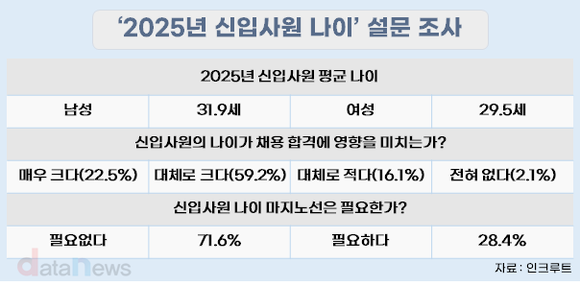
![[단독]윤석열 정부 의료대란으로 장기기증도 ‘붕괴’···가족 동의율 20%대로 추락](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7/news-p.v1.20251017.fd76367f9af546ed858228c25f6fe5dd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