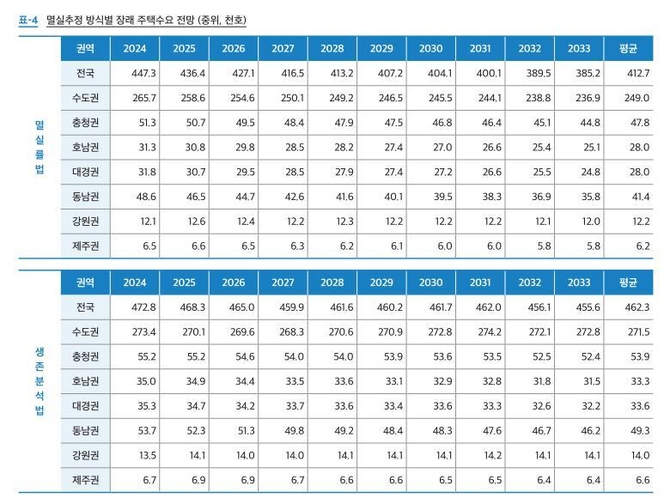예전에 자주 다녔던 산길을 이제는 다닐 수 없다. 길은 이미 사라졌다. 콘크리트 바닥이 간신히 잡목의 침범을 막아주고 있지만 나뭇가지와 넝쿨이 길을 막아서고 있다. 회색 콘크리트 저지선만이 이곳이 인간의 영역이라고 외치는 듯하다.
농촌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해 소농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흔들리지 않는 당위였다. 인구 대부분이 농민이던 시절, 자급자족 농업이 경제의 근간이던 시절에 형성된 가치관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농민은 4%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관점의 자급자족농은 이름만 남았다.
농가의 절반이 4958㎡(1500평) 미만의 농지를 가진 영세 소농이다. 청년 소농은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이 30%에 불과하다. 대농의 농업소득 비율이 50%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다. 영세 소농은 농업 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농산물 값이 오르거나, 농경지를 넓히거나, 또는 농가 수가 줄면 평균 농가소득은 올라간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쌀값은 지난 30년간 40% 상승에 그쳤고, 이마저도 정부가 매년 수조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결과다. 농지 확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남은 것은 농가 수 감소뿐이다.
누구도 농가 수를 줄이자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신 농업직불금 확대라는 대안을 택했다. 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소농의 진입 장벽이 없는 상황에서 소농 지원은 소농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았다. 지난해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1500평 미만 농가는 2만가구가 증가한 반면 다른 규모의 농가는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1000여가구가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인구와 농지가 두세배 더 크지만 농업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두세배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성과는 초라하다. 농업 기반은 서서히 무너지고, 고령화는 가속화하면서 후계 농업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농업시장이 축소되면서 종자·농기계 기업들마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농 지원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소농을 늘리는 정책까지 지지하기는 어렵다. 농업 생산비를 올리고, 기후 스마트농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고,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농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예산 부족을 지적하지만 현재의 농업 예산규모조차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 예산이 최고점 대비 40%나 감소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라는 산림녹화 시대의 구호는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 공생관계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이 낭만적 구호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자연은 더이상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이상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상업농 체제로 전환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우리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자급자족농의 틀에 갇혀 있다. 소농을 늘리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찾는 것과 같다. 감상적 접근만으로는 농업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농업구조 개혁을 고민할 때다.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백상논단] 성장 동력의 핵심은 인재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XURA54_1.jpg)
![[맛있는 이야기] 토종 배추의 맛이 그립다면…시즌 한정 ‘봄동’ 맛보세요](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2/11/.cache/512/2025021150004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