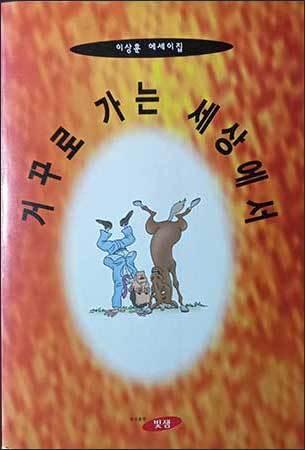이난향의 ‘명월관’
이난향의 ‘명월관’ 디지털 에디션

‘남기고 싶은 이야기-명월관’의 디지털 에디션을 연재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손꼽혔던 이난향(1901~79)이 1970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21일까지 중앙일보에 남긴 글입니다. 기생이 직접 남긴 기생의 역사이자 저잣거리의 풍속사, 독립투사부터 친일파까지 명월관을 드나들던 유력 인사들이 뒤얽힌 구한말 격동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러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더욱 풍부한 스토리로 다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명월관에 드나드는 단골손님들의 연령층이 차차 젊어지기 시작했다. 친일 재상이나 풍전등화 같은 나라 형편에 술집을 찾던 고관들의 발길은 어느덧 뜸해지고, 망국대부의 자손들이 제2의 손님으로 등장했다.
기생은 옛 기생 그대로 있었으나 손님은 엊그제까지 드나들던 대감들의 후손들이라, 이들을 맞는 기생들의 흉중에도 오가는 감회가 새롭고 새삼 세월이 변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는 듯싶었다.
망국대부의 자손들이 새파랗게 젊은 나이로 어떻게 되어 기방과 요릿집을 먼저 찾게 되었는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짐작되는 일일 것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제도는 선조가 높은 벼슬을 하면 자손들은 글공부나 열심히 하여 어려서 등과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벼슬길에 나서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었고, 이것은 또한 양반들이 갖는 일종의 출셋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반만년을 외적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왔던 우리나라가 경술국치(1910년)로 일본에 송두리째 빼앗겼으니, 온 겨레가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고관들은 관직이 없어졌고, 그 후손들에게는 벼슬에 오를 길이 막혔다. 글공부해도 소용없게 된 세태였다 할까. 눈먼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없어지자 제일 먼저 망국의 슬픔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은 바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위정자들의 자제였음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망국대부의 자손들은 홧김에 술집을 드나들게 되었다.
![[신간] 삼일천하 김옥균 소설, '김옥균, 조선의 심장을 쏘다'](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13411869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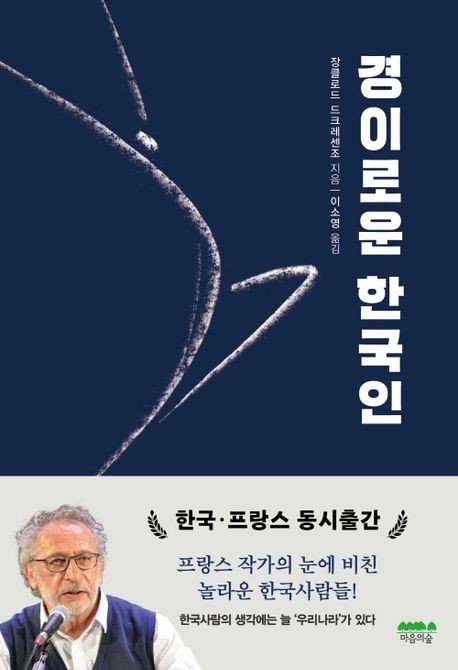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불러주는 말과 받아쓰는 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3080454081_ddde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