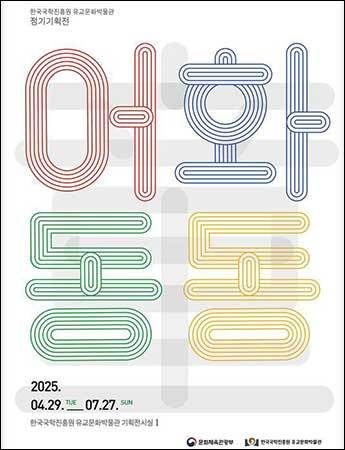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의료윤리 관련해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작업하신 게 있나요? 어떤 글이나 자료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익명>
지난 4월 치협 100주년 행사에서 필수 보수교육 의료윤리 강의를 마치고 한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본 칼럼을 살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한편으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윤리와 관련한 별도의 검토 또는 접근이 가능한지, 또는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나누어 말씀드린 내용이라 정리를 해드릴 필요도 있어 보였고요.
먼저, “치과의료윤리”라는 분야가 아직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의료윤리(medical ethics)와 생명윤리(bioethics)의 전통이 먼저 있습니다. 전자는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 “의사의 품위”를 설파하던 분야이며 후자는 19세기 생명과학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철학적으로 검토해 나갔습니다.
이들 논의를 포괄한 것이 1970년대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이며,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저를 “의료윤리학자”라고 칭할 때, 엄밀히는 생명의료윤리학 전공자로서 저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기에서 다시 1980년대 임상윤리(clinical ethics)와 간호윤리(nursing ethics), 2000년대에는 공중보건윤리(public health ethics)가 출현합니다. 당연히 있어 온 분야고 엄청 오래되었을 것 같은 분야들이지만 모두 새로 생긴 논의들입니다. 이들 각각은 별도의 분석 방법론(임상윤리) 또는 다른 원칙 체계(간호윤리, 공중보건윤리)를 가지고 있어 논의 전개 및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붙여 치과윤리(dental ethics)도 몇몇 학자나 집단(대표적으로 American College of Dentists)에 의해 검토된 바 있으나, 사실 학문 분야가 되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생명의료윤리를 치과 사례에 적용한 결과만 다루었어요. 다시 말하면, 치의학에서만 나타나거나 치의학에서 별도로 부각되는 원칙이나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굳이 의학과 치의학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과의사라면, 저에게 질문 주셨던 선생님처럼 치과의사의 고유한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물론, 학문적으로 치의학이 의학과 다른 전통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부생리학이고, 같은 병리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같은 관점에서 신체, 건강, 질병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치과는 다른 인력 구조, 제도,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질병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도 의학의 다른 분과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전에 치과는 심미와 기능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며, 이것이 내·외과와 치과를 구별하는 지점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칼럼에서 드린 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치과의료윤리라는 분야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문(의학과 구별되는 치의학)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기보다, 실천(의료와 구분되는 치과의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 목표는 치과의료 또는 치과 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치과의료에선 의료에서 부각되지 않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사안들이 중요한 윤리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나 원칙을 “치과의료윤리학”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 칼럼이나 강연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1인1개소법 이슈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인1개소법 자체는 치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의료기관의 경영 형태에 대한 규제로써, 꼭 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아래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 적절성, 최소성 등의 요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적 관점에선 꼭 그렇게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치과 단체들, 그리고 치협이 중심이 되어 1인1개소법 사수를 주장했을까요. 좁게 보면, 치과 중복 개설과 지점의 중앙 통제가 당장 치과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 넓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인1개소”라는 사안이 치과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에 치과계의 여러 구성원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최종 결과물은 헌재의 합헌 판결이었으되 그 과정에 있어 입법부터 캠페인까지 여러 노력이 같이 병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인1개소는 의료와 다른 치과의료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슈였다는 거지요. 물론, 가깝게 생각하면 1인1개소 자체가 치과의 특성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적으로 치과는 개원의의 개별 진료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니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치과에선 경영 형태 또는 방식에 대한 검토 또는 제한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1개소법 자체가 특정 경영 방식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치과의사가 전문화되어 간 과정은 문제가 되는 경영 또는 운영 방식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방식들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피에르 포샤르가 『치과의사』를 저술했던 이유나 미국치과의사협회가 설립되어 가던 시점의 상황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직되었던 이유도 모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아직 치과의료윤리는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몇 마디로 정리해서 이런 논의라고 보여드리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인1개소법에 대한 논의처럼 치과에서 부각되는 사안이나 논점이 분명히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검토나 접근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점을 설명해 드리고 제안하기 위해 더 매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진료하시거나 치과의사로 생활하시면서 가지셨던 윤리와 관련한 질문을 기다립니다.
dentalethicist@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1세대 교사 인플루언서’ 김차명 “교직 인기 시들해도… 제자들 성장 보며 보람 느껴” [차 한잔 나누며]](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5181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