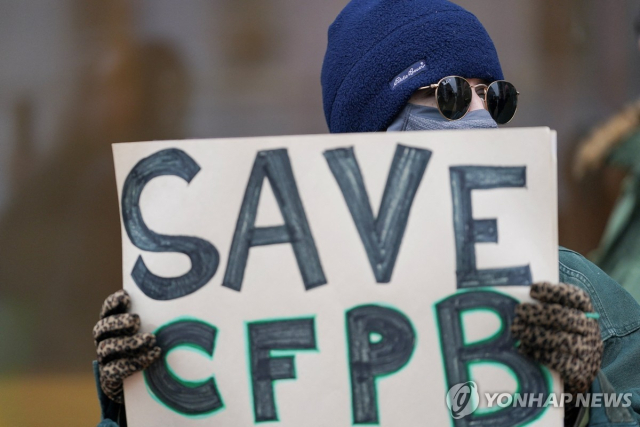하위법령 정비단 14명 중 산업계는 단 한명.
AI 기본법인데 AI 모델·서비스 관련 인사는 전혀 없어
투명성·안전성 확보 비현실적 사항될까 우려
업계 “대상 사업자 의견 청취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참여 위원 14명 중 산업계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법안을 보완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 목소리가 배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고영향 AI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했다.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 위원 3명, 학계 3명, 법조계 5명, 산업계 및 산업계 추천 3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산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명이다. 산업계 추천 인사도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에 불과하다. AI 모델·서비스를 운영하는 통신사나 인터넷 기업 등을 직접 대표하는 위원은 없다. 학계 인사 3명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명과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1명으로, AI 관련 학계 비중도 매우 낮다. 정부나 기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법 관련 인사들로만 채워진 셈이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이 때문에 법안의 부족한 점을 하위 법령에서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AI 기본법의 시행령에 대한 조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모르다보니 업계가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AI 기본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제32조(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 제33조(고영향 AI 확인), 제40조(사실조사) 등이 꼽힌다.
대표적으로 제33조에 적시된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으로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고영향 AI 범위를 얼마나 정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것에 민감하다.
제32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으로 누적 연산량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를 적용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누적 연산량의 기준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해외 사업자는 물론 국내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국내 사업자만 깐깐하게 규제받는 역차별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해외 사업자만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내 사업자도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누적된 학습량이 많다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31조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외 민원접수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의 사실조사를 허용한 제40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회의에 이어 이달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목소리가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비단은 법조인 중심으로 5대 로펌이 다 들어가 있지만 기업은 없다”면서 “로펌을 활용해 시행령을 빠르게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T톡]디지털 정보격차 입법 '러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8/news-p.v1.20241128.3cc7586285c249ca878b953ad66346e2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