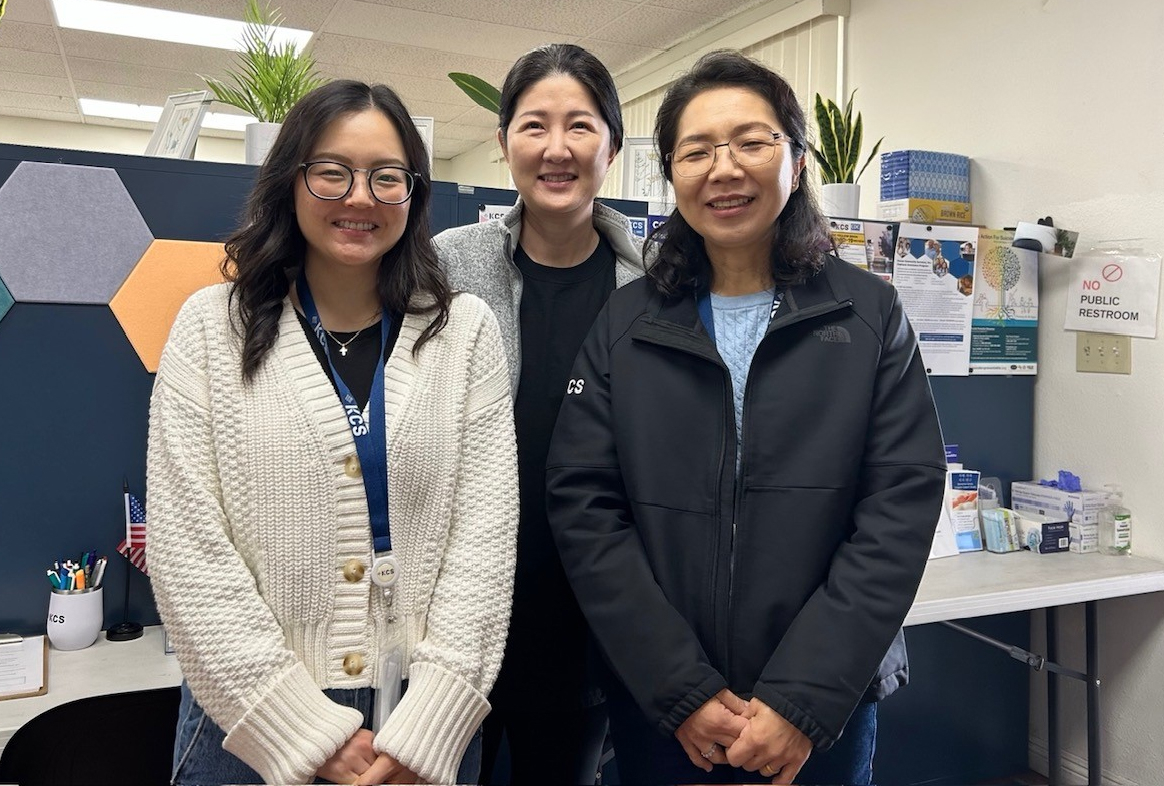우리나라의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약관을 통해서 계정 양도나 계정의 사용허락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의 경우도 예외 없이 온라인 계정의 양도나 계정의 사용허락을 금지하고 있고, 카카오, 여타의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도 하나 같이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나오는 다수의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서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계정에 접근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납세의무자의 사용허락을 얻어 조세 사이트에 대신 방문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고, 인공지능(AI)의 이용 활성에 따라서 계정의 사용허락 및 계정의 사용허락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는 당연한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견상 보면, 온라인 사업자의 약관과 허락을 받아서 타인의 계정에 접근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허락을 받아서 타인의 계정에 접근하면 약관 위반 행위이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법원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았다.
일단 접근권한과 사용권의 용어부터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접근권한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접근권한은 개인정보나 시스템, 파일, 폴더 등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해 왔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등).
그런데 대법원은 접근권한과 별개로 사용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 계정주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권을 취득하면 '접근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619 판결에 의하면, 계정을 정당하게 양수하면 양수인은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사용권을 취득한 것일 뿐 계정상의 정보마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서 대법원은 계정의 사용허락이나 양도를 통한 사용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면,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하지만, 반면 일정한 경우 계정주의 양도나 사용허락이 있으면 제3자는 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접근권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온라인 서비스 약관들은 계정의 양도나 사용허락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
접근권한과 사용권의 관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하지만, 이용자가 그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생성하거나 보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그 계정과 정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계정과 정보에 대한 사용권은 민사적인 권리로서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과 달리 봐야 하고, 이용자는 계정과 정보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B가 A의 계정주인양 행동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될 것인바, 여기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즉 제3자가 계정주를 오인할 염려가 없는 한, 계정의 사용허락이나 양도는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온라인의 많은 약관들이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AI 시대에 맞도록 약관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