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화장품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다. 2024년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달러를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같은 해 국내 생산액 역시 17조원을 넘어서며, K뷰티는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국가 자산이 됐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국내 책임판매업체 수는 2만7932개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해 신규 등록업체가 5169개였던 반면 폐업한 업체는 6292개에 달했다. 수천개 기업이 매년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화장품 산업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특유의 화장품 생산 인프라와 디지털 마케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OEM, ODM시스템을 통해 빠른 제품 출시가 가능하고 틱톡이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럴 확산과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당 수의 브랜드들은 소비자 로열티나 브랜드 신뢰 자산을 쌓지 못한 채 쓸쓸히 시장에서 사라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 뷰티 산업은 이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새로운 표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K뷰티는 여전히 가성비와 단기 트렌드 중심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주요 시장에서 클린뷰티(clean beauty)나 워터리스(waterless)와 같은 지속가능 영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 섹터에서 K뷰티의 점유율은 미미하다. 단기적인 히트 상품은 만들어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K뷰티가 지속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글로벌 규제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다. 화장품은 심미적 차별화가 중요한 업종으로 포장재 비중이 높고, 포장재의 60% 이상이 플라스틱이다. 이 중 80% 이상이 재활용되지 않는다. 내용물 역시 합성 고분자 소재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규제의 타깃이 되기 쉬운 산업적 특성을 지닌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해외 주요국이 일제히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4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다. 그외 과대포장 금지, 리필 및 재사용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률 제시 등 패키징 전반에 대한 구체적 의무를 포함한다.
2024년 7월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2030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부여해 제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모든 물리적 제품이 적용 대상이니 화장품도 예외일 수 없다.
2024년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그린전환 소비자 권한 지침(ECGT)'은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했다. 과학적 입증이 없는 '친환경' '생분해성' '에코' 등의 표현은 금지되며, 실질적 감축 노력 없이 저렴한 탄소상쇄에만 의존하는 '탄소중립' 표현도 주의해야 한다. 이제 마케팅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지속가능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EU를 중심으로 북미 등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규제는 관세에 이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규제 강화는 성분 안전성 분야에서도 뚜렷하다.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는 제품 출시 전에 원료와 완제품의 독성, 사용 적합성, 환경 영향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지를 사전에 입증하는 제도다.
EU는 이미 2009년 '화장품 규정(EC No․1223/2009)'을 통해 제품별 안전성평가와 PIF(Product Information File) 보관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2022년 '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를 시행해 제조사 등록,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안전성 자료 보관 등을 법제화했고,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PFAS 사용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도 2025년 5월부터 일반, 특수 화장품 모두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 글로벌 10대 화장품 수출국 중 7개국이 이미 안전성평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클린뷰티 시장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은 소비자의 구매 행태 변화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가격이나 기능뿐 아니라 환경, 윤리,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 화장품을 선택한다. 미국의 지속가능성 통계 플랫폼 '더 컨셔스 인사이더(The Conscious Insider)'에 따르면, 북미에서 판매되는 뷰티 제품의 약 33%가 이미 'Clean' 라벨을 달고 있다.
또 Z세대의 76%, 밀레니얼 세대의 71%가 클린뷰티 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소비자가 클린뷰티 브랜드 선택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천연 성분(40.2%), 환경 고려(17.6%), 재활용 포장(15.8%)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성분과 안전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 셈이다.
슬록이 국내 화장품 소비자 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화장품을 지속가능성이 검증된 환경친화적 화장품으로 교체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96%가 '교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 소비자 들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규제 강화와 함께 소비자 인식 변화는 클린뷰티 시장 성장을 이끄는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cleanbeauty' 해시태그는 785만건을 넘어섰다. 클린뷰티라는 방향성이 쉽게 꺽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는, 이것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 소비자 의식의 변화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이기 때문이다.
◇K클린뷰티의 과제와 클린뷰티 단체표준 제정
K뷰티가 직면한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는 표준 설립이다. 국내 기업들은 EWG, 비건, FSC 등 각자의 파편화된 지표에 의존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는 인식의 한계다. 다수의 브랜드가 클린뷰티를 CSR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할 뿐, 브랜드의 철학으로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뿌리깊다.
셋째는 검증 인프라 부족이다. 유럽, 북미에서는 Provenance, Novi Connect 등 제3자 검증 서비스가 클린뷰티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는 지원 부재다. 중소 브랜드는 PCR 소재, 리필 시스템, 안전성 검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실질적 전환에 제약이 크다. 예를 들어, PCR 소재는 일반 소재 대비 재료비가 평균 20%가량 비싸며, 사출성, 흑점 발생 등의 품질 관리 어려움으로 생산을 하는 제조사도 많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브랜드사의 자발적 전환만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연계된다면 실질적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2025년 9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에 의해 '클린화장품 단체표준'이 공식 제정됐다. 단체표준에 따르면 '유해우려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탄소저감형 용기를 적용한 화장품'을 클린화장품으로 정의하며, 내용물과 용기의 재질, 시험방법, 품질 성능, 검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이후 진행될 인증제의 기준이 되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세계 최초의 클린뷰티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 클린뷰티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다. 글로벌 통계 플랫폼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해 2021년 65억달러에서 2028년 153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클린뷰티와 밀접한 워터리스 화장품 시장 역시 연평균 약 7% 성장해 2032년에는 약 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뷰티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화려한 성과의 그림자를 넘어 안전, 지속가능성,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의 조건이며,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이다. 민첩성과 혁신 역량이 강점인 K뷰티가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면,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은 K뷰티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김기현 슬록 대표 drshd@sloc․kr
〈필자〉2022년 클린뷰티 전문기업 슬록(SLOC)을 창업해 지속가능한 K뷰티 전환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클린뷰티 단체표준 제정 기술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국내 최초로 화장품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개발해 클린뷰티 검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클린뷰티 비즈니스 플랫폼 'K서스테이너블'을 통해 약 7300명의 뷰티업계 종사자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중앙대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에이텍, 신현대한방연구소, 이온어스, 삼성영상사업단, 스타맥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m․net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전략 및 마케팅책임자로 근무했다. ISO ESG심사원이며, 저서로는 '광고를 알아야 크게 성공한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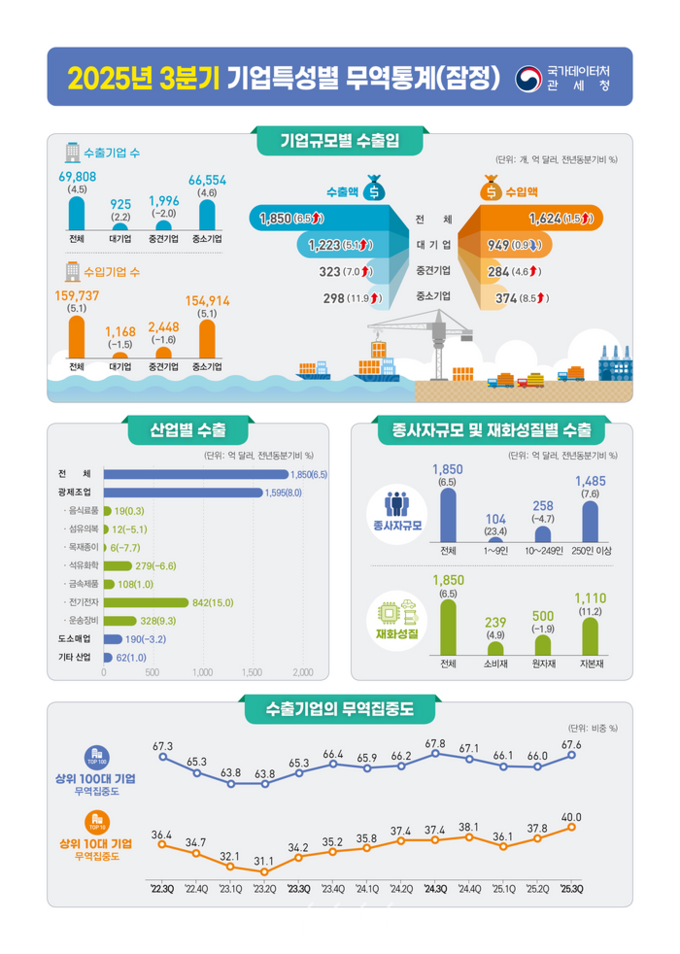
![[ET단상] 대한민국 혁신 벤처기업의 현실과 미래비전](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4/news-p.v1.20251014.0aaad6b4c50a48438f5879e07dd95fb3_P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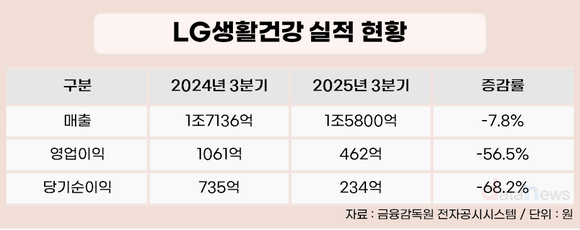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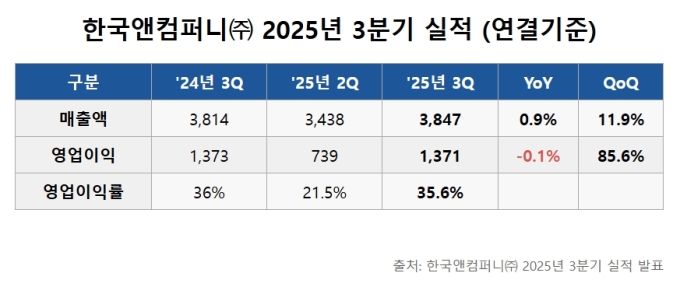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GLI68U_1.jpg)
![[만화경] 넥스페리아와 車반도체](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I1CZW_1.jpg)
![[ESG 칼럼] 글로벌 공급망의 새 언어, 에코바디스가 여는 신뢰의 시대](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145/art_17626491569255_8a8ab2.jpg?iqs=0.7294502661456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