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6월 28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나온 이 발언은 ‘탈(脫)중국’ 논쟁을 야기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 양국 관계는 얼어붙었고, 경제 협력도 후퇴했다.
“한·중 경협은 기존의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 구도로 발전해야 한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새 정부 대중 경제 정책 기조가 탈중국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바뀔 것을 시사한다.
이해된다. 그간 양국 경협은 산업 내 분업이 주류를 이뤘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부품은 한국이 만들고, 중국은 그걸 가져다 조립하는 수직 분업 형태였다. 중간재 교역을 통해 우리는 톡톡히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중국 산업 기술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우리와 차이가 없거나, 혹은 추월했다. 인공지능(AI)·전기차·로봇 등 미래 산업은 더 뚜렷하다. 심지어 이젠 중간재도 중국이 잘 만든다. 수직 분업이 먹힐 리 없다. 관점을 바꿔 이젠 양국 기술 수준이 동등(수평)하다는 걸 바탕으로 전면적 협력 구도를 짜야 한다.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를 사올 수 있어야 한다. 완성품을 만들어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달고 제3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눈 감고, 등을 돌리는 건 답이 아니다. 그들은 더 무서운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모색, 그게 수평적 협력의 핵심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기술 자강(自强)이 그것이다.
중국은 우리 경제에 메기와 같은 존재다. 메기에 먹히지 않으려 도망치는 미꾸라지처럼, 우리 기업은 중국에 잡히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워왔다. 양국 산업 분포로 볼 때 우리는 잡히면 먹히는 신세이기 때문이다. 메기의 몸집은 커졌고, 더 맹렬해졌다. 자동차가 그렇고, 조선이 그렇고, 심지어 반도체마저 쫓기는 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스스로 강해지는 길밖엔 답이 없다. 기술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는 탈중국 할 수 없다. 어차피 제3국 시장에서 그들을 경쟁자로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수평적 협력도 이뤄낼수 없다. 기술 없는 한국 기업에 협력하자고 손 내밀 중국 기업은 없다. ‘기술 자강(自强), 한·중 경제협력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헬로즈업] 수도권을 떠난 공장들, 어디로 갔나…‘지역별 산업 재편 지도’](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145/art_17625640651043_b40395.jpg?iqs=0.8291190724768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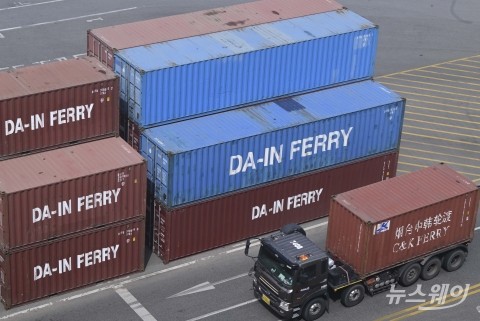


![기후 '리더' 자리 노리는 탄소 최다 배출국[페트로-일렉트로]](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XNVQ7W_1.jpg)
![안보·외교 불확실성 넘어… 美~러 ‘꿈의 터널’ 이어질까 [세계는 지금]](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516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