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 소식은 세계 각지에 조용한 울림을 전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목소리였고, 오래된 교회 안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으려 했던 실천자였다. 누구보다도 ‘현재’를 살아낸 교황. 그는 “새로운 현실에는 새로운 응답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단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과 윤리·사회에 대한 태도 그 자체였다.
우리는 이 말의 뿌리를 13세기의 한 인물에서 다시 발견한다.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가 남긴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연작’ 중 한 장면에서 젊은 프란치스코는 격분한 아버지 앞에서 옷을 벗는다.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세속의 안정과 부를 거절하고, 가난과 형제애라는 낯선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한다. 조토는 이 급진적인 결단을 독자적인 회화의 언어로 표현해냈다. 프란치스코는 벌거벗은 채 성직자의 곁에 서 있고, 양손을 모아 들고 무언가를 단호히 말한다. 이는 저항이나 파괴의 몸짓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차분한 선언처럼 보인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 이름을 택하며 이미 새로운 교회의 방향을 제시한 셈이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은 단지 경건한 헌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체제의 외곽에서 시작된 신앙의 회복을 상징하며, 교회가 다시금 소외된 이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이들에 대한 추모, 버려진 땅에 울린 생태 회칙, 성소수자에 대한 열린 언어, 자본주의의 맹목을 경계하는 경고. 그는 복음을 과거로부터 꺼내와 오늘의 말로 다시 쓰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늘, 조토의 그림을 다시 본다. 수백년 전 그 젊은이는 교황도 성인도 아니었다. 질문하는 청년이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모든 해명이 사치로 느껴질 만큼 단순한 몸짓으로 답했다. 침묵으로, 맨몸으로.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는 떠났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응답의 자세는 남아 있다. 새로움은 늘 불안함을 동반하지만 믿음은 낯선 길을 향해 발을 내딛는 행위이기도 하다. 옷을 벗고 성직자 곁에 선 프란치스코처럼 우리도 다시 물어야 할 때다. 새로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지금, 그 물음이 더 선명해진다.

박재연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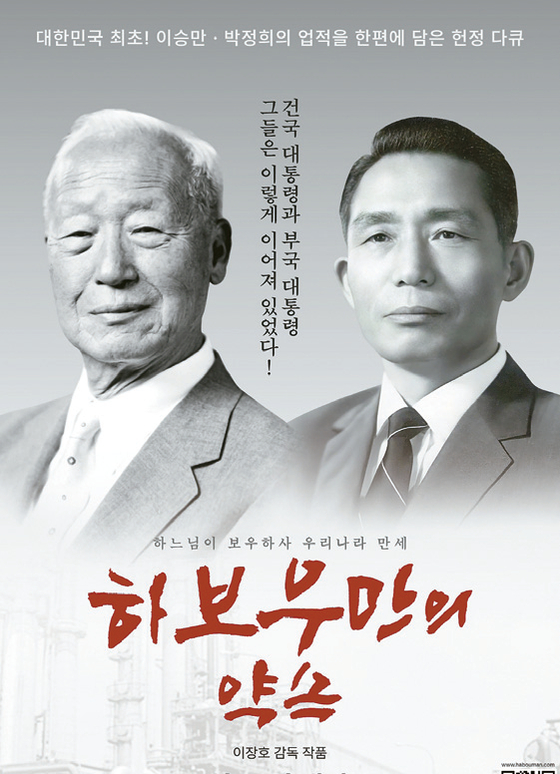

![[위병기 칼럼] 지역맹주 없는 전북정가 각자도생의 길로](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3/02/07/.cache/512/20230207580182.jpg)
![[구호 현장에서] 폭싹 속았수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30/3be20316-4154-4bb4-93d2-8614ae7a34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