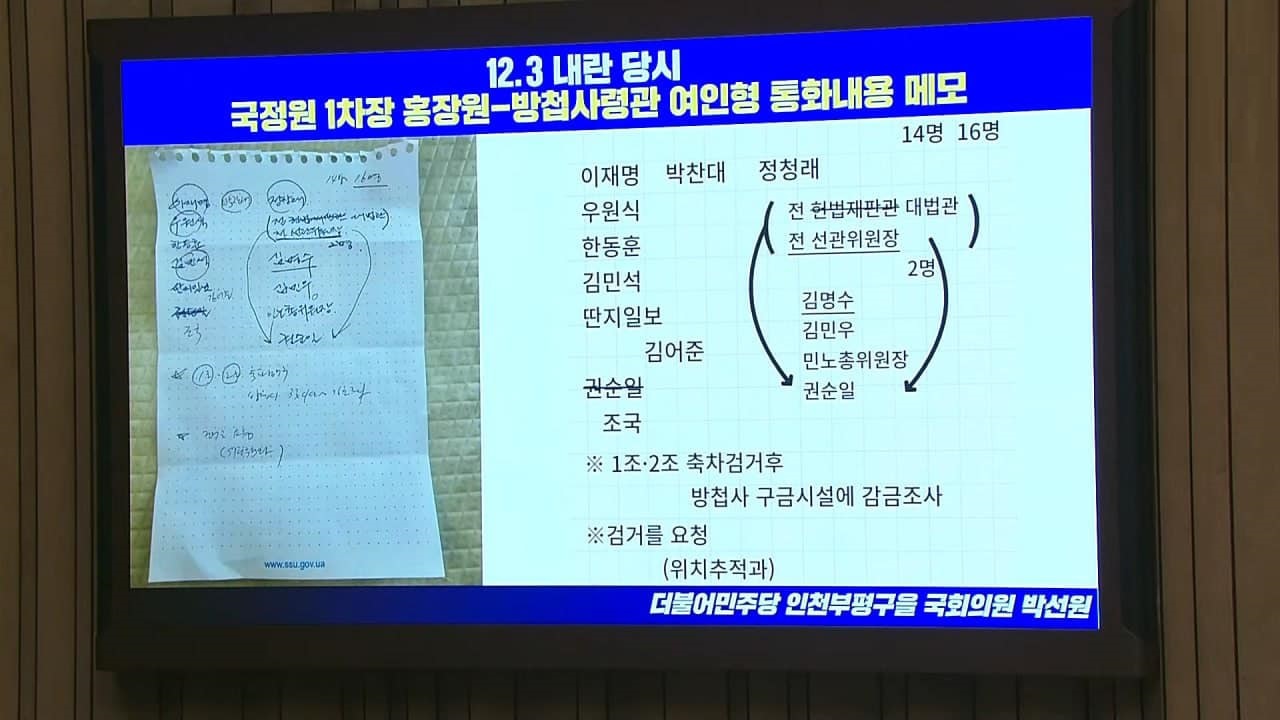언중(言衆)들이 쓰는 말이 모질고 독하고 악착같은 면이 두드러졌다면, 그만큼 세태 인심이 삭막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을 두고 “착하다”라고 평하면, 그걸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결단력이 없다, 성격이 무르다, 대가 약하다, 전투력이 약하다, 양보하다 손해만 본다, 등등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려 한다. ‘착한 사람’도 이제는 다소 부정적인 퍼스낼리티로 착색된 느낌이다.
착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부각하려 할 때, 예로부터 써 왔던 말 중에 ‘착해 빠졌다’라는 표현도 있었다. “그 친구, 착해 빠져서 아무 데도 써먹을 데가 없다.” 하기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빠져 버렸다’고 표현하면 좋은 것은 빛을 잃는다. 이쯤 되면 ‘착하다’는 ‘무능하다’와 동의어 수준이 된다. 물론 ‘착하다’의 의미론적 본질은 그렇지는 않다. 착함은 훌륭한 덕(德)의 범주에 속한다는 윤리학적 설명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요즘 언중들의 현상적 언어 감각은 ‘착하다’를 썩 좋게만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그런 세태가 되었다.
‘착하다’의 한자는 ‘착할 선(善)’이다. 그러나 ‘착하다’와 ‘선(善)하다’가 반드시 꼭 같은 의미역(意味域)이지는 않는다. 선(善)은 ‘좋은 것(good/well)’ 일반을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의도 선이고, 참여도 선이고, 때로는 투쟁도 선이다. ‘착하다’는 선(善)의 하위 속성 중 하나로 놓일 법하다. 일반 언중들이 쓰는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착하다’는 ‘온순하다’, ‘말을 잘 듣는다’, ‘싸우지 않는다’ 등에 가깝다.
착하다는 순우리말이다. ‘착하다’의 상대어는 무엇일까. ‘악(惡)하다’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악(惡)도 ‘나쁜 것(evil)’ 일반을 폭넓게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어서 ‘착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궁색하다. 순전히 성격이나 인성 차원에서 착하다의 상대어를 순우리말에서 찾아본다면 ‘그악스럽다’를 떠올릴 수 있다. 이 말은 예전에는 흔히 쓰이던 말이었는데, 요즘 와서는 쑥 들어간 말이 되었다.
‘그악스럽다’의 뜻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보기에 사납고 모진 데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서로 욕질을 하며 그악스럽게 악담을 퍼붓는다는 용례를 사전은 소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성격 면에서 그악스럽다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끈질기고 억척스러운 데가 있다.’는 풀이가 바로 그것이다. 소설가 송기숙의 작품 '암태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적절한 용례이다. 그녀는 손에 찬물 묻히지 않고 살던 규수였으나 어느새 그악스러운 시골 아낙네가 되어 버렸다. ‘그악스럽다’에 담겨진 행위나 성격이 날카롭고 앙칼지다는 점에서 주로 여성을 행위 주체로 놓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악스러움이 어떤 임계를 넘어서서, 이성을 잃게 되면, 패악질(悖惡질)로 넘어갈 수 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흉악한 짓이 패악질인 것이다. 자본 이익과 인권 문제에 민감해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그럴수록 주고받는 언행도 그악스러워간다. 그악스럽게 치닫지 않고도 다툼을 관리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 먹고 살 만해지기는 했지만, 우리들 성정(性情)은 더 피폐해진 것 같다.
![[우리말 바루기] ‘이 자리를 빌려’, 자연스러운 표현?](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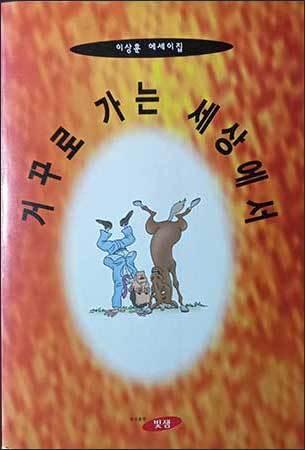
![한국인의 영어울렁증을 '비대한 자아 내려놓기'로 풀어낸 유니콘 [정혜진의 라스트컴퍼니]](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2RXCCB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