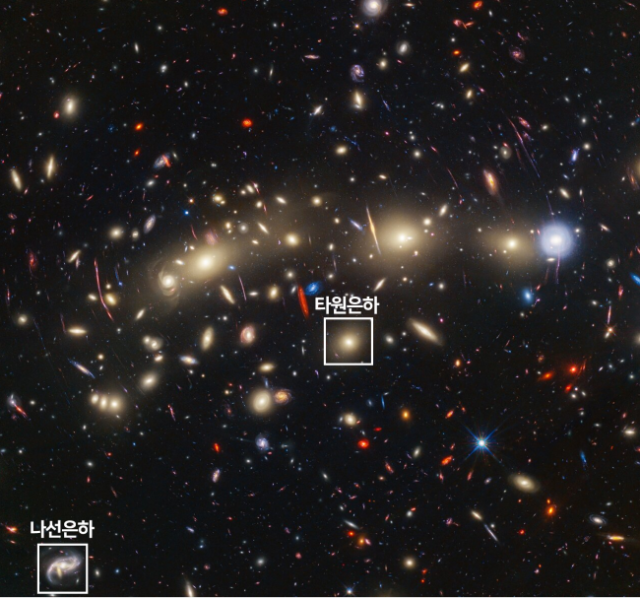“중국과 다른 문명의 차이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수나라 때 처음 치러진 국가 주도 관료 채용 시험이라고 대답하겠다. 과거제도는 여러 면에서 중국에게 축복이자 저주였다. (…) 중국 제국은 과거제도를 통해 절대주의 국가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몰아냈다. 높은 문해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지식인은 등장하지 않았다. 상업은 국가의 그늘에 있었다. 조직화된 종교는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다.”- 야성 황 '중국필패'
30년 전 존경하던 은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다. “우리나라 의학이 '오파상 의학'이라고 불려.” '판매 제의'를 뜻하는 영어 'offer'에 상인의 '상'자를 붙여 '오파상'이다. 수출입 거래에서 '오파'를 따오는 무역 중개상으로 종합상사나 무역회사를 중심으로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 수출중심의 한국 경제구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단계를 통해 다양한 한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촉진한 무역 일꾼이었다.
1977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과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우리나라 의료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지만 겉보기엔 선진국 부럽지 않게 발전한 듯해도, 실상은 모든 구성요소들을 다 선진국에서 수입해온 것들인 '오파상 의학'은 겉만 그럴듯하고 스스로 개발해낸 것이 없어 학문적 독자성과 '전통'은 없다는 풍자였다. 신약개발은 언감생심이고, 핵심 치료제, 진단장비와 소모품마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더 중요한 점은 의학 지식과 술기들도 의학도들의 '오파상' 해외 연수를 통해 습득해온 것들이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술기와 서비스 수준은 높아졌지만, 독자적 전통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다.
부끄럽지만 '오파상 의학'은 3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입시의 의대 쏠림으로 대치동 학원가에는 초등 의대 고시반이 생겼다. 의학 드라마는 인기고, 세계적 의료 수준을 가졌다며 자랑한다. 하지만 과거 '오파상' 활약이 한국경제의 수많은 산업 생태계들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돌이켜보면, 성형, 미용 이외의 분야, 혹은 몇몇 술기와 고가장비 사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흰 가운 속 의사들은 그럴듯해 보여도, 바이오나 의료, 제약 산업 등 관련 산업 생태계들은 여전히 자생하기 어렵고 수입 의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의정갈등이 길어지며 모두 지쳐간다. 급기야는 후배들의 저항에 선배들이 '파시스트적 단체행동'이라며 '단체 비난'하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공중파를 탔다. 자율규제와 집단의 결속을 중시하는 도제 전통에서라면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공동체 정신은 어디로 간 걸까? 중세 유럽의 상인과 장인들의 대표적 도제인 길드(Guild)는 기술과 경험의 전수, 신뢰와 자율규제로 왕과 귀족에 저항하고, 자발적 결속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근대 시민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데 말이다.
답은 동서양 역사발전의 차이에 있는 듯하다. 우리의 전문의사는 도제의 인정이 아닌 왕권이 주도하는 고시 합격으로 따낸 '장원급제 의학'으로 보인다. 도제적 '전통'은 없다. 중세 서양의 길드는 장인들 스스로 협회를 운영했지만, 조선의 장인들은 국가가 통제했다. 조선 시대 상인의 공적 길드인 시전과 경시서는 강한 국가 통제하의 독점권을 받았고, 사적 길드인 보부상도 정부 공인의 독점권을 받았다. 왜란 때 끌려간 조선의 수많은 도공이 왜에 머물렀다. 길드가 '기술'과 '상업' 중심의 '전통'이라면, 과거는 '학문'과 '지식' 중심의 '관료 선발'이다. '사농공상'의 당위적 위계를 따른다. 길드의 '결속'과 '전통'이 아닌 '왕권'과 '권위'에 바탕한 과거제도 하에서라면 장원급제자가 하급제자 혹은 신입생을 단체 공개 비난하는 행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리라. 과거제도는 산업과 경제보다 행정과 정치적 영향력을 상위에 둔다. '중국필패'의 저자 MIT 야성 황 교수의 지적처럼 '과거제도가 키워낸, 독재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깊은 인지적 편견'이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김주한 서울대 의대 정보의학 교수·정신과전문의 juhan@snu.ac.kr


![[사이언스] '과녁 은하'와 뉴턴의 사과](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3/thumb/29327-71765-sample.jpg)


![[만파식적] 과학자의 탈출](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4RO68I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