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나라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의 나라, 처칠의 나라, 비틀스, 숀 코너리, 해리 포터,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 그리고 왼발….”
오래전 개봉한 영화 ‘러브 액추얼리’의 한 장면이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휴 그랜트 분)가 자신과 조국을 얕잡아보는 미국 대통령을 향해 던지는 대사다. 통쾌한 이 장면이 자꾸 생각난다. 한·미 관세 협상 탓에 분통 터지고 답답해서다.
통화스와프까지 거론된 대미 협상
그 정도 위험이라면 투자 말아야
대내 불확실성은 더 키우지 말길
“협상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 11일 기자회견)
“우리는 돈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7월 31일 브리핑)
외교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으로선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이지만 공감하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며칠 전 퇴직 경제관료를 만났는데 점잖은 그의 입에서도 “모욕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동맹을 갈취하고 궁핍화하는 미국의 과도한 압박에 나라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약488조원)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공전 중이다. 한국은 대출과 보증 등을 포함해 직접투자액 비중을 낮추려 하고, 미국은 확실한 현금 투입을 요구한다. 미국에 ‘투자 백지수표’를 넘겨주고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모델을 한국도 따르라고 압박한다. 투자의 기본은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해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발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업가의 손발을 묶어두고 돈만 내라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부일 뿐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올해 예산의 72%에 달한다. 미국 요구대로 현금박치기를 하면 한국은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를 투자해야 한다.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1년에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는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 어렵다. 한국이 요청했다는 통화스와프는 방어용 협상카드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미국이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유로존·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는 자국 통화가 국제화된 기축통화국이거나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 많은 나라다. 글로벌 시장에 달러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달러를 푸는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한국 등 9개국과 거의 동시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푼 게 아니다. 미국과 세계경제에 반갑지 않은 전염 효과(spill over)를 막기 위해서였다.
통화스와프와 관세 협상의 상관관계도 없다.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스위스는 39%, 캐나다는 35%의 고율 관세를 맞았다. 통화스와프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전전긍긍할 일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스와프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위험한 대미 투자라면 하지 않는 게 옳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김용범 실장의 표현대로 ‘정상적 문명국가’ 수준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앞에 소개한 ‘러브 액추얼리’의 다음 대사. “괴롭히는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괴롭히는 자는 오직 힘에만 반응하니, 이제부터 나는 훨씬 더 강해질 준비를 할 것이다.”
물론 영화가 현실이 되긴 힘들다. 냉엄한 통상외교 현장에서 “우리도 한강과 케데헌과 손흥민이 있다”고 판을 깰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협상을 겪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트럼프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는 국익 우선의 원칙을 담대하게 지키며 대응하되 대내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국내 정책에 과속 스캔들은 없는지, 혼란을 키우지 않았는지 다시 점검하기를 바란다. 나라 밖에 불이 났으면 적어도 나라 안은 다독거리고 임전 태세를 독려해야 하지 않겠나.

![투자 줄어들까 조바심? 트럼프 “외국기업 투자 위축 원치 않아”…“美, 금융위기 아니면 안해주는데” 연준 상대해야 할 韓銀 ‘곤혹’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JRF4I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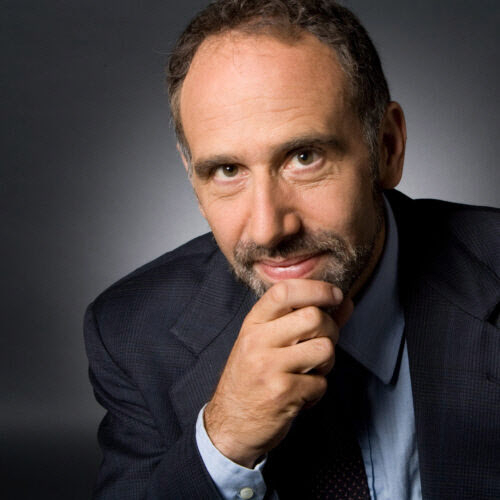


!["韓, 트럼프에 488조 줄 바엔 차라리"…美 싱크탱크의 일침 [글로벌 모닝 브리핑]](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TJXB1X_1.jpg)
![미중, 또 반도체 기싸움, 정상회담도 불투명…한미 관세협상, 대미투자 세부조건 놓고 장기전 돌입할 듯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TBA4PA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