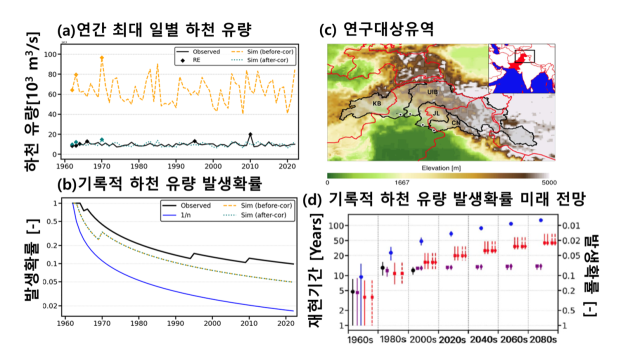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낮게 드리운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대기를 순환시킨 덕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유지됐다. 그러나 기상 여건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푸른 하늘의 뒤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숨어 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은 이제 ‘쌍둥이 위기’로 불린다. 산업화 이후 급증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기후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00PPM을 넘어섰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 농도가 450PPM에 도달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한 온도 변화가 아니라 폭염·폭우 등 극단적 기상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기후 질서’의 신호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대기오염을 악화하고, 대기오염이 다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악순환 구조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정체되고,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못해 지표 부근에 머물게 된다. 국립기상과학원 분석(2022)에 따르면 고온과 강한 햇빛은 광화학 반응을 촉진해 오존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동시에 높인다. 2024년 세계기상기구(WMO)는 매년 450만명 이상의 조기 사망이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으며, 그 상당수가 기후변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저감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5.6㎍/㎥로 개선돼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농도 목표인 16㎍/㎥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이를 2029년까지 13㎍/㎥ 수준으로 한 번 더 낮추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북미·유럽 등의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대기질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이런 개선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앞서 말했듯 심화하는 기후위기가 대기오염을 가중할 수 있기에 결국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지 않는 이상 대기질은 언제든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료의 연소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이므로 이 문제에 집중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 발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한다면 대기오염의 많은 부분과 기후위기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 전동화 전환 등을 유도하고, 민간에서는 산업과 생활 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렵고 멀지만 많은 사람의 합의로 제도가 바뀌고 자본이 움직인다면 가능한 얘기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9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푸른하늘의날’(9월7일)의 올해 주제는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Racing for Air)’다. 이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이라는 복합 위기에 속도를 맞춰 대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오염 통합관리’를 주제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내외 기후·대기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각국의 기후·대기 통합관리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하늘은 잠시 맑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푸른 하늘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의지, 협력의 결과이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공기는 어제 누군가 지켜낸 공기이고, 내일의 공기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질주’에 동참해야 할 때다.


![[2만호 헤드라인] 지구 환경 복원 완료…탄소 배출권 시장 역사 속으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5/news-p.v1.20250825.96821cb477a54d49bc8ac600e8a563f1_P1.jpg)

![[기자수첩] '친환경'이 '친경제'라는 인식 퍼지길](https://img.newspim.com/news/2025/08/31/2508312254575810.jpg)